[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한겨레 우리말’은 우리가 늘 쓰면서 막상 제대로 헤아리지 않거나 못하는 말밑을 찬찬히 읽어내면서, 한결 즐거이 말빛을 가꾸도록 북돋우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 말밑을 우리 삶터에서 찾아내어 함께 빛내려는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우리말 1
― 하늘은 바람을 타고 바다를 돌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려고 여러 고장을 다니면서 몇 가지를 눈여겨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늘이고, 둘째는 숲이며, 셋째는 풀이고, 넷째는 나무요, 다섯째는 골목에다가, 여섯째는 길바닥입니다. 이다음으로는 그 고장에 마을책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요.
하늘이 맑은 곳이라면 사람도 새도 벌레도 짐승도 푸나무도 살 만한 고장이라고 느낍니다. 하늘이 매캐하다면 사람도 새도 벌레도 짐승도 푸나무도 살 만하기 어렵겠구나 싶어요. 하늘이 매캐하면서 숲을 가꾸거나 사랑하려는 고장은 없더군요. 하늘빛을 뿌연 잿빛으로 내팽개치면서 풀밭이나 나무를 돌보는 고장도 없어요. 하늘이 온통 먼지구름인 고장치고 골목이나 길바닥을 곱게 보듬는 데도 없어요.
하느님·하늘님·한울님
한겨레가 쓰는 낱말 가운데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ㄹ’이 떨어진 줄 꽤 많이들 압니다. 어느 절집에서는 ‘하느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쓰면서 ‘하나뿐인 님’이라는 뜻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고 느끼지만, 조금 더 깊이 헤아리면 좋겠어요.
하나 = 하늘 = 한
‘하늘’하고 ‘하나’는 같은 말밑이자 뜻입니다. 하늘이 하나이고, 하나가 하늘이에요. 이름을 굳이 가른다면, 저쪽이랑 이쪽은 다르다고 여기려는 마음이고, 이쪽이랑 저쪽을 갈라서 남남이 되려는 뜻이곤 해요. 또는, 서로 새로운 길을 가려는 생각일 수 있겠지요.
예부터 ‘하늘 = 하나’인 바탕을 짚어 본다면, 하늘은 둘이나 셋으로 못 가르거든요. 하늘은 통으로 하나예요. 그러니 ‘하늘 = 하나’입니다. 하나일 적에는 오롯합니다. 옹글다고도 합니다. ‘오롯하다·옹글다’는 ‘온’이란 말에서 갈리는데, ‘100’을 세는 이름이면서 ‘모두’를 가리키는 낱말이에요. ‘온누리’란 한자말로 ‘우주’를 가리키고, ‘온나라’는 한자말로 ‘전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란 ‘1’이면서 ‘온·모두’를 품습니다. 빈틈이 없기에 모든 것을 나타내요. 이러면서 하나란 ‘홀’이기도 합니다. ‘홀’은 홀짝을 말하는 그 홀이면서 ‘홀로·혼자’하고 맞물려요. 또 ‘홀’은 ‘홀가분하다’로 가지를 뻗습니다. ‘홀가분하다 = 홀로 + 가분하다(가붓하다·가볍다)’입니다. 한자말로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하나로 있기에 모든 것이면서 가볍기에 날갯짓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홀가분해서, 홀로 가벼워서 날갯짓을 한다면 어디에서 날아오를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는 ‘혼자(홀)’이기에 ‘가볍게’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누비는 ‘모든’ 숨결을 가리키는 셈입니다.
또한 ‘하나’는 ‘홑’이지요. ‘하나 → 홀 → 홑’으로 간다고도 할 텐데, ‘홑’이란 ‘낱’을 가리키고, ‘낱’은 다시 ‘나’를 가리켜요. ‘나’로 있기에 ‘하나’입니다. 네, 가만히 살피면 ‘하나’라는 낱말은 ‘하(한) + 나’인 셈입니다. ‘하늘 + 나(하나인 나) = 하나’라고도 여길 만합니다. 또는 ‘한’이라는 낱말에서 ‘ㄴ’은 슬그머니 ‘나’를 품었다고 할 만해요.
여기에서 우리말을 새삼스레 생각할 만한데요, ㅏ 다르고 ㅓ 다른 우리말이라, ‘나·너’는 서로 다르면서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나하고 너라는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숨결이나 목숨이나 넋이나 빛으로는 같아요. 늘 떨어진 남남이자, 너랑 나는 늘 ‘우리’로 맞물리는 셈입니다.
하늘·하나·한·해
이 땅에서는 어느 절집을 다니느냐에 따라 ‘하느님·하나님·한울님’처럼 갈라서 씁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냥 다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 절집이랑 너희 절집이 다르다는 티를 내려고 이름을 달리 붙일 뿐이에요. 이리하여 어느 이름이 낫거나 좋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이름을 쓰든 말밑을 낱낱이 볼 노릇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느님·하늘님·한울님’이란 바로 “하늘에 있는 님”을 가리키는데, 이 하늘이란 먼먼 저곳이기도 하면서, 바로 우리 스스로(나)이기도 합니다. 구름을 타고 붕 뜬 분이라서 하느님·하늘님·한울님이 아닌, 바로 너도 나도 언제나 누구나 하느님·하늘님·한울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늘은 하나이거든요. 하나는 하늘이고요. 하나는 바로 ‘하 + 나’라, “하늘인 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별을 비추는 다른 별을 ‘해’라고 하지요. 이 ‘해’라는 낱말도 ‘하늘·하나’에서 가지를 쳤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먼저라고는 말하기 어려운데, 하늘이 트이면서 해가 떠올랐다고 해야 할 터이니, 나란히 나타나고 한꺼번에 태어난 낱말이라고 여겨야지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트이고 해가 떠오르면서 온누리는 하얗게 빛납니다. 여기에서 ‘하얗다’는 ‘해가 드리우는 빛’을 나타내요. 곧 ‘하늘 = 해 = 하얗다’인 얼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별에서 바라보는 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늘 = 해 = 하나 = 나 = 하얗다’로도 맞물립니다.
한겨레
한겨레 옛사람은 어쩜 이렇게 말을 지어서 썼을까요? 마치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ㅏ 다르고 ㅓ 다른 이 나라 말씨라는 이야기처럼 그야말로 개구진 말놀이를 하는 셈이라고 느껴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한겨레’라는 이름에서 ‘한’은 바로 ‘하나 = 나 = 하늘 = 해 = 하얗다’입니다. 한자말로 우리 겨레를 ‘한민족’이나 ‘백의민족’으로 나타내곤 하는데요, 조선 무렵에 입었다는 흰옷 때문으로만 ‘백의민족’이라 하지 않습니다. 한겨레는 “하늘에서 내려온 겨레”라는 뜻입니다. 말밑이나 말뜻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겨레라, 해를 사랑하는 겨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겨레이고, 해를 사랑하는 겨레라, 해가 뜰 때처럼 하얗게 빛나니” 흰옷(흰몸)을 입은 모습으로 보이는 겨레이기도 해요.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나’인데, ‘날개’를 달며 ‘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햇빛은 아침·낮·저녁에 따라 달리 느끼기 마련입니다. 햇빛을 노랗게도 하얗게도 붉게도 말갛게도 보랗게도 그리지요. 어느 쪽만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 다른걸요. ‘빛나다’라는 낱말은 “아침에 해가 뜰 때하고 같다”는 뜻이며, ‘눈부시다’는 “밤을 물리치고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여 해가 떠오를 적에 온누리를 하얗게 밝히기에 눈을 떠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함박꽃·박꽃·함초롬하다·함함하다
‘한’은 ‘크다’도 가리킵니다. ‘한길’이란 큰길입니다. 한가람(한강)이란 큰가람입니다. 큰 냇물이기에 한가람(한강)이에요. ‘크다’라는 말은 ‘으뜸·첫째·꼭두’하고 맞물려요. 이리하여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 한가람은 ‘으뜸가는 냇물’이자 ‘첫째가는 냇물’이라는 뜻을 품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먹지요. ‘한껏’ 마시지요. ‘한바탕’ 놀아요. ‘한숨’을 쉽니다. 왜 ‘한가운데·한복판’이라 하는가를 헤아려 본다면, ‘하늘·하나’라는 낱말이 얼마나 우리 살림자리 곳곳에 스며들었는가 하고 새삼스레 느낄 만합니다.
자, 더없이 커다란 꽃, 소담스러운 꽃송이인 함박꽃입니다. ‘함박웃음’을 짓고 ‘함박눈’이 내립니다. 엄청나게 퍼붓는 빗물이라면 ‘물폭탄’이 아닙니다. ‘함박비’입니다. 엄청나게 몰아치는 바람이라면 ‘태풍’이 아닙니다. ‘함박바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나요? 그러면 ‘함박돈’을 그리면 돼요. 함박·함지박인데요, 예부터 한겨레 풀집 지붕에 얹은 박은 하얗디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이 길에서 더 생각을 이을 수 있다면 ‘함초롬하다’를 그리겠지요. 그냥 고운 빛이 아닌 ‘함초롬’입니다. 한자말로 하자면 ‘단정(端整)·단아·침착·우아·유려·고상·고아(高雅)’를 품는 ‘함초롬’이에요. 이와 비슷하면서 결이 살짝 다른 ‘함함하다’도 매우 빛나는 말이에요.
한글·한말
하늘이 내린 글이라는 ‘천부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글인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렸으니 ‘하늘글’일 테지요. 한글이 없던 무렵에는 한자를 빌려서 옮겼으니 ‘천부경’이었다면, 이제는 한겨레 말씨로 가다듬어 ‘하늘글’이라 하면 되리라 여겨요.
오늘 우리는 한글이란 이름을 쓰지만, 이 글씨를 처음 지은 분들은 한자로 ‘훈민정음’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랏님은 아랫사람한테 억지로 가르치려 들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면, 그 뒤로 오백 해란 나날이 흐른 어느 날, 이 글씨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내어 억지로 가르치려 드는 글’이 아닌, ‘새로운 나라를 열면서 사람들 스스로 새롭게 일어서도록 북돋우는 글’로 삼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우리 겨레 이름인 ‘한겨레’를 바탕으로 ‘한글’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그분 이름은 ‘한힌샘’입니다.
한글이란 이름을 짓고서 이 글씨를 널리 퍼뜨리려 애쓴 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중국처럼 한자를 쓰는 글살이를 했을는지 모릅니다. 또는 일본처럼 글자락에 한자를 잔뜩 뒤섞는 글살림이 되었을는지 모르지요. 또는 글이 없는 뭇나라처럼 알파벳을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한겨레가 쓰는 말이어서 한글입니다. 하늘 같은 글이고, 하늘 닮은 글이며, 하늘이 되는 글이지요. 누구나 쉽게 깨쳐서 누구나 생각을 새롭게 깨우는 글입니다. ‘한’이라는 낱말이 담는 모든 결을 이 이름 ‘한글’이 품습니다. 이리하여 종이에 새기는 글씨가 ‘한글’이라면, 우리가 입으로 주고받는 말은 ‘한말’이라 할 만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언제나 글에 앞서 말이 있으니, 한글이라면 한말이란 이름이 어울리지요. ‘한국어’가 아니고 말예요.
한살림·한빛
‘하늘·하나·한’이라는 얼거리를 두루 읽었다면 ‘한살림’이란 이름은 더없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살림길이라면 바로 ‘한살림’이 될 테니까요. 우리 목숨이라면, 우리 앞길이라면, 우리 모습이라면 ‘한빛’이란 이름으로 그릴 만해요.
한누리·한넋
‘해바라기’란 꽃은, 알고 보면 ‘하늘바라기’인 꽃입니다. ‘하늘바라기’는 빗물에 기대어 짓는 논을 가리킨다는데, ‘해바라기’인 논인 셈이에요. 그런데 있지요, 예나 이제나 논밭살림은 하늘바라기에 해바라기인걸요. 하늘에 기대어 짓는다기보다, 하늘을 살피고 읽고 사랑하면서 하늘이 나누어 주는 즐거운 기운을 받아서 짓는다고 해야 알맞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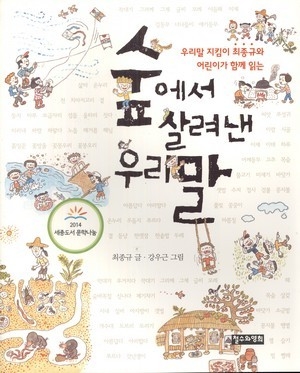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스미어 샘물이 되고 냇물이 되어요. 하늘이 비를 뿌려야 논밭을 적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햇볕하고 햇빛하고 햇살을 고루 베풀어야 논밭이 잘되어요. 그늘진 곳에서는 논밭이 안 되거든요.
우리 삶자락은 하늘이며 해가 대수롭습니다. 가만 보면 번쩍터(발전소)나 빠른길(고속도로)이나 만듦터(공장)나 푸른지붕(청와대)이 아닌, 하늘을 아끼고 해를 사랑할 노릇이에요. 나라일꾼도 잘 뽑아야겠지만, 벼슬아치보다는 하늘빛이 하늘답도록, 햇빛이 해답도록 지키는 살림일 노릇입니다.
여기에서 더 헤아린다면, 빗물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아지랑이로 피어올라 구름을 이루고 비를 뿌리지요. 물은 가만히 두면 빛깔이 없다고 하는데요, 너른 바다는 쪽빛이라 합니다. 하늘빛을 고스란히 옮긴 쪽빛이라지요. ‘쪽’이라는 풀빛으로 나타내는 바다빛인데, 바다빛이란 하늘빛을 그대로 담았으니 ‘쪽빛 = 바다빛 = 하늘빛’입니다.
이러한 결을 이으면 ‘하늘 = 바다 = 쪽(파랑)’이고, 하늘을 이루는 바람도 ‘파랑’이라 할 만해요. ‘파랗다’는 “파랗게 질리다”에서도 쓰는데, 이 ‘파랑’은 싱싱함이나 싱그러움을 가리켜요. ‘살다·목숨’을 파랑으로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하늘빛일 적에, 하늘을 바람으로 마실 적에, 맑은 하늘을 등에 지면서 살림을 가꿀 적에, 우리는 늘 튼튼하면서 싱그러운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논밭을 하늘바라기라고 한 뜻이라면, 해바라기라는 꽃을 아낀 마음이라면, ‘하늘 = 바다 = 파랑 = 목숨·숨결·빛·넋’이라는 얼거리를 환히 알아차린 옛사람을 그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을 넉넉히 짚을 만하리라 여겨요.
파랗다·푸르다
그런데 한말에서 ‘파랗다’가 ‘푸르다’하고 곧잘 섞여요. 둘은 틀림없이 다릅니다만, 다르면서 같은 결이 있어요. 바로 ‘파란하늘’을 옴팡 받아들인 들녘이 되기에 ‘푸른들판’이 되거든요.
풀이 푸르려면 해를 잘 받아야 합니다. 하늘바라기인 풀이어야 푸릅니다. ‘푸르다’도 싱싱하거나 싱그러운 숨결이며 목숨이며 빛을 가리켜요. 한겨레 흙살림말 가운데 ‘사름’이 있는데, 논에 뿌리를 내린 나락이 푸르게 빛나는 결을 가리킵니다. ‘사름’ 같은 낱말하고 얽힌 수수께끼는 이런 실타래를 풀면서 어림할 만합니다. 하늘을 머금은 뭍(땅)에서는 파란 바람을 푸른 푸나무(풀 + 나무)란 옷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푸르기에 풀빛인 풀이기에 싱그러운 뭍이라면, 파랗기에 파랑인 바람이자 하늘이면서 해맑고 해밝고 해곱지요.
‘바람’은 ‘파람’이란 꼴로 바뀌곤 합니다. ‘마파람·휘파람’처럼. 곧 ‘파람·바람 = 바다 = 하늘’인 얼개요, ‘하늘’이라는 낱말은 이 별을 골고루 돌고돌면서 모든 숨결이 싱그럽도록 어루만지면서 늘 그대로 오롯이 하나라는 넋을 나타낸다고 할 만합니다.
ㅏ 다르고 ㅓ 다르듯 모두 다른 몸이자 모습이자 목숨이지만, 나하고 네가 우리라는 울타리에서 하나이듯, 이 별을 이룬 모든 것은 으레 하나라는 대목, 이 수수께끼를 한겨레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한말글이라는 이야기꽃을 펴는 사람들이 사름이란 풀빛으로 반짝반짝 함초롬히 이슬빛이 되는 길을 ‘하늘’ 한 마디에서 엿봅니다.
곰곰이 보면 빗물은 모두 바닷물인데, ‘바다 = 비’요, ‘바닷물·빗물 = 하늘을 이루는 물’이기도 합니다. 말결이나 말밑뿐 아니라, 이 별에서 흐르고 맴도는 얼개를 하나하나 보거나 짚으면 하나같이 맞물리거나 얽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이 아닌 ‘한겨레 한말글’을 찬찬히 보고 읽고 느껴서 생각할 줄 안다면, 우리 마음은 하늘처럼 되고, 바람처럼 되며, 바다처럼 되고, 푸나무·풀꽃나무처럼 되다가, 바야흐로 숲이라는 사람이 되어 슬기롭게 사랑이 되겠구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말이 하늘말이 되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서로서로 하늘사람이며 하늘벗이며 하늘동무이며 하늘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글을 쓰고, 하늘말을 하면서, 하늘꽃을 건네고, 하늘살림을 꾸리는 하늘집을 보금자리로 가꾼다면 더없이 기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