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책숲마실’은 나라 곳곳에서 알뜰살뜰 책살림을 가꾸는 마을책집(동네책방·독립서점)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여러 고장 여러 마을책집을 알리는(소개하는) 뜻도 있으나, 이보다는 우리가 저마다 틈을 내어 사뿐히 마을을 함께 돌아보면서 책도 나란히 손에 쥐면 한결 좋으리라 생각하면서 단출하게 꾸리려고 합니다. 마을책집 이름을 누리판(포털) 찾기칸에 넣으면 ‘찾아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숲노래 책숲마실
오월광주
― 광주 〈일신서점〉
어느새 ‘오월광주’란 넉 글씨는 한 낱말로 뿌리내린 듯합니다. 해마다 오월이면 전남 광주는 길을 막고서 여러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요, ‘잔치’를 벌입니다. ‘고요히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왁자지껄한 잔치판입니다. 2022년 5월 18일을 앞두고 광주로 바깥일을 보러 가는 김에 헌책집 〈일신서점〉에 들릅니다. 저는 광주책집을 자주 드나들지는 않습니다만, 광주에서 책집마실을 하며 다른 책손을 스치거나 만나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누가 오월광주를 묻는다면, 전남사람으로서 “왁자판을 꺼리며 이름을 감추고 들풀로 가만히 지내는 사람이 한쪽이라면, 왁자판을 벌이고 왁자지껄하게 나서는 사람이 한쪽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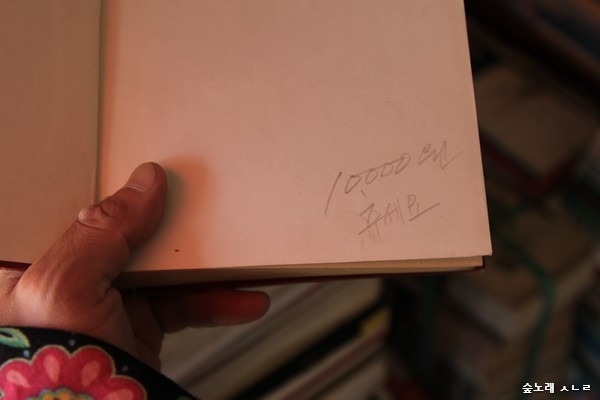
몸이 다치는 바람에 귀가 먹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일신서점〉 할배는 구부정한 몸이어도 꾸준히 새 헌책을 추스르고, 언제 찾아들는지 알 길이 없는 책손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제 내년이면 구십이오. 올해로 책장사를 51년 했소. 광주고 옆에서 헌책방을 하는 〈광일서점〉이 나보다 딱 5∼6년 늦어. 나도 젊었을 적에는 무등산에 맨발로 오르고 얼음물에도 들어갔네만.”
오월 햇볕은 아주 여름볕입니다. 이 후끈한 날에 길거리에서 입가리개를 꿋꿋이 쓴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라가 시키야 움직인다면 종(노예)입니다. 가게에서 먹을 적에는 가리개를 벗다가, 햇볕이 후끈거리는 길거리에서는 가리개를 쓰는 몸짓이 두동진 줄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말을 안 한다면, 우리는 모두 생각을 잊거나 잃은 종살이인 셈입니다.


남이 내주는 홀가분(자유)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 곧 ‘나사랑 = 홀가분(자유)’입니다. 참다운 오월넋이라면 겉치레를 감추는 모든 울타리를 걷어내는 들풀물결일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야 읽는 책이라면 아예 안 읽는 쪽이 낫습니다. 책읽기도, 삶읽기도, 나라읽기(정치·사회읽기)도, 마음읽기도, 사랑읽기도, 언제나 스스로 눈망울을 빛내는 길일 노릇입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마음을 읽고 사랑하는 길로 다가가려는 사람들이 늘까요? 마을빛을 북돋우는 징검다리 노릇을 쉰 해 남짓 이은 작은책집을 눈여겨보는 발걸음이 새롭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겉에 먼지가 묻거나 긁혀도 책입니다. 사납빼기가 북북 찢더라도 책에 깃든 이야기는 안 찢깁니다. 어떤 총칼도 사랑을 건드리거나 더럽히지 못 합니다. 오직 우리 생각이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 마음이 사랑을 움직입니다. 사랑이란 마음으로 사랑을 생각하며 쥐는 책일 적에 아름답습니다.
ㅅㄴ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