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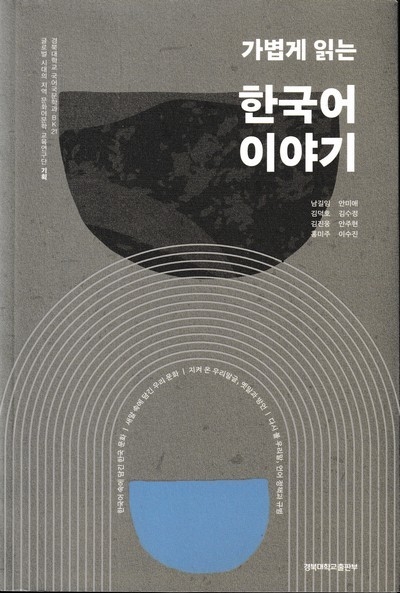
숲노래 우리말
다듬읽기 5
《가볍게 읽는 한국어 이야기》
남길임과 일곱 사람
경북대학교출판부
2022.11.25.
《가볍게 읽는 한국어 이야기》(남길임과 일곱 사람, 경북대학교출판부, 2022)를 가볍게 읽어 보려 했지만, 우리말을 살피는 분들이 쓴 글이 도무지 우리말스럽지 않아 가볍게 읽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쓰는 모든 얄궂은 말씨나 일본스러운 말씨를 손질해 줄 수는 없다. 이분들 스스로 ‘우리말을 처음부터 몽땅 새롭게 배우려 나서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우리말스럽게 쓸 수 없다. 우리말을 ‘우리말’이라 할 수 있어야, 적어도 ‘한국말·한말’이란 이름을 쓸 테고, ‘필자’처럼 낡은 말씨를 창피한 줄 깨달으면서 털어내리라. 길잡이(교수·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일수록 ‘배움이(학생)’보다 훨씬 오래 깊이 꾸준히 배워야 한다. 길잡이가 아닌 어른이어도 아이보다 우리말을 더 찬찬히 가만가만 곰곰이 낱낱이 샅샅이 짚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무늬만 ‘국어학자’로 멈추지 말고, 속빛으로 ‘말지기’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ㅅㄴㄹ
이러한 언어의 힘을 알기 위해서 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이러한 말힘을 알자면 틀을 헤아려야 한다
→ 이러한 말결을 알려면 얼거리를 읽어야 한다
21쪽
씌어 있는 걸 보고 나서야 ‘반할만떡’이란 식당 이름에 수긍했다
→ 쓴 글을 보고 나서야 ‘반할만떡’이란 밥집 이름에 끄덕였다
→ 적힌 글을 보고 나서야 ‘반할만떡’이란 밥집 이름을 알았다
→ 글을 보고 나서야 ‘반할만떡’이란 밥집 이름을 알아차렸다
23쪽
매력적인 준말은 말의 맛을 더해 준다
→ 멋진 준말은 말맛을 더해 준다
→ 눈이 가는 준말은 말맛을 더해 준다
24쪽
언중은 기발하고 놀라운 언어 직관을 사용해 우리말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 사람들은 재미나고 놀랍게 말을 다루어 우리말을 더 푸짐하게 가꾼다
→ 우리는 남다르고 놀랍게 말을 바라보며 우리말을 더 알뜰살뜰 북돋운다
31쪽
관계가 진전되고 격의 없는 사이가 되면
→ 자주 만나고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 더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면
34쪽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교육은
→ 다살림집에서 두말을 가르치면
→ 온살림집에서 배우는 두말은
46쪽
일상적인 욕 사용이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 입에 붙은 막말은 그저 아이들만 말썽이 아니다
→ 으레 쓰는 깎음말은 아이들만 잘못이 아니다
50쪽
북한에서는 ‘해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이를테면 북녘에서는 ‘해돌이’라고 한다
→ 북녘에서는 ‘해돌이’라고 쓰는 말이 있다
56쪽
처음 필자가 말한 ‘취미로서의 글쓰기’는 ‘평가받는 글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내가 처음에 말한 ‘즐겁게 글쓰기’는 ‘값을 재는 글쓰기’를 가리키지 않는다
→ 내가 처음에 말한 ‘가볍게 글쓰기’는 ‘값 따지는 글쓰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63쪽
한국어는 지금 ‘한류 코인을 타고’ 있다
→ 우리말은 요새 ‘한바람을 탄’다
66쪽
언어학자가 아니더라도 신어를 통해 우리 삶의 변화 양상과 언어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 말글지기가 아니더라도 새말로 우리 삶길과 말길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다
73쪽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 말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 지나칠는지 모르겠지만
92쪽
최초로 이모티콘을 발명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 그림꽃을 처음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 그림글씨를 처음 지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108쪽
죽은 것도 아니요, 산 것도 아닌 좀비처럼 한 학기가 지나가 버렸기
→ 죽지도 살지도 않은 산송장처럼 한 철이 지나가 버렸기
110쪽
국민들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공감하면서 국어학자로서 우리 말살이 속에 남아 있는 일본말 찌꺼기를 청산해야 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다
→ 사람들이 일본 살림을 안 살 적에 반겼다. 나는 말꽃지기로서 우리 말살이에 남은 일본말 찌꺼기를 털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231쪽
여전히 문해력은 전통적인 읽기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 아직도 읽힘은 글씨 읽기를 바탕으로 한다
→ 요즘도 읽기라면 글씨를 본다
→ 요사이도 글읽기를 살핀다
226쪽
혐오표현은 특정 대상에 대한 우리 내부의 편견, 혐오를 분출시켜 표현함으로써
→ 막말은 어느 이웃을 비뚤어 보는 뒤틀린 마음을 나타내어
→ 추레말은 몇몇 사람을 비틀려는 미움을 드러내어
207쪽
부르던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영 어색할 것 같다
→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 처음에는 영 낯설 듯하다
→ 예전과 달리 이름만 부르면 처음에는 영 낯설다
20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