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글쓴이 숲노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적' 없애야 말 된다 평균적 평균적으로 키가 큰 편이다 → 거의 키가 크다 / 두루 키가 크다 평균적 발달 속도 → 여느 자람새 평균적 신장 → 여느 키 ‘평균적(平均的)’은 “수량이나 정도 따위가 중간이 되는”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비금비금·비슷비슷·어슷비슷·엇비슷’이나 ‘웬만하면·이럭저럭·이래저래·그럭저럭·그런대로’이나 ‘줄·줄잡다·고르다’나 ‘피장파장·한결같이’로 고쳐쓸 만하고, ‘거의·으레·여느·얼추·어림’이나 ‘언제나·다들·-마다·노상·노·늘’이나 ‘고루·고루고루·고루두루·골고루·두루·두루두루’로 고쳐쓰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주당 38시간 일하는데 → 이레마다 38시간 일하는데 → 줄잡아 이레에 38시간 일하는데 → 다들 이레에 38시간 일하는데 → 늘 이레에 38시간 일하는데 → 이래저래 이레에 38
[ 배달겨레소리 글 쓴이 숲노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말. 웃음팔이 어느새 스며서 퍼진 말을 안 쓰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퍼졌다면 쓸 만합니다. 다만 이때에 한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느 말이든 쓸 적에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남들이 쓰니까 그냥그냥 우리로서는 딱히 더 살피지 않거나 아무 생각이 없이 따라서 쓰는 길입니다. 둘째, 남들이 쓰더라도 스스로 더 살피거나 생각하거나 알아보면서 알맞게 가다듬거나 추스르거나 풀어내거나 다듬어서 쓰는 길입니다. 셋째, 앞으로 태어나서 자랄 아이들이며 무럭무럭 크는 아이들을 헤아려, 이 아이들이 머잖아 듣고 배우기에 아름답고 즐겁고 좋고 사랑스럽고 따사롭고 넉넉하다 싶도록 새말을 짓는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는 되도록 셋쨋길을 가려 합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뭐, 그쯤 그냥 써도 다 알지 않나?”일 테지만, 아이가 보기에는 “어, 그 말 뭐예요?”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처음부터 모두 새로 받아들이고 배울 아이 마음이 된다면, 셋쨋
[ 배달겨레소리 글쓴이 숲노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달날 이레말 - 의 : 교육의 교육의 목적을 탐구하다 → 가르치는 뜻을 살피다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다 → 왜 가르치는지 잊다 교육의 정석 → 가르치는 참길 / 가르침길 ‘교육(敎育)’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을 가리킨다지요. ‘교육 + -의’ 얼개에서는 ‘교육’을 ‘가르치다’나 ‘배우다’로 손보면서 ‘-의’를 털면 됩니다. 아들러가 굳이 명저를 통해 인간의 자유로운 교육의 회복을 부르짖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 아들러가 굳이 아름책으로 사람들이 실컷 배워야 한다고 부르짖는 뜻이 있다 → 아들러가 굳이 온책으로 사람들이 마음껏 배워야 한다고 부르짖는 까닭이 있다 《자유인을 위한 책읽기》(모티머 아들러/최영호 옮김, 청하, 1988) 머리말 이러한 허위를 깨뜨리고 흑인들에게 그들 자신과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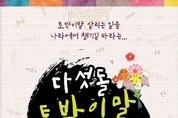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글씀이 온바람 ] #토박이말바라기 #경남교육청 #다섯돌 #토박이말 #어울림 #한마당 #잔치 [다섯 돌 토박이말 어울림 한마당 잔치] 경남교육청과 토박이말바라기가 함께 마련한 다섯 돌 토박이말 어울림 잔치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 해 동안 거둔 토박이말 놀배움 열매를 나누고 배움이들의 토박이말 솜씨를 뽐내는 자리입니다.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치 누리집 http://xn--pz2bn5bs2rydu47a45e.kr/
[ 배달겨레소리 글쓴이 숲노래 ] '내일'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란? 그리고 '갑(甲)'이란?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말. 다음 제가 하는 일이 말꽃쓰기(사전집필)이다 보니, 저한테 여러모로 낱말을 묻는 분이 많습니다. 꽤 자주 물어보시는 낱말이 ‘내일’입니다. “‘내일’이 한자말이잖아요. ‘하제’라는 옛말이 있다고 하는데, 또다른 우리말은 없을까요?” 하고 물으셔요. 흐름으로 본다면 ‘그제·어제·오늘·하제·모레’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제’만큼은 어쩐 일인지 죽은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제·어제·오늘·모레’ 네 마디는 숱한 고빗사위와 너울이 갈마들었어도 씩씩하게 살아남은 낱말인 셈입니다. 먼저 ‘하제’를 혀에 얹으면 좋고, 다음으로는 ‘이튿날’이나 ‘다음날(담날)·뒷날’이라 할 만하고, 뜻이나 자리에 따라 ‘나중·모레·새날·앞날·곧’을 두루 쓸 만하지요. 요즈막에 ‘갑질·갑을’이란 말씨가 꽤 불거져서 번지는데, 오랜 말씨로는 ‘웃질·막질’이고, ‘ㄱㄴ’이나 ‘가나’로 나타내면 돼요. 외마디 ‘갑(甲
[ 배달겨레소리 글쓴이 숲노래] ‘졸졸’, ‘줄기’에서 비롯한 낱말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말. 졸따구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고 합니다. 빗물이 ‘줄줄’ 샌다고 해요. ‘졸·줄’은 말밑이 같습니다. ‘졸졸’이나 ‘줄줄’은 이리저리 휘는 모습이 아니에요. 곧게 흐르는 모습입니다. 곧게 흐르는 모습은 ‘줄기’라는 낱말에서 비롯하지요. ‘빗줄기·등줄기·멧줄기’처럼 쓰기도 하는데, 먼저 ‘풀줄기·나무줄기’입니다. 이러한 결은 “줄을 맞추다”에서 ‘줄’로 나아가고, 글을 쓰다가 ‘밑줄’을 긋는 데로도 잇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모습마냥 “졸졸 따라가기”도 합니다. “줄줄이 잇는” 일도 있어요. ‘졸졸·줄줄’은 곧은 모습이나 몸짓을 나타내는데, 반듯한 결을 나타낼 적에도 쓰지만,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렇게나 뒤를 좇을 적에도 씁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안 짓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가 보잘것없다고 여겨, 한자로 ‘졸(卒)·졸렬’을 쓰기도 합니다만, ‘졸따구’나 ‘졸때기’는 한자하고는 동떨어진 말밑입니다. 어쩌면 한자나
[ 배달겨레소리 글씀이 한실 ] 여러분은 우리말로 몇까지 셀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아홉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흔아홉 쉰 또는 쉰아홉까지는 잘 세다가 그 다음에 예순하면 육십으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육십 칠십 팔십 구십 이렇게 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온, 온이 백인데요. 온이 백을 밀어내고 안방차지해서 온이라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온 누리나 온 집안 같은 말에서 그 자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셈을 안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열줄 스무줄 마흔줄 쉰줄에 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오늘날은 다 십대 이십대 삼십대 사십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쉰 해 앞만 해도 쉰줄에 들다, 그 사람은 마흔줄일걸?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열줄 이러면 거의 귀에 거슬리다시피 안 들어오지요? 그 사람 아직 열줄일걸 아냐 스무줄일 거야 이랬던 것을 오늘날 이 대가 줄을 밀어내고 자리차지한 거죠. 마흔아홉 쉰 쉰하나 이래 가다가 예순 일흔 해야 할 때 육십 칠십으로 건너뛸 뿐 아니라 육순

[ 배달겨레소리 글쓴이 한실 . 빛박이 : 뮘그림(영화) 말모이 ] 꽃봉오리 같은 우리 아이들이 첫 배곳에 들면 빼어나고 거룩한 배달말은 어쩌다가 배우고, 할매 할배들이 오랫동안 살려 가꾸어 온 겨레말에는 아예 없던 (한글)왜말을 배우고 익혀요. 섬나라 사람들 종살이에서 벗어난지 일흔 다섯 해가 넘었는데도 저네들이 배달말 없애려고 세운 “학교”에서는 오늘날에도 왜놈들이 그토록 바라서 씨 뿌려놓은 왜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슴이 미어질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책(이른바 교과서)을 만드는 사람들도 책속에 담긴 한글 왜말을 가르치는 가르침이(교사,선생님)들도 이런 엉뚱한 짓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덟살 아이들이 배곳에 들자마자 배우는 첫배곳 ‘배달말 1-1 가’(초등국어 1-1 가)에서 찾아 바로 잡아 볼까요. 본디 국어란 말은 배달말(그때는 조선말)을 죽이려고 저들이 세운 학교에서 가르치던 왜말을 일컫던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써요. 참 어처구니없지 않아요. 이 말부터 어서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막둥이 임금처럼 나랏말이라 하든가 처음 우리말 이름인 배달말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지요. 하기는 오늘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