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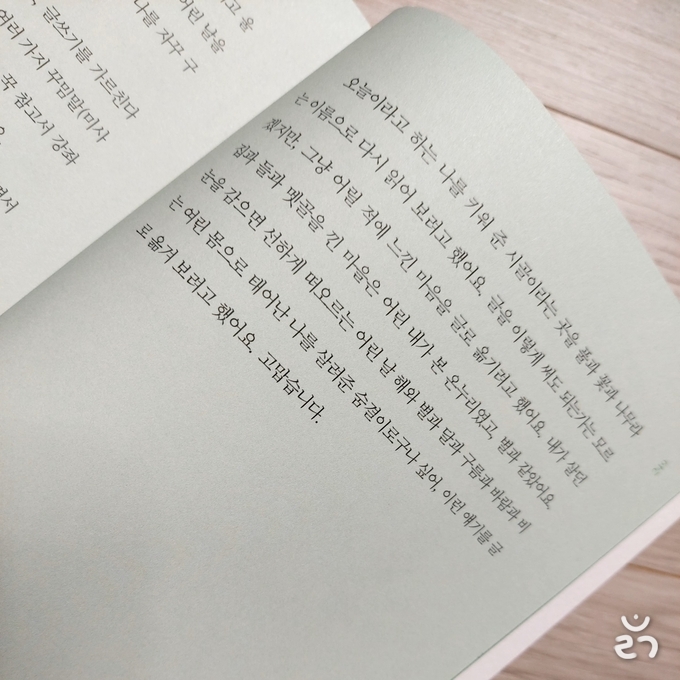
[작은삶 79] 책값 받기
옆집에 고기를 사러 갔다. 고기를 썰던 아저씨가 “서점에 가면 책 파니껴?” 하고 묻는다. 며칠 앞서 이웃 어르신이 시내 서점에 갔더니 내 책이 없더란다. 헌책을 파는 집이라 새책이 없다고 했다. 여든일곱 살 어르신이 일부러 내 책을 사려고 집에서 꽤 먼 걸음을 했다. 인터넷으로 사라는 일꾼 말을 듣고 내게 묻는다. “제가 사 드릴게요.” 했다.
2022년 12월 겨울에 낸 《풀꽃나무하고 놀던 나날》이 서점에 깔린 뒤에 처음으로 내 책을 한 권 산 일이 있다. 뜯지도 않은 책을 그대로 갖다 드렸다. 내가 사주겠다고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책값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다. 곁님도 들었기에 뒤늦게 책값을 받았는지 묻는다. 돈을 받기 뭣해서 그냥 두시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이 꼬투리가 될 줄 몰랐다.
고기집으로 주소를 적었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우리 집으로 책이 왔다. 이튿날 갖고 가니 고기집에 아무도 없다. 뜨락에 올려놓고 나오는데 길에서 아저씨를 만났다. 책값을 받아 가라고 손짓을 하는데 손사래를 쳤다. 내가 뒷마당에 간 사이에 아저씨가 뒤따라 와서 나를 찾다 없어 곁님한테 책값을 맡겼다. 밖에서 들어오니 버럭 성을 낸다.
“책값을 왜 안 받아?”
“고기도 얻어 먹는데 어떻게 받아.”
“그건 그거고 쓸데없이 왜 책값을 날리노. 누가 보면 사서 주는 줄 모르고 그냥 주는 줄 알게 아니가?”
컴퓨터 앞에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돌아보는 얼굴에 나도 짜증이 났다. 그냥 좀 사주면 어때서. 나이가 드셔서 살 줄 잘 모르는데 내가 또 한 권 사 드리면 어때서, 한 푼 벌이가 힘든데 돈 허투루 쓴다고 말을 하니 할 말이 없었다. 받아야 할 책값이지만 받기가 뭣한 마음을 몰라주는 듯했다. 받아 놓은 책 한 권 값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휙 들어왔다.
누구는 내가 이름난 사람도 아니니깐 둘레에서는 내 책을 돈을 치러서 사서 볼 생각조차 않는다고 하더라. 알아서 사줄 줄도 모른다더라. 그렇다고 둘레에 내 책 좀 사 달라고 말을 할 줄도 모른다. 시집으로 첫 책을 낼 적에는 이곳저곳에 많이 드렸는데, 그냥 드릴 적에는 둘레에서 좋은 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더러 사주는구나 싶더니만, 《풀꽃나무》 책은 일부러 아무한테도 거저로 안 주었더니, 모두가 입을 싹 닫는 듯 보인다. 두 책은 무엇이 다를까? 두 가지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어쩐지 풀이 죽은 사람처럼 묻혀가는 듯하다. 그렇지만 속으로 딴생각을 한다. “사람들아 두고보아! 내 책이 언젠가 뜬다고! 나는 좋은소리를 들으려고 책을 내지 않았어! 마음을 들려주고 마음을 듣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썼어!” 하고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다른 분들도 스스로 책을 내놓아 보면 이 마음을 알 테지. 참말로 읽고 싶어서 서점을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왜 책을 보내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은 다르다. 참말로 읽고 싶으면 나한테 보내 달라 말하지 않고 먼저 스스로 서점에서 책을 사지 않았을까?
2023. 02. 24. 숲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