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햇내기 처음 해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걸음이라 풋풋하고, 햇병아리라서 새가슴이라지만, 낯설어도 조그맣게 발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어린이라서 안 된다면, 설익어도 못 한다면, 너무 딱딱해요. 코흘리개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직 철없거나 모자라다지만, 수수하게 짓는 멋으로 차근차근 나아갑니다. 둘레에서 쪼다라 놀리기도 하고 얼치기라고 손가락질을 하는군요. 이럴 적에는 “짧아서 잘못했습니다. 아직 새까맣거든요. 어리버리한 저를 즐거우면서 상냥하게 가르쳐 주셔요.”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누구나 새내기예요. 누구라도 아이라는 숨빛을 품습니다. 오래오래 섣부를 수 있어요. 한참 해보았어도 엉성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해바라기를 하는 햇내기처럼 오늘을 가꿉니다. 남들이 바보라고 비웃거나 멍청하다고 나무라도 빙그레 웃으면서 “모르니까 배우면서 일어서려고요.” 하고 여쭙니다. 투박하게 걷습니다. 좀 어정쩡한 걸음새여도 척척 내딛습니다. 낯선 길을 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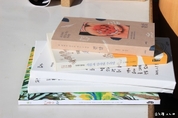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꽃 말꽃삶 6 자유 우리 낱말책은 우리말을 실었다기보다 일본말이나 중국말을 잔뜩 실었습니다. 이를테면 한자말 ‘자유’를 국립국어원 낱말책에서 뒤적이면 다섯 낱말을 싣습니다. 자유(子有) : [인명] ‘염구’의 자 자유(子游) : [인명] 중국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유학자(B.C.506∼B.C.445?) 자유(自由) : 1.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2. [법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3. [철학]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자유(自有) :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유(刺楡) : [식물] 느릅나뭇과의 낙엽 교목 첫 올림말로 삼은 “자유(子有) : [인명] ‘염구’의 자”인데, 더 뒤적이면 “염구(?求) : [인명] 중국 춘추 시대의 노나라 사람(?~?)”처럼 풀이합니다. 중국사람 이름 둘을 먼저 올림말로 삼아요. 참 엉터리입니다. 둘레에서 널리 쓰는 한자말 ‘자유’는 셋째에 나오며 ‘自 + 由’ 얼개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쓰는 낱말인 ‘자유’일 테지만, 일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에서 짓는 글살림”은 숲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골자락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을 짓는 길에 새롭게 맞아들여 누리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숲에서 짓는 글살림 35. 가시버시 제가 여덟아홉 살 무렵이던 어린 날은 1980년대 첫무렵입니다. 이즈음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남녀칠세부동석’ 같은 말을 읊던 분이 있었어요. 또래끼리 가시내이든 사내이든 섞여서 놀면 몹시 못마땅하다면서 서로 갈라야 한다고 나무라곤 했습니다. 가만 보니 할머니는 으레 할머니끼리만 어울리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끼리만 어울리더군요. 이런 흐름은 배움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여느 때에는 가시내랑 사내를 안 가리고 잘 놀다가도 ‘가시내 쪽’하고 ‘사내 자리’로 가르기 일쑤였어요. ‘여자 쪽’에서는 더러 ‘남녀’란 말이 안 내킨다고, ‘여남’이라 말해야 한다는 소리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보니 고개를 끄덕일 만해요. 여느 어른은 으레 ‘아들딸’이라고만 말합니다만, ‘딸아들’이라 말해도 되는데 말이지요. 딸아들 : x 아들딸 :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여남 : x 남녀(男女) : 남자와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쯤에서 국립국어원 낱말책을 뒤적이겠습니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쇠날 이레말 - 사자성어 11 온도차이 둘 사이에 자꾸 온도차이가 발생한다 → 둘 사이가 자꾸 갈린다 온도차이를 실감할 뿐이다 → 안 맞는 줄 느낄 뿐이다 / 틈을 깨달을 뿐이다 서로 온도차이가 확연하다 → 서로 뚜렷하게 다르다 온도차이 : x 온도차(溫度差) : x 온도(溫度) : [물리]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 물리적으로는 열평형을 특징짓고 열이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양이며, 미시적으로는 계(系)를 구성하는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분포를 정하고 그 평균값의 표준이 되는 양이다 차이(差異)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날씨나 철이 다른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마음이 다른 결을 가리키기도 하는 ‘틈·틈새·사이’요 ‘구멍’입니다. ‘멀다·벌어지다·동떨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영향 影響 부정적 영향 → 나쁜물 / 나쁜바람 영향을 받다 → 끼치다 / 가다 / 흔들다 / 휩쓸리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다 → 크게 끼치다 / 크게 퍼지다 / 크게 스미다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아이는 어버이한테서 배운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 몸에 나쁘게 물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바람골 탓에 비가 내릴 듯하다 행동 양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장면이 하나 있다 → 몸짓을 크게 바꾼 일이 하나 있다 ‘영향(影響)’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가다·미치다’나 ‘맞다·받다·맞아들이다·받아들이다·배우다·바꾸다·바뀌다’나 ‘물·물결·물들다·흔하다’로 손보고, ‘힘·심·손·손아귀·손힘’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44 어울길 푸른배움터에 들어가는 1988년 즈음에 ‘문화의 거리’란 말을 처음 들었지 싶어요. 더 앞서부터 이런 이름을 썼을는지 모르나 서울에서 놀이마당(올림픽)을 크게 편다면서 나라 곳곳에 ‘문화·예술’을 붙인 거리를 갑작스레 돈을 부어서 세웠고, 인천에도 몇 군데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나 ‘예술의 거리’란 이름을 붙인 곳은 으레 술집·밥집·옷집·찻집이 줄짓습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버리는 길거리이기 일쑤예요. 즐겁게 먹고 기쁘게 마시고 반갑게 쓰다가 푸른빛으로 돌아가도록 내놓으면 나쁠 일은 없되, 돈이 흥청망청 넘치는 노닥질에 ‘문화·예술’이란 이름을 섣불리 붙이면 안 맞기도 하고 엉뚱하구나 싶어요. 먹고 마시고 쓰며 노는 곳이라면 ‘놀거리’나 ‘놀잇길·놀잇거리’라 하면 됩니다. 우리 삶을 밝히면서 이웃하고 새롭게 어우러지면서 차근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43 윤슬 서울에 바깥일이 있어 나들이한 어느 날 체부동 〈서촌 그 책방〉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날 책집지기님한테서 ‘윤슬’이란 낱말을 새삼스레 들었습니다. 느낌도 뜻도 곱다면서 무척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진작부터 이 낱말을 듣기는 했으나 잊고 살았는데, 이튿날 천호동 마을책집을 찾아가려고 골목을 헤매다가 ‘윤슬’이란 이름을 붙인 찻집 앞을 지나갔어요. 사람이름으로도 가게이름으로도 조곤조곤 퍼지는 ‘윤슬’이요, 국립국어원 낱말책을 뒤적이면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로 풀이합니다. 그런데 ‘달빛’이란 ‘없는 빛’입니다. 햇빛이 달에 비추어 생길 뿐이니 ‘달빛’이란 ‘튕긴 햇빛·비친 햇빛’입니다. 곰곰이 ‘윤슬’을 생각해 보는데, 이 낱말이 어떻게 태어났거나 말밑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때에 여러 우리말결을 나란히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말넋 고약말 꾸러미 ― 문제아 [국립국어원 낱말책] 문제아(問題兒) : [심리] 지능, 성격, 행동 따위가 보통의 아동과 달리 문제성이 있는 아동. 넓은 뜻으로는 이상아, 특수아, 결함아 등을 뜻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주로 행동 문제아를 이른다 ≒ 문제아동 문제어른 : x 문제(問題) : 1.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2.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3.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 4. 귀찮은 일이나 말썽 5.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 문제가 있다고 여겨 ‘문제아·문제아동’ 같은 말을 쓰는 어른입니다. 한자말 ‘문제’는 ‘말썽’을 가리켜요. ‘말썽꾼·말썽꾸러기·말썽아이’라고 말하는 셈인데, 둘레를 보면 말썽을 일으키는 어른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어른을 보며 ‘말썽어른’이라 말하지는 않아요. 말썽쟁이·말괄량이 개구쟁이·장난꾸러기 “왜 어른한테는 말썽쟁이라 안 해?” 하고 따질 만합니다만, 우리말로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 = 늙은이’요, ‘어른 = 철이 들어 스스로 삶을 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나이가 많기에 어른이 아니라, 철이 들어 어진 사람이 어른입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말넋 고약말 꾸러미 ― 자녀 [국립국어원 낱말책] 아들딸 :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딸아들 : x 자녀(子女) :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여자(女子) : 1.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 여 2. 한 남자의 아내나 애인을 이르는 말 3. [역사] 신라에서, 궁내성에 속하여 침방(針房)에서 바느질하는 일을 맡아보던 나인 아들하고 딸을 아우르는 이름은 ‘아들딸’입니다. 한자로 옮기면 ‘자녀’입니다. 딸하고 아들을 아우르는 이름은 ‘딸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낱말책에는 우리말 ‘딸아들’을 안 올려놓습니다. 한자말 ‘자녀’를 뒤집은 ‘녀자(여자)’도 ‘딸아들’을 가리키는 뜻이 없습니다. 고명딸 고명아들 새해맞이 떡국에는 손품을 들여 고명을 올려요. 영어로는 ‘토핑’일 ‘고명’인데, 우리말 ‘고명딸’은 한자말로 ‘무남독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낱말책은 ‘고명아들’은 안 실어요. ‘삼대독자’쯤이라면 ‘고명아들’일 텐데 말이지요. 앞으로 우리 낱말책은 ‘딸아들·아들딸’을 나란히 다루면서, ‘고명딸·고명아들’을 같이 실으면서, 모든 아이를 사랑으로 품는 길을 들려줄 수 있어야지 싶습니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5. 뒷종이 앞에 다른 글이나 그림이 깃들지만, 뒤는 하얀 종이가 있다. 뒤가 말끔하기에 살려쓰자는 뜻으로 “이면지 활용”을 말하는데, 앞쪽 아닌 뒤쪽을 아직 안 써서 하얗기에 살려쓰는 종이라 하면 ‘뒷종이’라 할 만하다. 뒷종이 : 종이를 앞뒤로 놓고 볼 적에, 쓴 한쪽이 아닌, 쓰지 않은 한쪽. 한쪽을 썼으나 다른 한쪽은 아직 쓰지 않은 종이. (← 이면지) 6. 뒷북치다 한창 할 적에는 조용하다가, 모두 끝나고서 불쑥 나서서 떠드는 사람이 있다. 함께 땀흘리며 모인 자리에서는 뒷짐을 지더니, 다 끝낸 자리에 뜬금없이 나서서 티내려는 사람이 있다. 뒷북인 셈인데, 혼자 돋보이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창이던 무렵에는 막상 알아차리지 못 한 터라 뒤늦게 알아차리고서 나서는 마음도 있다. 얄궂으면 ‘뒷북꾼’이요, 귀여우면 ‘뒷북아이’에 ‘뒷북노래’이다. 뒷북치다 : 하거나 누리거나 펴거나 있을 적에는, 안 하거나 안 누리거나 안 펴거나 없더니, 모두 끝이 난 뒤에 하거나 누리거나 펴거나 있으려고 움직이거나 나오거나 나서거나 떠들다. (= 뒷북·뒷북노래·뒷북이·뒷북아이·뒷북님·뒷북꾼·뒷북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