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30 헤엄이 마흔 살이 넘도록 헤엄을 못 쳤습니다. 물하고 도무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마흔너덧 무렵에 비로소 헤엄질이 무엇인가 하고 느꼈어요. 헤엄질이 된 까닭은 딱 하나예요. 남들처럼 물낯에서 물살을 가르지 못해도 된다고, 나는 물바닥 가까이로 가라앉아서 천천히 물살을 갈라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속으로 몸을 가라앉혀서 숨을 모두 내뱉고서 가만히 움직여 보았는데, 뜻밖에 이 놀이는 매우 잘되더군요. 몸에 힘을 다 빼니 스르르 물바닥까지 몸이 닿고, 물바닥에 고요히 엎드려서 눈을 뜨고 물이웃을 보았어요. 물이웃이란 ‘헤엄이’입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먹이’로 본다면, 물에서 헤엄치는 숨결을 ‘물고기’로 삼겠지만, 저는 물살을 시원시원 가르며 저랑 눈을 마주하는 아이들을 ‘고기’란 이름으로 가리키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이름으로 가리키면 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29 무릎셈틀 볼일이 있어 바깥으로 멀리 다녀와야 할 적에 셈틀을 챙깁니다. 자리에 놓고 쓰는 셈틀은 들고다닐 수 없기에, 포개어 부피가 작은 셈틀을 등짐에 넣어요. 영어로 ‘노트북’이라 하는 셈틀을 2004년 무렵부터 썼지 싶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그대로 썼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고다니는 셈틀 = 노트북”처럼 수수하게 이름을 붙인 이웃나라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더군요. 이름짓기란 수수하고 쉽다고, 이름이란 삶자리에서 문득 태어난다고, 스스로 즐거이 가리키고 둘레에서 재미있거나 반갑다고 여길 이름은 시나브로 떠오른다고 느꼈어요. “최종규 씨도 ‘노트북’만큼은 우리말로 이름을 못 붙이나 봐요?” 하고 묻는 분이 많았는데 빙그레 웃으면서 “음, 얼른 우리말을 지어내기보다 이 셈틀을 즐겁게 쓰다 보면 어느 날 이름 하나가 찾아오리라 생각해요.” 하고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 좀 생각합시다 26 알못 ‘알못’이란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이가 제법 든 어른이라면 알처럼 생긴 못인가 하고 여길 만합니다. 그런데 ‘알처럼 생긴 못’은 살림에 박는 길고 뾰족한 것 하나에, 물이 고여 찰랑이는 곳 둘이지요. 또는 알이 있는 못물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어느새 사람들 입에 착 달라붙은 ‘알못’은 “알지 못하는”을 간추린 낱말입니다. ‘겜알못·야알못·축알못’처럼 흔히 쓸 뿐 아니라 곳곳에 ‘-알못’을 붙여서 써요. 그동안 ‘-맹(盲)’이나 ‘-치(癡)’ 같은 한자만 붙여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면, 오늘날에는 꽤 새롭게 말틀을 빚었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바보’를 붙여서 ‘야구바보’나 ‘축구바보’라 하기도 했지만, 이때에 ‘바보’는 “알지 못하는”뿐 아니라 “어느 하나에 푹 빠진”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야구바보’라 하면 야구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른다는 느낌이지요. 그러니까 ‘알못’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레트로retro 레트로 : x retro : 복고풍의 レトロ(프랑스어retro) : 레트로, 복고(復古)풍, 복고조, 회고적(임) 한때는 한자말 ‘복고’를 쓰던 사람들이 요새는 ‘레트로’라는 프랑스말을 쓴다는데, 우리말로는 ‘다시서다·다시하다’나 ‘돌리다·돌아가다·되돌리다·되돌아가다’나 ‘되살다·되살아나다·되일어나다·되일어서다’라 하면 됩니다. ‘되풀이·또·또다시·또또’라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새·새롭다’로 나타냅니다. ‘아스라하다·지나가다’나 ‘예스럽다·옛날스럽다’를 쓸 수 있어요. ‘예·예전·옛날’이나 ‘옛멋·옛맛·옛모습·옛빛’이나 ‘오래되다·오랜·오래빛·오랜빛’으로 나타내어도 어울립니다. 요즘 레트로 바람을 타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과자들이 그때는 문방구 좌판에 누워 → 요즘 옛바람을 타고 누리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삶말/사자성어] 전용도로 소형차를 위한 전용도로에서 → 작은길에서 버스 전용도로로 침범했다 → 버스길로 넘어왔다 전용도로 : x 전용(專用) : 1.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2.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씀 3.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씀 4. 오로지 한 가지만을 씀 도로(道路) :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어느 한 가지만 다니도록 마련한 길을 한자말로 ‘전용도로’라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자면 ‘제길’이나 ‘혼잣길·혼길·홀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찻길’이라 하면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자전거길’이라 하면 되며, “버스 전용도로”라면 ‘버스길’이라 하면 되어요. 수수하게 ‘길’로 담아낼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이름꽃 우리는 스스로 높이거나 낮춥니다. 남이 우리를 높이거나 낮추지 못 합니다. 저이가 우리를 놈팡이라 부르기에 우리가 놈팡이일 까닭이 없어요. 이웃한테 꽃나래를 펴지 않는 마음인 그이 스스로 놈팡이일 뿐입니다. 그사람한테 그님이라 부르더라도 그쪽 사람이 그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 스스로 님인 줄 깨닫고 받아들일 적에 비로소 그이는 그님입니다. 남이 마련한 꽃길을 걷기에 꽃자리이지 않습니다. 모든 꽃길도 가싯길도 우리가 스스로 냅니다. 길잡이란 따로 없어요. 누구나 스스로 길잡이입니다. 알아보려는 사람이 별빛을 읽어 길을 찾습니다. 생각해 봐요. 별은 늘 그곳에 있으나, 별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길잡이별로 삼지 못 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낮춤말이나 막말을 안 씁니다. 아이한테도 동무한테도 누구한테도 높임말을 써요. 풀꽃나무하고 풀벌레한테도 다 다른 이름꽃을 밝힐 높임말을 씁니다. 우리는 서로 꽃낯으로 마주할 빛줄기입니다. 한 발짝 다가서 보면, 발만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말많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해본다면, 1980해무렵(년대)을 어린이로 보내는데 둘레 어른들이 “사내놈이 뭔 말이 많아? 고추 떨어진다!” 하면서 ‘수다 = 가시내’로 몰아붙이고 ‘사내는 점잖게’ 있어야 한다고 꾸짖고 숱하게 꿀밤을 먹이더군요. 지난날 어른이란 분들은 순이돌이가 사이좋게 얘기를 펴면서 생각을 나누고 슬기롭게 일을 풀어나가도록 북돋운 일이 드물어요. 집안기둥이라는 사내(아버지·할아버지)가 밀어붙이기 일쑤였어요. 함께짓는 집살림이라면 서로서로 사랑을 바탕으로 손짓기를 할 적에 즐거우면서 아름답습니다. 말이 좀 많은들, 시끌시끌한들, 북적북적 떠들썩한들 대수롭지 않습니다. 한집을 이루어 살아가는 길이란 서로 따사로운 품으로 자라난다는 뜻이라고 여겨요. 차근차근 엮고 기쁘게 나누고 가만가만 짜면서 웃음잔치로 노래하는 하루이기에 왁자지껄하게 ‘우리 집’이라고 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수 가꾸며 빛나는 둥지입니다. 나란히 돌보며 눈부신 보금자리입니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우리말씨 우리가 쓰는 ‘우리말’은 다른나라에서는 그리 안 쓴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짓밟은 나날”을 치른 나라라면, 이웃나라가 이녁 말을 쓰도록 억누른 적이 있던 나라라면, 그곳에서도 ‘우리말빛’을 지키려는 물결이 일게 마련이요, ‘우리말씨’를 가꾸려는 마음이 샘솟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지은 글은 ‘훈민정음’이지만 오늘날은 ‘한글’이란 이름을 새롭게 씁니다. 한문으로 지었기에 안 쓰는 ‘훈민정음’이 아니라, 스스로 새꽃으로 피어나서 뒷사람 누구한테나 앞날을 밝힐 빛살로 퍼지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지은 ‘한글’이기에 널리 써요. ‘한’은 우리를 스스로 일컫는 이름이면서 ‘하나·하늘·크다·해·밝다·함께’를 아우르는 낱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어’ 아닌 ‘한말’로 짝을 이룰 만해요. 아이한테 물려줄 말을 헤아리면서, 뒷님이 나중에 즐거이 쓸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주먹짓 아닌 살림빛으로 거듭나는 작은숲이 숨결로 말글을 돌본다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연이와 버들잎 소년》 이원수·손동인 엮음 창작과비평사 1980.7.10. 《연이와 버들잎 소년》(이원수·손동인 엮음, 창작과비평사, 1980)이란 옛이야기 글모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백희나 님이 빚은 그림책으로 “연이 버들잎” 이야기가 확 퍼진 듯한데, 아무리 새 그림책이 나오더라도 옛이야기 줄거리하고 얼거리하고 삶넋부터 찬찬히 읽고 돌아볼 노릇이라고 봅니다. 우리 옛이야기는 모두 수수한 순이돌이 삶을 담습니다. 잘나거나 이름나거나 돈있는 벼슬아치나 글바치나 임금붙이 이야기는 안 담지요. 왜 그럴까요? 돈바치·벼슬아치·글바치·임금붙이는 그야말로 돈·이름·힘에 얽매여 스스로 죽음길로 달려갑니다. 이와 달리 수수한 순이돌이는 삶·살림·사랑을 숲에서 스스로 짓는 슬기로운 하루를 짓고 나눠요. 우리 옛이야기는 바로 삶·살림·사랑하고 숲·스스로·슬기를 어른하고 어버이부터 되새기면서 아이들이 이 숨결을 고이 이어받아서 새롭게 가꾸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만합니다. 옛이야기는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옛이야기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옛이야기는 글꽃(문학)이 아닙니다. 옛이야기는 고스란히 우리 삶이자, 말이자, 넋이자,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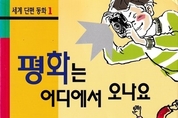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 구드룬 파우제방 신홍민 옮김 김중철 엮음 웅진닷컴 1997.4.20.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구드룬 파우제방/신홍민 옮김, 웅진닷컴, 1997)를 1999년에 처음 만났어요. 책이름을 이처럼 아름다이 붙일 수 있어 놀라웠고, 어린이부터 누구나 차근차근 되새길 이야기가 사랑스러워 반가웠습니다. 이때 뒤로 이 책을 둘레에 꽤 건네었고, 알렸고, 들려주었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를 돌보는 어버이라는 나날을 살며, 우리 집 아이하고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읽었니? 이 책에 나오는 미움하고 눈물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니?” 빙그레 웃기만 하는 아이들한테 더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넉넉해요. 천천히 돌아보면서 마음 가득 어깨동무를 품으면 되어요. 한자말 ‘평화’는 우리말로 하자면 ‘손잡기’나 ‘어깨동무’입니다. 손을 잡기에 평화예요. 서로 손을 잡아야 이 손에 총칼을 못 쥐지요. 아니, 서로 손을 잡기에 따사로이 흐르는 숨결을 서로 느끼고, 이 숨결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소꿉놀이를 짓는 길을 생각할 만합니다. 어깨동무이기에 평화예요. 어깨를 겯으며 걸어야 안 다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