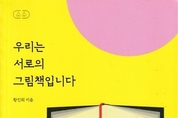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우리말 살려쓰기 다듬읽기 1 《우리는 서로의 그림책입니다》 황진희 호호아 2022.6.30. 《우리는 서로의 그림책입니다》(황진희, 호호아, 2022)를 읽었습니다. 일본 그림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뜻깊게 하시는구나 싶으면서도, ‘우리말씨’를 미처 살피지 못 하는 대목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부터 볼 뿐 아니라, 아기가 어버이 목소리로 듣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이란, 다른 어느 책보다 토씨 하나를 더 가다듬고 낱말 하나를 새로 추슬러서, ‘무늬만 한글’인 책이 아닌 ‘알맹이로 수수하게 우리 살림살이를 숲빛으로 밝히는 이야기꽃’으로 여미려고 할 적에 ‘옮김(번역)’을 이룬다고 느낍니다. 어린이하고 함께 읽는 그림책을 우리말로 슬기롭고 어질게 옮기자면 ‘어른끼리 주고받는 말’이라든지 ‘어른이 읽을 책에 쓰는 글’부터 ‘더 쉽고 수수하게 손질한 우리말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온마음을 기울여야 글쓰기와 글옮김을 ‘어른답’게 ‘철든’ 눈빛으로 하게 마련입니다. 진행하는 방법도 매번 조금씩 변주한다 → 늘 조금씩 다르게 이끈다 → 으레 조금씩 새롭게 꾸린다 → 그때그때 조금씩 바꾸어 본다 …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서슴없다 저는 1995∼97년에 싸움터(군대)에서 뒹굴어야 했는데, 이무렵 지내야 하던 강원 양구 멧골짝은 ‘도솔산’이고, 꼭대기에 깃들었습니다. 그곳은 늘 구름이 걸렸고, 한 해에 닷새쯤 해를 볼까 말까 하다는데, 빨래가 참 안 말랐어요. 모처럼 해가 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온살림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해바라기를 시켰습니다. 눅눅하게 찌든 사람들은 마음도 눅눅하더군요. 우리는 누구라도 햇볕 한 줌을 먹으려고 그늘을 꺼렸고, 윗내기(고참)한테 밀려 한여름에 그늘에 서는 새내기(신병)는 울먹거립니다. 죽음 같은 수렁에서는 어깨동무가 어렵고 서로돕기는 뜬소리에 하나되기는 헛말일까요. 배고프면 누구나 짠놈에 노랑이로 바뀔까요. 여름에는 비에, 겨울에는 눈에, 늘 추진 그 싸움터는 1998년부터 닫아걸었다고 들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도솔산에서 숲짐승은 홀가분하게 살더군요. 오순도순 즐겁고, 서슴없이 뛰어요. 그곳 멧자락 풀꽃나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가위질 조용한 곳에서는 조용히 흐르는 기운을 가늠하면 둘레를 한결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한 데에서는 고요하게 깨어나는 숨결을 헤아리면서 마음을 더 그윽히 돌아볼 수 있어요. 시끄럽게 들쑤시듯 부릉부릉 소리가 넘치는 곳에서 살아간다면, 바람노래도 풀벌레노래도 멧새노래도 잊게 마련입니다. 불빛이 아닌 별빛이 반짝이는 보금자리를 누린다면, 마음을 느긋이 다독이며 하루를 헤아릴 만해요. 밝은 낮에 풀빛을 알아보고, 캄캄한 밤에 별자리를 짚습니다. 흰종이에 밑그림을 새기고서 천천히 가위질을 합니다. 길게 사리는 종이에 별이며 꽃을 그려 넣어서 가운데에 실을 잇고 높은 데에 매답니다. 슬슬 춤추는 흔들개비(모빌)입니다. 뭔가 무섭다면 덜덜 떠는 마음을 살살 눌러 봐요. 차근차근 가다듬으면 무서움 따위는 이내 걷힙니다. 어쩐지 두렵다면 다리가 후들거릴 적에 이 두려움을 쳐내 볼까요. 어떻게 쳐내느냐고요? 다그쳐서는 못 쳐내요. 부드러이 삼가면서 마음빛을 바라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숫제 이리 보거나 저리 보아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짓을 느끼기도 합니다. 숫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몽땅 어이없다면 아무리 애써 보아도 덧없습니다. 어째 이렇게 생각이 없이 살아가느냐 싶은데, 제아무리 이름이 높다 한들 터럭만큼도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죄다 썩거나 문드러지는 굴레나 틀이지 싶습니다. 제딴에는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겉으로는 반짝이는 듯싶고, 허울만큼은 힘차 보일 수 있지요. 다만 사랑은 저절로 샘솟는 빛일 뿐입니다. 억지로 일어나지 않는 사랑이요, 암만 밀어붙여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어떠한 티끌도 없이, 조금도 군더더기가 없이, 모두 맑고 밝게 꿈꾸는 숨결로 하루를 그릴 적에, 비로소 서로서로 돌보면서 상냥하게 사랑이 피어납니다. 철마다 다 다르게 돋는 들풀을 헤아려 봐요. 봄에 돋고 여름에 나고 가을에 자라는 숱한 들풀에 서린 빛을 찬찬히 봐요. 언제 줄기가 오르고 잎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 좀 생각합시다 33 자는 게 취미 그림책을 읽다가 “그러고 보니 사자가 낮잠 자는 게 취미라고 농담했었지”라는 글월을 보았어요.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 주다가 멈칫합니다. 그대로 읽는들 못 알아듣겠네 싶어, “그러고 보니 사자가 낮잠을 즐긴다고 웃기는 말을 했지”로 고쳐서 읽어 줍니다. “그러고 보니 사자가 낮잠을 좋아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지”로도 고쳐 봅니다. “낮잠 자는 게 취미라고 농담했었지”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쉽게 쓸 뿐입니다. 그러나 그림책에 이런 글월을 넣어야 했을는지 생각해 봐야지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말씨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노릇이지 싶어요. 아이들은 그림책에서 알뜰한 줄거리랑 사랑스러운 이야기뿐 아니라 즐거운 말을 익히거든요. 어떻게 말할 적에 즐거울까요? 낱말을 어떻게 가려서 쓸 적에 우리 마음을 제대로 담아낼까요? 우리는 말을 어느 만큼 가다듬을 수 있을까요? 흔히 쓰는 말 한 마디에…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옛빛 하던 대로 할 수 있고, 되풀이할 수 있고, 예전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하나씩 새롭게 지으면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옛빛을 살려도 아름답고, 오늘빛을 일구어도 아름답습니다. 되살리는 맛이 있고, 오래빛에서 말미암은 숨결을 북돋우는 멋이 있습니다. 오래되기 때문에 오늘하고 안 맞을 까닭이 없어요. 모든 새로운 길은 먼먼 옛날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옛모습이 든든히 뿌리를 뻗어서 이 땅에 풀꽃이 물결처럼 너울거리기에 새모습이 하나씩 일어나면서 또다시 맑게 바람이 불고 싱그럽게 비가 오고 밝게 햇빛이 납니다. 지나간 날은 돌아오지 않아요. 예스러운 일을 굳이 돌려야 하지는 않지요. 예나 이제나 누구나 손으로 가꾸었어요. 남 손을 빌리기보다 내 손으로 하나씩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나요? 무엇을 듣고 싶은가요? 오늘 깨어난 매미는 지난 일곱 해를 땅에서 곱게 꿈을 그리면서 이웃 풀벌레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었어요. 오늘 춤추는 나비는 애벌레란 몸으로…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뜯다 터무니없이 말하면서 이웃을 깎는 이가 있습니다. 이이는 왜 이러나 하고 가만히 보면, 어느 이웃이 이이한테 잘 보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이가 마음에 들도록 굴지 않으니 이웃을 볶거나 밟습니다. 겨레 사이에도 뜯거나 깎는 일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지난날 독일뿐 아니라,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매한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옆나라를 얕보거나 깔본 적이 있고, 옆나라도 우리나라를 밉보거나 깎은 적이 있어요. 손가락질은 어느 한 쪽에서만 하지 않아요. 이쪽도 비꼬고 저쪽도 비웃지요. 서로서로 들볶는 짓을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이 못살게 구는 짓을 멈출 수 있을까요? 둘 다 네가 먼저 해야 한다고 다그치는데, 이렇게 마음을 억누르기만 해서는 스스로 괴롭히는 짓으로 맴돌아요. 뜯고 할퀴는 모든 사람이 안쓰럽습니다. 눈물이 흘러요. 이제라도 고요히 곱씹으면서 밟음질도 볶음짓도 끝내기를 바라요. 남도 나도 누르지 말고, 슬픔을 거두고, 아픔을 달래고,…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잿바치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할 적에 한자말 ‘회색’을 쓰는데, 우리말로는 ‘잿빛’입니다. 한자에 익숙하게 살며 중국을 섬기던 옛 글바치를 비롯해, 총칼로 쳐들어온 옆나라가 퍼뜨린 일본 한자말에 길든 채 앞잡이 노릇을 하던 글쟁이에, 우두머리가 시키는 대로 꼭둑각시 노릇을 한 숱한 글꾼은, 아무래도 잿바치였구나 싶어요. 잿빛놈이요, 잿사람이요, 잿놈이지요. 둘 사이에서 간을 보기에 샛놈이자 샛잡이라고 할 만합니다. 삶이 아닌 눈치를 보니 눈치쟁이에 눈치꾼이지요. 눈치코치에 바빠 살림하고 등지니 약빠리에 약삭빠리입니다. 틈새를 파고들어 돈·이름·이름을 거머쥐거나 떡고물을 얻을 마음이니 틈새잡이에 틈새놈입니다. 제멋대로 굴기에 나쁘지 않아요. 저만 알기에 바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부터’ 스스로 알아차려야 이웃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아기랑 어린이는 늘 “제멋에 겹”기에 눈이 맑고 마음이 밝아요. 나사랑을 하는 마음이 어린이 마음입니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 좀 생각합시다 32 다솜 ‘다솜’이라는 이름을 어버이한테서 받은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1970년대부터 ‘다솜’이라는 이름을 아이한테 붙이는 분이 나타났지 싶고, 1950∼1960년대에도 이 말을 아이한테 붙였을 수 있고, 더 먼 옛날에도 즐거이 썼을 수 있어요. 2000년에도 2010년에도 2020년에도 국립국어원 낱말책에는 ‘다솜’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갈 듯싶습니다. 국립국어원 일꾼은 ‘다솜’을 구태여 낱말책에 올려야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낱말을 매우 즐거우면서 기쁘게 써요. 생각해 보셔요. 아이한테 붙이는 이름으로 ‘다솜’을 쓴다면,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아이한테 ‘사랑’이란 이름을 붙이는 어버이도 많지요. ‘다솜·사랑’, 두 낱말은 한 뜻입니다. ‘다솜’은 사랑을 가리키는 옛말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시 헤아려 보기를 바라요. 참말로 ‘다솜’이 옛말일까요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포근틀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아울러 ‘어버이’라 하는데, 두 사람 가운데 한쪽만 가리키기도 합니다. 둘이 아닌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본다면 따로 외돌봄이라 할 만하고, 외엄마나 외아빠라든지, 혼엄마나 혼아빠라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굳이 혼돌봄이라 할 까닭은 없습니다. 한어버이도 어버이입니다. 아이들은 하나이든 둘이든 늘 따뜻하게 감싸는 보금자리를 누립니다. 푹신한 자리는 꼭 두 사람이어야 이루지 않아요. 나이나 돈이나 힘이 더 있어야 아늑한 자리를 일구지 않습니다. 오롯이 사랑이라는 마음이기에 외어머니도 외아버지도 살림집을 즐거이 건사합니다. 옹글게 사랑이라는 눈빛이기에 모든 어버이는 아이하고 새롭게 살림을 지으면서 오늘을 맞이해요.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힘들거나 어머니가 아프면 포근틀에 두기도 합니다. 사람도 병아리도 작은 새도 씨앗도 풀싹이며 꽃망울도 모두 매한가지예요. 따사로우면서 부드럽고 싱그러이 어루만지는 숨결이 흐를 적에 튼튼히 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