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넋 곁말 78 포근뜰 남녘에서는 ‘뜰’만 맞춤길에 맞다고 여기고, 북녘에서는 ‘뜨락’만 맞춤길에 맞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뜰·뜨락’을 나란히 우리말로 사랑하면서 돌볼 적에 아름다우리라 생각합니다. 집 곁에 가볍게 ‘뜸(틈)’을 두어 풀꽃나무를 가꾸는 자리가 ‘뜰·뜨락’이에요. 처음은 수수하게 뜰이거나 뜨락입니다. 어느새 꽃뜰·꽃뜨락으로 피어납니다. 이윽고 들꽃뜰·뜰꽃뜨락으로 자라나더니, 바야흐로 풀꽃뜰·풀꽃뜨락을 이룹니다. 누구나 푸른뜰을 누릴 적에 삶이 빛날 테지요. 저마다 푸른뜨락에서 햇볕을 머금고 바람을 마시고 빗방울하고 춤출 적에 하루가 신날 테고요. 우리 삶터가 포근뜰이라면 서로 아끼는 눈빛이 짙다는 뜻입니다. 우리 터전이 포근뜨락이라면 스스로 사랑하면서 부드러이 어울린다는 소리입니다. 풀씨는 흙 한 줌이면 푸릇푸릇 깃들어요. 꽃씨도 흙 한 줌이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꽃 말꽃삶 18 나의 내 내자 우리말은 ‘나·너’입니다. ‘나·너’는 저마다 ‘ㅣ’가 붙어서 ‘내·너’로 씁니다. “나는 너를 봐”나 “내가 너를 봐”처럼 쓰고, “네 마음은 오늘 하늘빛이야”처럼 쓰지요. 그리고 ‘저·제’를 씁니다. “저로서는 어렵습니다”나 “제가 맡을게요”처럼 쓰지요. my 私の 나의 어느새 참으로 많은 분들이 ‘나의(나 + 의)’ 같은 말씨를 뜬금없이 씁니다. 이 말씨는 오롯이 ‘私の’라는 일본말을 옮겼다고 할 만합니다. 일본사람은 영어 ‘my’를 ‘私の’로 옮기더군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영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교사가 영어를 알리고 가르쳤습니다. 이들 선교사는 ‘한영사전’까지 엮었지요. 이다음으로는 일본이 총칼로 쳐들어와서 억누르던 무렵 확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손으로 엮은 책으로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가져온 책으로 배웠거나, ‘일본사람이 영어를 배우려고 일본사람 스스로 엮은 책’을 받아들여서 배웠습니다. 일본사람은 웬만한 데마다 ‘の’를 붙여서 풀이했고, 일본책으로 영어를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말씨 ‘の’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 얄궂은 말씨 ㄱ. 글들 대부분 50명 정도 인원에 의해 올려진 대부분(大部分) : 1. 절반이 훨씬 넘어 전체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수효나 분량 2. = 대개 오십(五十) : 1. 십의 다섯 배가 되는 수 2. 그 수량이 쉰임을 나타내는 말 3. 그 순서가 오십 번째임을 나타내는 말 명(名) : 사람을 세는 단위 정도(程度) : 1. 사물의 성질이나 가치를 양부(良否), 우열 따위에서 본 분량이나 수준 2. 알맞은 한도 3. 그만큼가량의 분량 인원(人員) :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수효 의하다(依-) :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다 종일(終日) :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동안 = 온종일 계속(繼續) : 1. 끊이지 않고 이어 나감 2. 끊어졌던 행위나 상태를 다시 이어 나감 3. 끊이지 않고 잇따라 하루 내내 이었다면, 줄곧 했다는 뜻입니다. “쉰 사람”이라고 밝히면 몇이 있는가를 이미 말했으니, “50명 정도 되는 인원”은 겹말입니다. ‘-에 의하다’나 ‘-지다’ 같은 입음꼴은 우리말씨가 아닙니다. 영어를 옮기다가 얄궂게 불거지다가 퍼진 말씨예요. 쉰 사람쯤이 하루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 얄궂은 말씨 ㄱ. 빠른 성장 가능 지구(地球) : [천문] 태양에서 셋째로 가까운 행성 ≒ 대괴·혼원구 성장(成長) : 1.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가능(可能) :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음 우리말을 마치 영어처럼 쓰려 하니 “빠른 성장”처럼 ㄴ을 받쳐서 뒷말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씨는 “빠르게 성장”입니다. 보기글은 ‘성장 + 가능’처럼 한자말을 곧장 이으려고 하느라 토씨를 얄궂게 붙였어요. 한자말 ‘가능’은 “할 수 있다”나 “될 수 있다”를 뜻합니다만, 이 글자락에서는 “빠르게 자랐습니다”나 “빠르게 컸습니다”로 손질할 만합니다. ㅅㄴㄹ 지구는 빠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 푸른별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 푸른별은 휙휙 컸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채식과 동물권 이야기》(이유미, 철수와영희, 2023) 21쪽 ㄴ. 음식의 선택 많은 문제 음식(飮食) : 1.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의 물건 ≒ 식선(食膳)·찬선(饌膳) 2. = 음식물 선택(選擇) : 1.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 초택(抄擇)·취택·택취(擇取) 문제(問題) : 1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 얄궂은 말씨 ㄱ. 속물근성 것 나의 利己 속물근성(俗物根性) : 금전이나 명예를 제일로 치고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생각이나 성질 이기(利己) :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함 저 혼자 좋기를 바라기에 ‘이기·이기심·이기주의’라고도 하지만, 저 혼자만 쳐다보거나 살피기에 “저만 알다”처럼 수수하게 나타낼 만합니다. 보기글은 “나의 (利己)”를 끝에 넣지만, 이런 글짜임은 옮김말씨예요. ‘나의’를 ‘나는’으로 고쳐서 맨앞으로 돌린 다음, “나는 그들을 멋대로”나 “나는 그들을 함부로”쯤으로 고쳐쓸 만합니다. 돈만 아는 이라면 ‘돈벌레’라 일컬으면 되어요. 또는 ‘바보’나 ‘멍청이’라 하면 되어요. ㅅㄴㄹ 그들을 속물근성으로 몰아부친 것은 나의 이기(利己)이다 → 나는 그들을 멋대로 돈벌레로 몰아붙였다 → 나는 그들을 함부로 바보라고 몰아붙였다 《기형도 산문집》(기형도, 살림, 1990) 64쪽 ㄴ. 음성언어 통역 위해 수화 사용 음성언어(音聲言語) : [언어]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 ≒ 구어·입말 통역(通譯) :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 사이에서 뜻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 줌. 또는 그런 일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글손질 다듬읽기 16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민나리·김주연·최훈진 오월의봄 2023.5.8.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민나리·김주연·최훈진, 오월의봄, 2023)를 읽으며 내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씨(성별)를 굳이 갈라야 하지 않거든요. 태어난 몸이 암이건 수이건 대수롭지 않습니다. 키가 크건 작건, 둘레에서 이쁘다고 여기건 못생겼다고 여기건, 따질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무언가 스스로 겪고 배워서 새롭게 사랑을 지으려고 얻은 ‘몸’입니다. 그러나 웃사내(남성가부장권력)는 적잖은 나날에 걸쳐 ‘바보나라’로 굴리고 길들이면서 가시내뿐 아니라 사내 스스로도 괴롭히고 죽였어요. ‘사내라서 힘꾼(권력자)’이지 않습니다. ‘힘꾼이 힘꾼’일 뿐입니다. 종은 가시내이건 사내이건 똑같이 ‘종(노예)’이요, 힘꾼도 사내이건 가시내이건 힘꾼입니다. 예전에는 뒷간을 안 갈랐는데, 이제 갓벗(여남)을 갈라요. 이 책은 ‘호르몬제’가 ‘백신’ 못잖게 어린이·푸름이·어른 몸을 망가뜨리는 줄 하나도 안 다룹니다. ‘돈·이름·힘’을 거머쥔 무리가 사람들을 가르면서 우리 스스로 싸우도록 붙이고 북돋우는데, 이 속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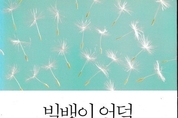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글손질 다듬읽기 15 《빌뱅이 언덕》 권정생 창비 2012.5.25. 《빌뱅이 언덕》(권정생, 창비, 2012)에 실린 글은 이미 다른 책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권정생 님 모든 책을 샅샅이 챙겨서 읽었기에 굳이 이런 글모음이 없어도 되리라 여기지만, 판이 끊어진 책에 깃든 글을 추려서 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권정생 님 글을 왜 읽을까요? 우리 스스로 ‘허깨비 서울살림을 벗으려’고 읽나요? ‘좋은글 읽어치우기(소비)’일 뿐인가요? 사람들이 자꾸 잊는데, 이오덕 님이나 권정생 님은 ‘서울 아닌 시골’에서, 더구나 ‘두멧시골’에서 조용히 살림을 짓고, 해바람비랑 풀꽃나무를 벗삼아 하루를 노래했습니다. 두 분은 처음부터 ‘시골에서 살며 글을 쓸 뜻’은 아니었으나, 두 분 모두 여린몸인 터라 시골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시골에서 숨을 거두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글을 쓰든 안 쓰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려면 숲을 품는 보금자리를 일굴 노릇’인 줄 몸소 느꼈고, 이 삶빛을 이웃하고 글로 나누려는 길이었습니다. ㅅㄴㄹ 어릴 때 우리 집은 어둡고 음산했다 → 어릴 때 우리 집은 어두웠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맨드리 다 자란 나무를 옮겨심으려면 삽을 씁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흙을 살살 걷어내고서 씨앗 한 톨을 놓은 다음 새삼스레 손가락으로 흙을 살살 덮으면 끝입니다. 다람쥐하고 새가 나무를 심는 길을 살피면 숲을 어떻게 가꿀 만한지 배울 수 있어요. 이미 이룬 숲에서 나무를 파서 옮겨도 안 나쁘지만, 덤일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새롭게 가꿀 적에 우리 손으로 지을 만합니다. 밭수레로 땅을 갈아엎으면 손쉽게 심거나 돌보아서 거둘 수 있다지요. 그렇지만 호미 한 자루를 쥐고서 천천히 갈거나 훑을 줄 안다면, 늘 노래하며 살림을 찬찬히 북돋웁니다. 생각해 봐요. 커다란 논밭수레가 움직일 적에는 말소리조차 묻혀요. 낫을 버리고서 벼베개(콤바인)를 쓰면 아무도 말을 못 나눠요. 맨드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만든것을 쓰는 뜻도 찾아볼 노릇입니다. 그리고 누가 짜놓은 틀을 고스란히 가져다 쓰기보다는 우리 두 손을 사랑스레 움직이면서 차근차근 엮어 나가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족치다 고약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괘씸한 놈을 갈라야 할까요. 끔찍한 짓을 어떤 눈으로 달래야 할까요. 몹쓸 나라라면 우리 스스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괴롭히는 녀석은 어떻게 마주해야 하나요. 제아무리 까드락거리더라도 쳐다볼 일이 없습니다. 나쁜놈은 스스로 옳지 않은 줄 알기도 하지만, 스스로 얼마나 썩었는지 못 볼 수 있습니다. 부라퀴는 발톱을 세운 채 제멋대로 굴 텐데, 스스로 엄니를 번쩍이면서 함부로 구는 줄 모를 수 있어요. 호로놈을 족치면 볼꼴사나운 짓이 사라질까요? 망나니를 마구 두들겨패면 답치기를 걷어낼 만한가요? 막짓을 일삼는 이는 어깨띠를 하고서 우쭐거립니다. 이들은 사람을 발밑에 놓고서 웃짓을 하는데, 앞뒤를 못 가릴 만큼 마음이 텅 비게 마련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려는 찌꺼기는 잔뜩 냄새를 풍깁니다. 지저분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쓰레기는 해바람비 손길을 받으면서 자잘하고 추레한 기운을 모두 내려놓아요. 파리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더듬이 발이 빠른 사람하고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하고 안 더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럴 뿐입니다. 글씨가 반듯한 사람하고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솜씨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거친말하고 상냥말은 그저 다르다고 보아야 할까요? 높임말하고 낮춤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거름이 될 똥오줌이 아닌 똥말에는 어떤 마음이 흐를까요? 쓰레말이나 자잘말은 서로 이바지할 만할까요? 하나하나 본다면, 깎음말은 남을 못 깎아요. 스스로 깎을 뿐입니다. 막말은 남을 못 뜯지요. 스스로 물어뜯는 막말입니다. 볶아대든 구워삶든 스스로 사랑이 사라지는 헛말입니다. 허튼말을 일삼는 사람은 스스로 다치고 피나면서 쓰러집니다. 거침없이 흐르는 물처럼 말을 한다지만, 사랑이 없이 늘어놓기만 할 적에는 마음으로 안 와닿아요. 더듬더듬 꼬이거나 씹히는 말이라 하지만, 사랑을 담아 펼 적에는 마음으로 스며요. 풀벌레한테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