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 좀 생각합시다 30 주먹질 거칠게 일삼는 짓을 한자말로 ‘폭력’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총칼(전쟁무기)을 앞세워 쳐들어가는 짓은 ‘국가폭력’이라 하고, 배움터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짓은 ‘학교폭력’이라 하며, 싫다는 사람을 추근거리거나 마구 다루어 몸을 괴롭히는 짓은 ‘성폭력’이라 하고, 말로 못살게 굴 적에 ‘언어폭력’이라 합니다. ‘폭력’은 거칠거나 사나운 짓을 가리킵니다. 우리 터전이 아름답지 못한 길로 흐른다면 자꾸 새로운 폭력이 불거질 테지요. 그렇다면 이 슬프도록 안타까운 거칠거나 사나운 짓을 예전에는 어떤 말로 가리켰을까요?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가리킬 수 있을까요? 먼저 여느 폭력이란 ‘주먹질·발길질’이곤 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다면 ‘주먹발질·발주먹질’이겠지요. 나라가 일삼는 주먹질이라면 ‘막 + 짓·질’ 얼거리로 ‘나라막짓·나라막질’이라 해 볼 수 있습니다. 배움터에서는 ‘또래주먹질·또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적' 없애야 말 된다 : 합리적 합리적 과정 → 올바른 길 / 알맞은 흐름 / 바른길 / 곧은길 합리적 경영 → 바르게 꾸리기 / 올바르게 꾸리기 합리적인 선택 → 올바로 고름 / 알맞게 뽑음 일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였다 → 일을 알맞게 잘 하였다 합리적 사고 → 알맞은 생각 / 옳은 생각 / 슬기로운 생각 ‘합리적(合理的)’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을 뜻한다고 합니다. ‘합당(合當)하다’는 “꼭 알맞다”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 ‘합리/합리적 = 합당한 = 알맞은’인 셈입니다. 우리말로 ‘알맞다’를 쓰면 되고, ‘낫다·좋다’나 ‘가볍다’를 쓰면 되며, ‘슬기롭다·마땅하다’나 ‘옳다·바르다·똑바르다·올바르다’나 ‘그대로·찬찬히·가만히·차근차근·꾸밈없이’을 쓸 만합니다. 때로는 ‘알뜰하다·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ㄱ 겹말 손질 : 하다·선언, 삶·생활, 와닿다·거리감 ‘나는 생활인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것은 비교적 거리감이 없었다 → ‘나는 살림꾼이다’라고 할 때에는 제법 와닿았다 → ‘나는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꽤 와닿았다 생활(生活) : 1.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 2. 생계나 살림을 꾸려 나감 3. 조직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 4.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감. 또는 그런 상태 선언(宣言) : 1. 널리 펴서 말함 2. 국가나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함 3. 어떤 회의의 진행에 한계를 두기 위하여 말 거리감(距離感) : 1. 어떤 대상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느낌 2.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간격이 있다는 느낌.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13. 얕바다 바다가 얕으니 ‘얕바다’이다. 바다가 깊으니 ‘깊바다’이다. 멀리 있는 바다이니 ‘먼바다’이고, 뭍은 하나도 안 보이도록 나간 바다이니 ‘난바다’이다. 뭍하고 가까이 있는 바다라면 ‘곁바다’이고, 짜디짠 소금으로 가득한 바다는 ‘소금바다’이다. 얕바다 : 얕은 바다. 뭍하고 가까이 있는 바다. 뭍하고 가까우면서 얕은 바다. (= 얕은바다·곁바다. ← 천해淺海, 연해沿海) 곁바다 : 곁에 있는 바다. 뭍하고 가까운 바다. 뭍하고 가깝기에 물이 얕을 수 있지만, 때로는 뭍하고 가까우면서도 꽤 깊을 수 있다. (= 얕바다·얕은바다. ← 연해沿海, 천해淺海) 14. 팔매금 돌을 던지는 팔짓을 ‘돌팔매’라 한다. ‘팔매’는 첫째, “작은 돌을 멀리 힘껏 던지는 일. 팔을 휘둘러서 멀리 힘껏 던지는 돌.”을 가리킨다. 돌을 던지면 하늘로 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진다. 둥그스름하게 솟다가 내려가는 길은 물결을 닮는다. 팔매가 흐르는 듯이 금을 그어서 잇는다. 물결이 흐르는 듯이 줄을 쳐서 잇는다. 팔매금 (팔매 + 금) : 팔매를 이루는 금. 흐르거나 바뀌거나 움직이는 결·모습·값·셈을 알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46 손빛책 누리책집 ‘알라딘’은 “알라딘 중고서점·중고샵”이란 이름을 퍼뜨렸습니다. 이곳에서는 ‘헌책’을 팔지만 정작 ‘헌책’이란 우리말을 안 쓰고 ‘중고서점’이란 일본 한자말을 쓰고, ‘중고샵’ 같은 범벅말(잡탕언어)을 씁니다. 왜 “알라딘 헌책집·헌책가게”처럼 수수하게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하지 못 할까요? 아무래도 ‘헌옷·헌책·헌집’이란 낱말에 깃든 ‘헌(헐다·허름)’이 어떤 말밑(어원)인지 모르기 때문일 테지요. ‘허허바다(← 망망대해)’란 오랜 우리말이 있어요. 웃음소리 가운데 ‘허허’가 있고, ‘헌걸차다’란 우리말도 있습니다. ‘허’는 ‘쓴·빈·없는’뿐 아니라 ‘너른·큰·하나인’을 나타내는 밑말(어근)이기도 한데, ‘하·허’로 맞물립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하’나 ‘헌책’을 가리키는 ‘허’는 같은 말밑이요 밑말입니다. 사람 손길을 타기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45 한누리 푸른배움터를 마치고 들어간 열린배움터(대학교)는 하나부터 열까지 못마땅했습니다. 하루하루 억지로 버티면서 책집마실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꼬박꼬박 모든 이야기(강의)를 듣다가 8월부터는 도무지 못 견디겠어서 길잡이(교수)가 보는 앞에서 배움책을 소리나게 덮고 앞자리로 나가서 “이렇게 시시하게 가르치는 말은 더 못 듣겠다!” 하고 읊고서 미닫이를 쾅 소리나게 닫고서 나갔습니다. 어디에서든 스스로 배울 뿐인데, 배움터를 옮겼기에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언제 스스로 터뜨려 박차고 일어나 마침종이(졸업장)를 벗어던지느냐일 뿐입니다. 길잡이다운 길잡이가 안 보이니, 스스로 길을 내는 이슬받이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배움책집(구내서점)하고 배움책숲(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틈틈이 책을 읽고, 새뜸나름이(신문배달부)로 일한 삯을 모아 헌책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제주도》 이즈미 세이치 김종철 옮김 여름언덕 2014.5.25. 《제주도 1935∼1965》(이즈미 세이치/김종철 옮김, 여름언덕, 2014)는 일본이웃이 우리나라 제주섬을 살핀 발자취를 서른 해를 틈을 두고서 갈무리하고서 여민 꾸러미입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 삶자취를 차곡차곡 여미는 사람이 부쩍 늘었으나, 아직도 우리 삶길보다는 이웃나라 삶길에 더 마음을 쏟는 얼개입니다. 지난날에도 우리 살림새를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손으로 품는 일이 드물었고, 오늘날에도 우리 살림빛을 우리 숨결로 읽고 헤아리면서 우리 넋으로 다독이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늘어납니다. 이웃나라에서 먼저 세우거나 마련한 틀에 맞추면, 이모저모 읽거나 헤아리기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틀(이론·학문)은 이웃나라 삶·살림·사람을 살펴서 세운 틀이에요. 모든 나라는 다르기에 모든 나라는 저마다 저희 틀을 차근차근 세울 노릇이에요. 지난날에는 총칼을 앞세운 무리가 억지로 짓밟았기에 ‘우리 눈·넋·숨·말글’을 스스로 뒷전으로 내몰았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눈·넋·숨·말글’을 뜬금없이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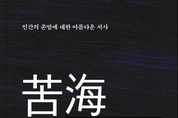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고해정토苦海淨土, 나의 미나마타병》 이시무레 미치코 김경연 옮김 달팽이출판 2022.1.18. 《고해정토, 나의 미나마타병》(이시무레 미치코/김경연 옮김, 달팽이출판, 2022)은 책이름 그대로 미나마타 죽음앓이를 들려줍니다. ‘고해(苦海)’하고 ‘정토(淨土)’가 나란히 도사리는 마을로 내몬 죽음앓이(환경병)일 텐데, 고기잡이하고 논밭짓기로 살아오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람·바다·땅·집·삶·꿈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이때에 나라(정부)하고 고을(미나마타 벼슬아치)은 뒷짐일 뿐이었고, 여러 글바치가 이 민낯을 다루었으나 숱한 글바치는 먼나라 일로 여겼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죽음앓이는 나몰라라이지요. 그런데 나라 탓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길그림을 보면 미나마타는 매우 포근하고 아름다우며 고즈넉한 바닷마을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또 미나마타시라는 벼슬아치는, 포근하고 아름다우며 고즈넉한 바닷마을에 끔찍한 죽음터를 때려박았으며, 오늘날에도 이 죽음터는 고스란합니다. 빛(전기)은 시골이나 서울이나 다 씁니다만, 빛을 많이 쓰는 곳은 서울인데, 정작 서울에는 빛터(발전소)를 크게 세우지 않습니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9. 힘싸움 힘은 힘으로 막힌다. 힘으로 싸우려 들어서 이기거나 꺾으면, 다른 힘이 몰려들어 눌리거나 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둘레에서는 ‘힘겨룸’에 ‘힘다툼’에 ‘힘싸움’이 판친다. 사랑이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드니 겨루거나 다투거나 싸운다. 사랑은 모두 아우르고 녹인다. ‘사랑싸움’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틀린 말씨이다. ‘짝싸움·짝꿍싸움’은 있지만, 사랑은 싸움을 녹여내는 길이니 ‘사랑싸움’이란 있을 수 없다. 힘싸움 (힘 + 싸우다 + ㅁ) : 힘을 내세우거나 앞세우거나 보여주면서 싸우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밀어붙이기. (= 힘다툼. ← 기싸움, 백병전, 실력행사, 무력행사, 파워게임, 패권 경쟁, 경쟁) 10. 퀭하다 퀴퀴할 만큼이라면 가까이하기 어렵도록 고약하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다. 케케묵다(켸켸묵다)는 그야말로 오래되고 낡아서 이제는 썩어 흙으로 돌아갈 때라는 뜻이다. 흙으로 돌아가면 퀴퀴한 냄새도 케케묵은 빛도 사라지면서 까무잡잡한 숲흙으로 바뀐다. 걱정이 가득하고 잠을 못 이루면 눈밑이 시커멓게 ‘퀭한’ 눈망울이 된다. ‘퀭눈’이다. 퀭하다 : 1. 눈이 쑥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겨냥 길을 걸을 적에는 앞을 봅니다. 옆이나 뒤를 쳐다보다가는 넘어지거나 부딪히겠지요. 어느 곳으로 나아가든 가는길을 살핍니다. 남을 앞세우거나 내세우기보다는 스스로 씩씩하게 갑니다. 이름나거나 훌륭한 남이 앞에서 봐주면 한결 나을는지 모르나, 낯선 곳에 서더라도 스스로 길그림을 어림하면서 차근차근 걸어요. 눈치를 안 봅니다. 꿈그림을 봅니다. 두리번거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으려는 할거리를 생각합니다. 어정쩡하게 딴청을 하다가는 과녁을 놓쳐요. 갈곳을 또렷이 헤아리면서 겨냥해야지요. 무엇을 꼭 이루겠다고 노리지 않아요. 한 걸음씩 디디려는 바람입니다. 꿈을 사뿐히 얹은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서 갑니다. 숨을 쉬건 밥을 먹건 잠이 들건 언제나 우리 스스로 해요. 작거나 크거나 괴롭거나 반가운 일도 스스로 맞이합니다. 삶길이란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입니다. 멋스러운 삶이 아니어도 되어요. 뜻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면 넉넉합니다. 곁에 다짐말 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