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의' 안 써야 우리 말이 깨끗하다 -과의 대통령과의 대화 → 대통령과 얘기하기 자연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 숲과 만나야 한다 ‘-과 + -의’ 얼개에서는 ‘-의’를 털면 됩니다. 이 일본 말씨는 으레 ‘-과의 + 이름씨꼴’로 흐르는데, 이름씨꼴을 풀어낼 적에 우리 말씨가 돼요. “동생과의 다툼 때문에”는 “동생과 다퉈서”로,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해”는 “그분과 만나서”로 손볼 만하지요. ㅅㄴㄹ 나는 한 번도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 → 끓어오를 적에는 싸워서 여태 이기지 못했다 → 뭐가 하고플 적에는 늘 하고야 말았다 →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늘 해야만 했다 《영화여 침을 뱉어라》(이효인, 영화언어, 1995) 3쪽 필자가 본격적으로 사진계에 발을 딛게 된 계기는 노산 이은상 선생님과의 만남이었다 → 내
[ 배달겨레소리 한실 손보아 옮김 ] 이 글은 이오덕님 <우리글 바로쓰기> 1,2,3 과 <우리월(문장) 쓰기>를 간추려, 빗방울(김수업)님이 하신 말씀을 한실이 배달말 아닌 말을 되도록 배달말로 바꾸어 고쳐 놓았습니다. 본디 글은 묶음표 안에 묶어 놓았어요. (이오덕님이 우리글 바로쓰기를 내놓은 지 서른 해가 되었고, 빗방울님이 이 말씀을 한 지도 열다섯 해가 지났어도 우리말을 왜 살려 써야 하고 어떻게 살려낼지를 아주 잘 간추린 말씀이어서 세 차례에 나누어 싣습니다.) 첫(제1회) 이오덕 배움(공부) 마당 : 김수업 (선생)님 알맹이 말씀(주제 발표) 때: 2006. 8. 24. 10:00-16:00 이오덕 우리 말 생각(사상) -《우리글 바로쓰기》와 《우리 월(문장) 쓰기》를 다시 읽으며- 1. 들머리에서 보내주신 글 이름(제목)에 걸맞은 이야기를 할 만한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짬(시간)이 모자란 탓도 있지만 저가 게을러서 이오덕님(선생의) 삶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남긴 글을 두루 찾아 알뜰히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훌륭한 분들이 나서서 그분(의)삶과 글을 샅샅이 살펴 ‘이오덕 우리 말 생각(사상)’을 오롯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우리말을 죽이는 외마디 한자말 -량 量 가사량 → 일감 / 일거리 / 집안일 노동량 → 일 / 일거리 작업량 → 일 / 일감 ‘-량(量)’은 “분량이나 수량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는데, 낱말책에 나오는 보기 ‘가사량·작업량·노동량’은 그저 ‘일’로 손질할 만합니다. 이때에는 군더더기예요. 다른 자리를 보아도 굳이 ‘부피’로 손질하기보다는 ‘-량’을 아예 털어내는 길이 한결 낫습니다. ‘수확량’이라면 ‘거두다’란 낱말로, ‘식사량’이라면 ‘밥·먹다’란 낱말로, ‘활동량’이라면 ‘움직이다’란 낱말로, ‘일조량’이라면 ‘해·햇볕’으로 손질하면 넉넉하지요. 일조량은 적지만, 그 대신 방음은 완벽해서 → 햇볕은 적지만, 그만큼 소리는 잘 막아서 → 해는 조금 들지만, 소리만큼은 잘 가려서 《피아노의 숲 8》(이시키 마코토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꽃”은 우리말꽃(우리말사전)을 새로 쓰는 ‘숲노래’가 묻고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을 둘러싼 궁금한 대목을 물어보면, 왜 그러한가라든지 어떻게 다루면 알맞을까 하고 이야기를 엮어서 들려줍니다. 우리말을 어떻게 써야 즐거울는지, 우리말을 어떻게 익히면 새로울는지, 우리말을 어떻게 바라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싱그러이 피어날는지 물어보아 주셔요. 숲노래 우리말꽃 : ‘샘님’하고 ‘선생님’ 사이 [물어봅니다] 저기, 이런 걸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선생님’들을 ‘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쓰는 은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선생님들을 ‘샘’이나 ‘쌤’이나 ‘샘님’이나 ‘쌤님’이라 부르는 말씨는 나쁜 말이 아닌가요? 이런 말은 안 써야겠지요? 그렇지만 또 묻고 싶은데요, 이런 말은 나쁜 은어이니 안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이 말이 저희 입에서는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해결책 좀 알려주셔요. [이야기합니다] 음, 무슨 말부터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봐야겠네요. 제가 어린배움터하고 푸른배움터(초·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82∼1993년 사이를 떠올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말. 서울스럽다 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서울스럽습니다. 왜 서울답게 꾸미려 하나 아리송하지만, 서울처럼 보일 적에 멋스럽거나 반짝이거나 말쑥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테지요. 시골스러우면 수수하거나 투박할 뿐 아니라 멋이 없고, 빛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구나 싶어요. 시골사람으로 살며 시골빛하고 서울빛을 나란히 놓고 보면, 시골이더라도 깊이 깃든 곳이 아니라면 밤별을 못 누립니다. 서울뿐 아니라 여느 큰고장에서도 별빛이 흐르지 않아요. 어쩌면 이러한 터전은 겉멋이나 치레이지 않을까요? 낮에 구름하고 햇빛이 안 흐르고, 밤에 고요하면서 흐드러지는 별잔치가 없다면, 그럴싸한 겉모습이지 싶습니다. 집에서건 마실을 가건 이야기꽃(강의)을 펴는 자리에 가건, 저는 시골차림 그대로인데, 흙내음이 묻은 고무신을 그냥 꿰고, 새벽에 이슬을 훑던 대로 다닙니다. 조금 바보스럽거나 살짝 엉터리일는지 모르나, 굳이 모든 사람이 서울스러워야 하지 않겠지요. 시골사람이 얼마 없는 요즘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에서 짓는 글살림”은 숲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골자락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을 짓는 길에 새롭게 맞아들여 누리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숲에서 짓는 글살림 2. 가을에 기쁘게 짓는 말 예전에는 누구나 스스로 말을 지어서 썼습니다. ‘예전’이라고 첫머리에 말씀합니다만, 이 예전은 ‘새마을’ 물결이 생기기 앞서요, 배움터라는 곳이 없던 무렵이며, 찻길이나 씽씽이(자동차)가 시골 구석까지 드나들지 않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구나 스스로 말을 지어서 쓰던 때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누구나 스스로 삶과 살림을 짓던 때입니다. 돈으로 밥이나 옷이나 집을 사지 않던 때에는, 참말로 사람들 누구나 제 말을 스스로 지어서 썼어요. 남한테서 배우지 않고 어버이와 동무와 언니와 이웃한테서 말을 물려받던 때에는 고장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 다른 말을 저마다 즐겁고 고우며 정갈하게 썼어요. 오늘날 시골에서는 시골말이 차츰 밀리거나 사라집니다. 오늘도 즐겁고 어여쁘게 고장말을 쓰는 할매와 할배가 많습니다만, 할매와 할배가 아닌 마흔 줄이나 쉰 줄만 되어도 고장말을 드물게 쓰고, 스무 살이나 서른 살 즈음이면 높낮이를 빼고는 고장말이라 하기…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모색하며 찾아내는 모색해 가면서 찾아내는 → 찾아 가면서 → 찾아보면서 → 찾는 동안 모색(摸索)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찾는다’고 할 적에 한자말로 ‘모색’이라고도 하기에, “모색해 가면서 찾아내는”은 겹말입니다. “찾아 가면서”라고만 하면 됩니다. 말씨를 바꾸어 “찾아보면서”나 “찾으면서”나 “찾는 동안”이라 해도 되고요. 모색해 가면서 찾아내는 답도 있을 거야. 팀은 유메지가 이끌어 가렴 → 찾아 가면서 알아내는 길도 있어. 모임은 유메지가 이끌어 가렴 → 찾아보면서 배우는 길도 있어. 모둠은 유메지가 이끌어 가렴 → 찾는 동안 깨닫는 길도 있어. 동아리는 유메지가 이끌어 가렴 《도쿄 셔터 걸 2》(켄이치 키리키/주원일 옮김, 미우, 2015) 164쪽 공통점이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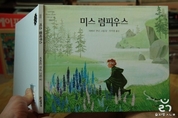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사람을 돌보는 한 마디를 읽다 《미스 럼피우스》 바버러 쿠니 글·그림 우미경 옮김 시공주니어 1996.10.10. 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글붓을 한 손에 쥡니다. 이 글붓으로 책에 적힌 글씨를 손질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글씨를 손질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 책을 못 읽거든요. 도무지 아니다 싶은 대목을 글붓으로 슥슥 그은 다음에 ‘고쳐쓸 글’을 적어 넣습니다. 우리 집 어린이하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그림책마다 글손질을 해놓습니다. 책을 펼쳐 목소리로 들려줄 적에는 그때그때 ‘눈으로 고쳐서 읽으’면 되지만, 아이 스스로 혼자 그림책을 읽고 싶을 적에는 ‘영 아닌 글씨’가 수두룩한 채 읽히고 싶지 않아요. 이를테면, “머나먼 세계로 갈 거예요”는 “머나먼 나라로 가겠어요”로 고쳐서 읽습니다. “대답해요”는 “말해요”나 “이야기해요”로 고쳐서 읽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만”이나 “그러나”로 고쳐서 읽습니다. “해낸 거예요”는 “해냈어요”로 고쳐서 읽습니다. “학교 근처에도 뿌렸어요”는 “배움터 옆에도 뿌렸어요”로 고쳐서 읽습니다. “우리 집 정원”은 “우리 집 꽃밭”으로 고쳐서 읽습니다. “허리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말. 힘으로 잘 안 된다는 생각에 힘으로 하면 그만 일그러지기 쉽습니다. 언제나 힘을 써서 움직이되 힘으로 누르거나 내세우거나 앞세운다면 외려 쉽게 망가질 만해요. 윽박지르는 말로는 타이르지 못하고 달래지도 못합니다. 오직 부드러운 말씨로 타이르거나 달랠 만합니다. 휘어잡으려 한다면 뭔가 시킬 수 있겠으나 같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값을 내세울 적에도 함께하기 어렵지요. 콧대가 높으면 둘레에서 다가서지 않아요. 마구잡이인 사람한테는 다들 멀어지겠지요. 들꽃을 봐요. 들꽃은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들풀을 봐요. 들풀은 콧대높지 않고, 잘난척하지 않아요. 들꽃을 닮은 들꽃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들풀한테서 배워 들풀사람으로 손잡으면 어떤가요? 수수하게 살아가면서 투박하게 말하지만, 이 여느 말씨야말로 생각을 살찌우는 씨앗이 되어요. 너도 풀이고 나도 풀입니다. 너도 풀꽃이고 나도 풀꽃이에요. 물결치듯 어깨동무를 하며 놀아요. 너울대듯 어깨를 겯고 나아가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사용하다, 이용하다처럼 한자말 용(用)이 우리말 ‘쓰다’를 밀어내고 다른 여러 한자와 짝을 지어 ‘―하다’ 앞에 붙어 말글살이에 자리잡았다. 이용(利用)하다 → 쓰다 사용(使用)하다 → 쓰다, 쓰게 하다 적용(適用)하다 → 맞춰 쓰다 활용(活用)하다 → 살려 쓰다 상용(常用) → 늘 씀 상용(商用) → 장사에 씀 상용차(商用車) → 장사수레 무용(無用) → 쓸데없음 유용(有用) → 쓸데있음 공용(公用) → 그위 씀, 구의씀 공용(共用) → 함께 씀 군용(軍用) → 지키는데 씀 등용(登用) → 뽑아 씀 비용(費用) → 쓸 돈 사용(私用) → 아름씀 선용(選用) → 가려 씀, 골라 씀 선용(善用) → 바르게 씀 식용(食用) → 먹을 (것) 신용(信用) → 믿고 씀, 믿음 *신용장(信用狀) → 믿음 종이 *신용거래(信用去來) → 믿고 사고 팜 실용(實用) → 참씀 악용(惡用) → 나쁘게 씀 약용(藥用) → 낫개로 씀 운용(運用) → 부려 씀 인용(引用) → 끌어 씀 작용(作用) → 지어 씀 차용(借用) → 빌려 씀 통용(通用) → 두루 씀, 널리씀 특용(特用) → 남달리 씀, 뛰어나게 씀 효용(效用) → 쓸모, 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