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곁노래 곁말 0 곁말 곁에 있는 사람은 곁사람입니다. 곁에 있으며 서로 아끼는 사이는 곁님이요 곁씨입니다. 곁에 있는 아이는 곁아이요, 곁에 있는 어른은 곁어른이에요. “곁에 있을” 적하고 “옆에 있을” 적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곁에 둘” 적하고 “옆에 둘” 적도 비슷하지만 달라요. ‘곁·옆’은 우리가 있는 자리하고 맞닿는다고 할 만하기에, 가깝다고 할 적에 쓰는 낱말인데, ‘곁’은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만나도록 흐르는 사이를 나타낸다고 할 만해요. 그렇다면 우리 곁에 어떤 말이나 글을 놓으면서 즐겁거나 아름답거나 새롭거나 사랑스럽거나 빛날까요? 우리는 저마다 어떤 곁말이나 곁글로 마음을 다스리거나 생각을 추스르면서 참하고 착하며 고운 숨빛으로 하루를 짓고 살림을 누릴까요? 곁말을 그립니다. 늘 곁에 두면서 마음을 가꾸도록 징검다리가 될 말을 헤아립니다.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우리말살이는 겨레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바탕이다 2. 왜 우리말을 살려 써야 하나? 우리 겨레 글살이를 우리글(한글)만 쓸 거냐, 한자를 섞어 쓸 거냐를 두고 쉰 해 넘게 거품 물고 다퉈 오던 일은 오늘날 온 나라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글로만 오롯이 글살이를 하게 됨으로써 헛된 실랑이를 해왔음이 드러났고, 한자를 섞어 써야 하고 그래서 한자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우기던 사람들이 온통 엉터리였음도 또한 한낮같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새뜸(신문)이든 배움책이든 한배곳책(대학교재)이든 새카만 한자가 사라지고,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살이가 온겨레 글살이에 자리잡았습니다. 우리글이 생겨난 뒤로 오늘날처럼 널리 온 백성한테 두루 쓰인 적이 일찍이 없었지요. 게다가 손말틀이 나온 뒤로는 우리글이 날개를 단 느낌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일만도 아닌 것이 겉으로 보면 우리글살이를 하니 우리말을 잘 지켜온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말은 이제까지 있어 본 적 없는, 가장 바드러운(위태로운) 자리에 놓였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놓인 작은 호롱불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글은 살아났는데, 그새 우리말은 죽어갔습니다. 우리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꽃 오늘말. 두루 달구벌에서 “마스크 쓰go”란 글자락을 새겨서 알리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분은 뭔 소리인지 쉽게 못 알아듣겠다 하고, 어느 분은 수월히 알아보며 좋다고 한답니다. 영어가 익숙한 사람은 가볍게 받아들일 테고, 어른이나 어르신이라면 두루 맞이하기 어렵겠지요. 나라(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글자락을 짓는가를 생각해야겠지요. 누구는 재미있다 하더라도 어렵거나 우리말하고 안 맞다고 나무란다면, 이처럼 수수한 목소리를 귀여겨듣고서 뭇사람한테 이바지할 새 말길을 찾으면 서로 즐거워요. 이를테면 “입가리개 하고 가고”나 “입가리개 쓰고 가고”처럼 말끝 ‘-고’를 잇달아 붙이며 노래처럼 부를 만합니다. 굳이 ‘go’를 안 보태도 돼요. 귀를 열고 눈을 뜰 적에 새길을 찾아요. 우리 살림살이를 손수 가꾸려는 눈길일 적에 들꽃사람 누구나 즐겁습니다. 사고팔것에 너무 얽매이면 오히려 장사가 어렵고, 더 멋져 보이려고 꾸밀 적에는 이래저래 말
[ 배달겨레소리 바람 바람 글님 ] [아들, 딸에게 들려 주는 좋은 말씀]36-좋지 않은... 한글날을 맞아 여러 가지 기별이 들리던데 너희들은 어떤 기별에 눈과 귀가 쏠렸는지 궁금하구나. 여느 해와 달리 토박이말과 아랑곳한 기별이 우리 고장 진주에서 몇 가지 들려 기뻤단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토박이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가 가장 바람직한 말글살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바탕이 조금씩 다져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단다. 오늘 들려 줄 좋은 말씀은 "좋지 않은 날은 없다. 좋지 않은 생각이 있을 뿐이다."야 이 말씀은 '데이비드 어빙'이라는 분이 남기신 말씀인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굳힌다는 뜻을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해. 나를 먼저 돌아 보렴.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는거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배곳에 가 있는 낮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했던 일을을 하나씩 돌아보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둘레 사람을 보렴. 내 둘레에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을 해 주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쁜 생각을 많이 하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숲하루 풀꽃나무 이야기 73] 호박꽃 호박꽃이 떨어지고 호박이 둥글게 여문다. 어머니는 호박씨는 곡식을 심는 밭에 뿌리지 않고 밭둑에 심었다. 풀을 뽑고 씨앗이나 어린싹을 심고 물을 준 뒤 동그랗게 비닐을 씌웠다. 싹이 자라서 비닐을 걷어내면 밭둑으로 덩굴이 뻗는다. 잎이 우거지고 줄기에 까칠한 털이 있다. 밭일 들일 하고 어린 호박을 따왔다. 호박은 누렇게 익을 때까지 따먹는다. 어린 호박일수록 겉이 매끈하고 속에 씨가 여물지 않아 볶고 찌개로 끓였다. 수제비하고 국수에도 호박을 넣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호박국을 맛있게 먹는데 나는 호박국이 맛이 없었다. 하나씩 따먹어도 누런 호박이 많아 아버지는 지게에 짊어지고 온다. 누런 호박은 윗목 구석에 두었다. 호박은 자리를 옮기면 썪는다고 한자리에 쌓아 놓고 하나씩 긁는다. 아버지가 납작한 쇠를 주름잡아 긁개를 만들어 주면 어머니하고 나는 호박을 긁었다. 호박씨는 걷어서 종이에 널고 물컹한 털을 숟가락으로 긁어낸 다음 긁개로 긁는다. 날카로운 긁개 구멍으로 호박이 길쭉하게 쭉쭉 나왔다. 무를 채 썰어 놓은 듯 쌓였다. 어머니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호박을 섞어 부침을 해주었다. 노릿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숲하루 풀꽃나무 이야기 72] 메주 어린 날에 겨울이 되면 하루를 잡아 온 가족이 메주를 쑤었다. 볕 따뜻한 날 가마솥에 콩을 삶아 디딜방아에 찧어서 고무 그릇에 퍼담아 시렁이 있는 방에서 일을 나누었다. 쳇바퀴는 새끼줄을 친친 감고 보자기를 펴서 깔고 콩을 가득 채운 뒤 덮고 올라가 발로 자근자근 밟았다. 메주를 밟아 틀을 빼서 좀 두고 꾸덕꾸덕하면 짚으로 매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방이 좁아서 틀에서 빼면 그대로 묶느라 애써 밟은 메주가 터져 떨어지기도 한다. 겨울 동안 따뜻한 방에서 메주가 바짝 마르면서 곰팡이가 피고 속에서 뜬다. 메주 뜨는 냄새가 쿰쿰하다. 방안 가득 찬 메주 냄새이다. 머리에도 옷에도 배는 메주 띄우는 냄새를 아주 싫어했다. 우리는 설까지 이 냄새를 맡으며 잤다. 메주는 따뜻한 방에 놓아야 노랗고, 하얀 곰팡이가 피어야 잘 띄운 메주가 되고 잘못 띄우면 까맣게 핀다. 설 쇠고 나면 메주를 쪼개서 장을 담았다. 사월인가. 파리가 없을 적에 장단지를 열어 둔다. 비를 맞지 않는 처마 밑에 두고 장물 떠내고 된장을 쑨 다음 단지를 꽁꽁 처맨다. 똥파리는 단지를 덮어 두어도 뚜껑 밑으로 타고 들어가서 냄새나는
[ 배달겨레소리 바람 바람 글님 ] [책에서 길을 찾다]4-뒤잇다 오늘 되새겨 볼 글도 지난 글에 이어서 이극로 님의 '고투사십년' 안에 있는 유열 님의 '스승님의 걸어오신 길'에 있는 것입니다. 월에서 제 눈에 띄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말년에 을사 조약이 맺어지고, 뒤이어 경술 합병이 되자, 스승은 손에 들었던 호미 자루를 던지고 어린 두 주먹을 차돌처럼 불끈 쥐고 멀리 멀리 하늘 저쪽을 노려보며 구슬같은 눈물 방울이 발 등을 적시었다. 그 때부터 그 손에는, 그 가슴에는, 이 겨레의 목숨이 이 民族의 역사가, 이 나라의 希望이 가득 차지하였었다.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향을 등진 스승은 산길 물길을 두려워 하지 않고 한번 품은 큰 뜻은 더욱 굳어가고 커갈 뿐이었다. [이극로(2014), 고투사십년, 227쪽. 스승님의 걸어오신 길_유열]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뒤이어'입니다. 이 말은 '뒤잇다'가 본디꼴이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과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다. 또는 그것을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다.'는 뜻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번갯불에 뒤이어 우르르 쾅쾅 하는 우렛 소리가 들렸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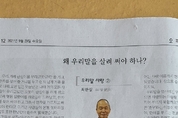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이 글은 한실님이 울산제일일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 글입니다. 우리말살이는 겨레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바탕이다 1. 우리말살이란 무엇인가? 우리겨레가 우리말살이를 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한사람 한 사람이 나날살이에서 즐겨 쓰는 말이 우리말일까요? 우리말을 쓰고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따져보면 우리말살이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이 일을 깊이 따져보려면 우리말살이가 무엇이며 또 우리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말살이란 무얼 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자면 다른 이들과 어울려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나누는 말마디가 우리말이냐는 겁니다. 우리말을 쓴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고 우리말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꿈꾸고 우리말로 쓴 글이나 책을 읽고 산다는 뜻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말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다 우리말일까요? 요즘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내를 와이프라 일컫습니다. 오늘날 널리 쓰는 말 와이프가 우리말일까요? 아무도 와이프가 우리말이라고 생각
[ 배달겨레소리 바람 바람 글님 ] [노래에서 길을 찾다]19-그대와의 노래 오늘 들려 드릴 노래는 '그대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4317해(1984년) 엠비씨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지관해 님이 노랫말과 가락을 지었으며 '뚜라미'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간 '고은희, 이정란' 님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소리꽃(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소리꽃(음악)을 찾자고 외치는 알맹이라고 하는데 노랫말이 모두 토박이말로 되어 있어 더 반가웠습니다. 그대와 같이 부를 노래를 찾는다면 궂은날 어둠을 슬프게 읊지 않겠다는 말과 거센 바람이 불어와 앞길을 가려도 그 노랫소리는 내 마음에 들려올 거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궂은날 어둠조차 슬프게 느껴지지 않을 노래이고 거센 바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노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노래의 힘을 나타내는 노랫말에 더한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제 귀를 맑혀 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리라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노래를 들으며 귀도 마음도 같이 맑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토박이말을 잘 살린 노랫말도 마치 가락글과 같아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풀이를 해
[ 배달겨레소리 바람 바람 글님 ] [토박이말 살리기]1-78 땅보탬 오늘 알려드릴 토박이말을 땅보탬입니다. 이 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힘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지만 보기월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힘'이라고 풀이를 하고 "에라, 이 땅보탬을 시킬 놈 같으니!"라는 월을 보기로 들었습니다. 이를 볼 때 '땅보탬'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서 보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 온 나라나 겨레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누구나 죽으면 땅보탬이 되는 것이기에 그리 나쁜 말이 아니지 싶습니다. 오히려 죽어서 땅보탬도 못 될 사람이라는 말이 더 가슴 아픈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땅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 여겨 '땅보탬'이라는 말을 만들 만큼 빗대어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셨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토박이말에 깃든 우리 겨레의 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골에 가서 풀을 베고 왔는데 제가 벤 풀도 땅보탬이 될 것이고 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