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 걷다1 : ①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다 (㉥ 아장아장 걷는 아기걸음) ② (한쪽으로) 나아가다 (㉥ 우리 겨레가 둘로 갈아져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 · 걷다2 : ① (늘어뜨리거나 펼쳐진 것을) 추켜올리거나 말아 올리다 (㉥ 냇물이 불어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렸다.) ② (덮였거나 깔렸거나 널린 것을) 접어서 개키거나 치우다 (㉥ 빨래를 걷다, 멍석을 걷다) ③ (여럿한데서 돈이나 몬을) 받아 모으다 (㉥ 우리끼리라도 돈을 걷어서 우리말 살리는 밑돈으로 써요.) · 그리다 : ① 금을 긋거나 빛깔을 입혀서 종이, 천, 벽같이 편편한 바닥에 몬 꼴을 나타내다 (㉥ 솔거가 절벽에 소나무를 그렸더니 새가 산 나무인줄 알고 날아와 떨어지곤 했다나.) ② 생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가락으로 나타내다 (㉥ 글쓴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그려놓았다.) ③ 마음에 떠올리다 (㉥자주 죽을 때를 그려보면 달라붙음에서 놓여나기 수월하다.) · 그림 : 금을 긋거나 빛깔을 발라서 종이, 천, 바람(벽) 같은 편편한 바닥에 나타낸 것 (㉥ 절 바람(벽)에 그린 열 가지 소 그림은 마음을 닦으면 마음이 어떻게 고요하고 흐
[ 배달겨레소리 바람 바람 글님 ] #토박이말바라기 #이창수 #토박이말 #살리기 #터박이말 #참우리말 #순우리말 #고유어 #까치설 #쇠다 #설빔 [설과 아랑곳한 토박이말]까치설 쇠다 설빔 해마다 설을 맞이하는데 설날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설을 앞뒤로 듣거나 쓰게 되는 말 가운데 알고 쓰면 좋을 말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까치설’이라는 말입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라는 애노래(동요) 때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까치설’이란 말의 뜻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구요. 말집(사전)에 찾으면 ‘어린아이의 말로 설날의 전날 곧 섣달 그믐날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를 해 놓았지요. 이 ‘까치설’을 두고 여러 가지 풀이가 있지만 가장 그럴 듯한 풀이는 옛날부터 설 앞날을 ‘작은설이라고 했고 작은설이라는 뜻으로 ‘아치설’ 또는 ‘아찬설’이라고 했다는 거죠. ‘아치설’의 ‘아치’는 ‘작다’는 뜻을 지닌 말인데 그 뜻을 잃어버리면서 소리가 비슷한 ‘까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보기로 음력 스무이틀(22일) 조금을 남서쪽에 있는 고장에서는 ‘아치조금’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쪽에 있는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내가 사랑하는 아이] 18. 언니 한 해 끝자락 작은딸이 왔다. 푹신한 걸상 팔걸이에 잠옷을 얹었다. 짙은 파랑에 작고 하얀 점이 촘촘히 찍히고 단추 달린 옷이다. “엄마가 안동 간 날 문 앞에 있던 그 잠옷이가?” “응. 빨려고 내놓았지.” “아직 안 입은 옷 같던데?” “새로 샀으니 빨아서 입으려고 했지.” “그날 손빨래를 할 때 말하지. 엄마는 물리는 줄 알았어. 이쁘네!” “언니는 더 이뻐. 분홍빛이야!” “언니 잠옷 사줬나?” “아니, 이달에 둘이 돈 안 넣고 그 돈으로 똑같은 잠옷 샀지.” 새해라고 내게 돈 자루를 준다. 두 딸이 일 다니고 돈을 쪼개서 모은다. 그러께는 둘이 모은 돈으로 언니하고 이웃나라 태국을 다녀오고, 설날하고 한가위와 오월 어버이날하고 엄마 아빠 생일에 그 돈을 헐어 쓴단다. 두 딸이 준 돈은 기쁘게 받는다. 떠나갈 때는 내가 받은 돈만큼 찻삯으로 돌려준다. 두 딸이 돈을 모아서 같이 가고 같은 옷 입으니 부럽다. 나는 언니도 없고 여동생도 없다. 오빠 둘하고 남동생 둘이고 딸은 혼자다. 클 때 싸우고 놀던 바로 밑 동생하고 바로 위 오빠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있지만, 모두 짝을 맺고 나서는…
[ 배달겨레소리 바람 바람 글님 ] 오늘 알려드릴 토박이말은 '꺽지다'입니다. 이 말은 '됨됨(성격)이나 몸이 억세고 꿋꿋하다'는 뜻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풀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용감하다'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감하다'는 말이 익어서 '꺽지다'는 말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느낌은 제가 토박이말을 알려드릴 때마다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처음 보면 낯설고 어겹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꾸 보고 만나다보면 낯이 익고 만만해지지요. 토박이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을 먼저 알고 쓰다보니 새로운 토박이말이 낯설고 어렵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 '꺽지다'라는 말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인 '꺽지'라는 민물고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 말과도 이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알려주고 쓰다보니 '용감(勇敢)하다'라는 말이나 브레이브(barve) 라는 말을 만났을 때 '꺽지다'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다면 더는 낯선 말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몸이나 됨됨 어디를 봐도 꺽진 것과는 아주 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둘레에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 갈마 들이다 : 갈아들게 하다 (㉥ 돌봄이들이 몇시간 마다 갈마들이었다.) · 갈마 들다 : 서로 번갈아 들다 (㉥ 예쁜 돌봄이 둘이 갈마 들어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다.) · 갈마보다 : 서로 번갈아 보다 (㉥ 손님들은 그 오누이를 갈마보며 귀여워했다) · 즈음 : 일이 어찌 될 무렵 (㉥ 언니가 떠나려 할 즈음에 아우가 들어왔다.) · 즈음하다 : 어떤 일을 맞이하다(← 제하다) (㉥ 샘 기림날에 즈음하여 기림글을 쓰다.) · 끊다 : ① 이어진 것을 잘라 가르다 (㉥ 다리를 끊다) ② (이어하던 짓이나 사이를) 그만두다 (㉥ 사귐을 끊다, 하던 말을 끊다) ③ (옷감, 차표를) 사다 (㉥ 저고리감을 끊다.) ④ 없어지게 하다 (㉥ 목숨을 끊다) ⑤ 셈하다 (㉥ 밀린 품삯을 모레까지 다 끊어주겠소.) · 깎다 : ① (무엇을) 칼날 같은 것으로 얇게 베거나 밀어내다 (㉥ 참외를 깎다) ② 베게 난 털이나 풀 같은 것을 잘라내다 (㉥ 머리를 깎다, 잔디를 깎다) ③ 값을 덜어내다 (㉥ 오이 값이 비싸니 좀 깎아주세요.) · 꺾다 : ① 구부려 부러뜨리다 (㉥ 나무를 꺾지 않아요.) ② (허리, 팔, 다리 따위를) 구부리
[ 배달겨레소리 바람 바람 글님 ] 오늘 알려드릴 토박이말은 '깨단하다'입니다. '오래 생각나지 않았던 일 따위를 어떤 실마리로 말미암아 환하게 깨닫거나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비슷한 일들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스무 해가 넘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풀이해 드릴 때 쓸 토박이말을 살려야 할 까닭을 찾고 있었는데 아이가 저한테 한 말 한 마디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되었음을 깨단한 적이 있습니다. 토박이말을 살려야 할 까닭을 찾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도 되었음을 아이 말로 깨단하게 된 것이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던 까닭을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한 한 마디를 듣고 알게 되었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던 까닭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찾지 못했는데 길을 가다가 본 가게 이름을 보고 생각이 나서 찾게 되었다면 00을 어디 뒀는지 생각이 안 났는데 가게 이름을 보고 깨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깨단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도 적지 않지 싶습니다. 저도 아직 토박이말을 살려 일으킬 더 좋은 수를 찾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깨단하신 일은 무엇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말. 파다 헤엄을 못 치는 분이라면 물이 조금만 깊다 싶어도 두렵습니다. 헤엄을 치는 분이라면 깊거나 얕거나 대수롭지 않습니다. 풀꽃나무를 읽는 분이라면 숲으로 깊숙히 들어선대서 무섭지 않습니다. 풀꽃나무를 모르고 숲을 사귀지 않기에 깊숙히 들어갈수록 어쩐지 무섭습니다. 찬찬히 마주한다면 우리 삶자리에서 두렵거나 무서울 일은 없지 싶어요. 속깊이 바라보거나 하나씩 파헤치지 않다 보니 섣불리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싹트지 싶어요. 그렇다고 나쁘지 않아요. 왜 틈이 생겨서 더욱 멀리하는가를 살피고, 벌어진 자리를 찬찬히 다독이면서 우리 마음을 보면 되지 싶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마주하나요? 어떤 얘기에 이끌리나요? 어떤 소리에 휩쓸리나요? 흐름을 헤아리고 밑바탕을 살핀다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무서움이 아닌 새로움으로 여길 만해요. 삶터를 이루는 뼈대는 늘 우리 생각대로 흐르지 싶습니다. 살림자리가 되는 바탕은 노상 우리 뜻에 맞추어 태어나지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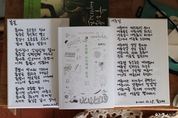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책숲하루’는 전남 고흥에서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책숲(도서관)을 꾸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꽃을 짓는 길에 곁에 두는 책숲에서 짓는 하루 이야기인 ‘책숲하루 = 도서관 일기’입니다. 책숲하루 2021.2.4. 철 ―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 : 우리말 배움터 + 책살림터 + 숲놀이터 한자말 ‘불찰’이 어떤 결인가를 살피며 손질하다가 ‘졸속’이란 한자말을 나란히 손질하고, 우리말 ‘돌머리’를 어디까지 쓰는가를 두루 짚노라니 어느새 ‘바보·멍청하다·엉성하다·어리숙하다’로 줄줄이 잇닿습니다. 이러면서 ‘환경영향평가’란 이름을 ‘둘레보기’나 ‘숲살피기’나 ‘마을보기’로 손볼 만하겠다고 느낍니다. 적잖은 어른은 ‘사회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면서 어린이도 이런 말을 그대로 써야 하는 듯 여기곤 합니다. 어린이하고 푸름이가 ‘사회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배워야 한다고도 여기지요. 그런데 ‘사회’란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살림터에서 쓸 말이라면, 우리 삶자리에서 나눌 말이라면, 어른끼리 알아듣거나 그냥그냥 이어온 말씨가 아닌,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어린이하고 푸름이가 생각을 살찌우도록 북돋울 말이어야 즐겁고 아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닷 벗 노래 내 버디 몃치나 ᄒᆞ니 물돌과 솔대라 새 메에 달 오르니 긔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ᄉᆞᆺ 밧긔 또 더하여 머엇ᄒᆞ리 구름 빗치 조타ᄒᆞ나 검기ᄅᆞᆯ ᄌᆞ로 ᄒᆞᆫ다 ᄇᆞ람소ᄅᆞㅣ ᄆᆞᆰ다ᄒᆞ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토 그츨 뉘 업기는 물 뿐인가 ᄒᆞ노라 고즌 므스 닐로 퓌며셔 쉬이 디고 플은 어이ᄒᆞ야 프르ᄂᆞᆫᄃᆞᆺ 누르ᄂᆞ니 아마도 바뀌디 아닐ᄉᆞᆫ 바희 뿐인가 ᄒᆞ노라 더우면 곳퓌고 치우면 닙 디거ᄂᆞᆯ 솔아 너ᄂᆞᆫ 얻디 눈서리를 모ᄅᆞᄂᆞᆫ다 땅 속에 불휘 고ᄃᆞᆫ줄을 글로 ᄒᆞ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것시 곳기ᄂᆞᆫ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ᄂᆞᆫ다 뎌로코 네철에 프르니 그를 됴하 ᄒᆞ노라 쟈근 거시 노피 떠셔 골 것을 다 비취니 밤사이 밝은 빛이 너만ᄒᆞ 니 또 잇ᄂᆞ냐 보고도 말 아니ᄒᆞ니 내벋인가 ᄒᆞ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