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ㄱ 겹말 손질 : 새롭게 변신 새롭게 변신 중이다 → 새로워진다 → 확 바뀐다 새롭다 : 1.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 2.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다. 변신(變身) : 몸의 모양이나 태도 따위를 바꿈 바꾸다 : 1.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거나 대신하게 하다 ‘바꾸는’ 몸짓을 한자말로 ‘변신’이라 하는데, 두 낱말 ‘바꾸다·변신’은 예전 몸짓이나 모습이 아닌 ‘다른·새로운’ 몸짓이나 모습으로 가는 결을 나타내요. “새롭게 변신”은 겹말입니다. ‘새롭다’ 한 마디만 쓰면 되고, “새롭게 간다”나 “새롭게 태어난다”로 손볼 만해요. “확 바뀐다”나 “바뀐다”로 손보아도 되고, “거듭난다”나 “거듭나려 한다”로 손볼 수 있어요. 창동은 이제 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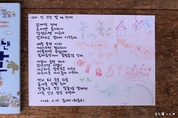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노래꽃 / 숲노래 동시 내가 안 쓰는 말 26 관계 얽매면 엉켜 옭매면 올가미야 엉성하면 어긋나 얼차리고 얼러서 어우른다 매를 들면 아파 매서우면 멀리하지 매몰차면 무섭더라 꽃매듭짓기에 꽃맺음으로 간다 사납게 굴면 떠나 낡삭으면 지겹지 사고파는 장삿속은 치우고 사근사근 사이좋게 사귄다 싹이 트고 눈을 틔울 틈새를 살짝 둔다 빗줄기로 씻고 빛줄기로 달래며 서로 잇고 살살 비운다 ㅅㄴㄹ 국립국어원 낱말책은 ‘관계(關係)’를 “1.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2.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풀이하는데, ‘관련(關聯)’이란 한자말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음”으로 풀이합니다. 우리말 ‘맺다’는 “5. 관계나 인연 따위를 이루거나 만들다”로 풀이하지요. 여느 어른이라면 한자말 ‘관계·관련’이나 우리말 ‘맺다’를 낱말책에서 찾아볼 일이 없이 그냥 쓸 텐데, 어린이·푸름이는 이런 말을 어떻게 엮고 헤아려서 익힐 수 있을까요? “관계를 맺다”나 “관련을 맺다”는 겹말풀이일 뿐 아니라, ‘맺다’부터 제대로 풀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꽃 말꽃삶 11 다른 다양성 겉으로 치레하는 사람을 보면 ‘겉치레’라고 얘기합니다. 멋을 부리려는 사람한테는 ‘멋부린다’고 들려줍니다. 겉치레나 멋부리기에 얽매이는 사람을 마주하면 ‘허울’을 붙잡는다고 짚습니다. 우리말 ‘허·하’는 말밑이 같습니다. 그러나 말밑은 같되 낱말이나 말결이나 말뜻은 다르지요. ‘허울·허전하다·허름하다·허접하다’하고 ‘허허바다’는 확 달라요. ‘하늘·함께·한바탕·함박웃음·함함하다·하나’는 더욱 다르고요. 겉모습을 매만지려 하기에 그만 ‘허울스럽다’고 한다면, 속빛을 가꾸려 하기에 저절로 ‘하늘같다’고 할 만합니다. 이처럼 ‘허울·하늘(한울)’이라는 수수하고 쉬우며 오랜 우리말을 나란히 놓고서 삶을 바라보는 눈썰미를 돌보기에 ‘생각’이 자라납니다. 굳이 일본스런 한자말을 따서 ‘철학’을 안 해도 되고 ‘전문용어’를 쓸 까닭이 없습니다. ‘전문용어’를 쓸수록 생각이 솟지 않아요. ‘전문용어 = 굴레말·사슬말’입니다. 가두거나 좁히는 말씨입니다. 오늘날 숱한 ‘전문용어’는 거의 다 일본 한자말이거나 영어예요. 우리말로는 깊말(전문용어)을 짓거나 엮거나 펴려는 분이 뜻밖에 매우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99] 전기삯 전기삯이 오른다. 오월 볕이 칠월 볕 같다. 한여름이 되면 얼마나 뜨거울지 전기삯 걱정에 미리 시름에 잠긴다. 어느 벗이 동생이 꾸리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여름이면 전기삯이 팔백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 “헉!” 소리만 나왔다. 남 얘기 같지만 우리도 만만찮다. 지하실은 일층보다 넓지만, 불을 밝히고 모터를 돌리니 삼만 원 덜 낸다. 일층은 제법 낸다. 겨울이면 백만 원쯤 내고 더위가 한창 올라가면 곱이 넘는다. 그렇다고 냉장고 물건을 팔아서 전기삯을 낼 만큼 벌어들이지는 않는다. 앞에서는 이것저것 그나마 팔아서 겨우 남기지만 묵혀서 버리는 값하고 집삯과 전기삯이 큰짐이다.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는 일이다. 우리 가게는 에어콘은 따로 돌리지 않는다. 냉장고 문을 열어 두어서 시원하다 못해 일하는 우리는 춥다. 앞문이 열릴 적마다 옆문이 열릴 적마다 추울 적에는 찬바람이 세게 들어오고 더울 적에는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온다. 이 바람으로 아무리 냉장고에 있어도 무르거나 맛이 쉽게 간다. 손님이 뜸하면 비닐 가리개를 내린다. 짝은 알면서도 꾸중한다. 손님이 꺼내다가 부딪쳐 가리개가 찢어지는…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98] 힘 앞산 자락길을 걷는다. 공룡공원을 지난다. 여기에는 이름처럼 공룡 닮은 인형을 세웠다. 앞에 다가가면 머리를 움직이며 소리를 낸다. 몸집이 누가 더 큰지 내기라도 하듯 힘자랑하듯 이빨을 드러낸다. 등은 주름지고 꼬리가 길고 짧은 앞다리를 들었다. 공룡이 곧 살아 움직일 듯하다. 아이가 울다가도 이 짐승만 보면 울음을 뚝 그칠 듯하다. 찔레꽃이 한창이다. 오늘이 아니면 찔레꽃을 놓칠지 몰라 가까이 다가간다. 손가락 틈으로 끼워 손등에 올리고 냄새를 맞는다. 찔레꽃은 언제 맡아도 향긋하고 상큼하다. 길을 꺾어 건너편에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나무틈으로 본다. 멀리서 보니 공룡이 나무보다 크다. 그 옛날 큰 덩치가 버티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 움직이는 짐승은 풀을 먹든 열매를 먹든 다른 짐승을 먹든 배를 채운다. 한 자리에 머무는 풀꽃나무는 햇살과 비바람을 받아먹어야 쑥쑥 자라서 숲에 나눈다. 하나는 주고 하나는 먹기만 하면 셈이 맞지 않네. 짐승 몸을 지나 풀은 멀리멀리 뿌리를 내리고 싶겠지. 우리 별이 자리를 잡기까지 바람 비 구름 해 불이 한바탕 싸움을 치렀을는지 모른다. 이동안 누구는 터전을 잃고 누구는…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 좀 생각합시다 32 다솜 ‘다솜’이라는 이름을 어버이한테서 받은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1970년대부터 ‘다솜’이라는 이름을 아이한테 붙이는 분이 나타났지 싶고, 1950∼1960년대에도 이 말을 아이한테 붙였을 수 있고, 더 먼 옛날에도 즐거이 썼을 수 있어요. 2000년에도 2010년에도 2020년에도 국립국어원 낱말책에는 ‘다솜’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갈 듯싶습니다. 국립국어원 일꾼은 ‘다솜’을 구태여 낱말책에 올려야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낱말을 매우 즐거우면서 기쁘게 써요. 생각해 보셔요. 아이한테 붙이는 이름으로 ‘다솜’을 쓴다면,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아이한테 ‘사랑’이란 이름을 붙이는 어버이도 많지요. ‘다솜·사랑’, 두 낱말은 한 뜻입니다. ‘다솜’은 사랑을 가리키는 옛말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시 헤아려 보기를 바라요. 참말로 ‘다솜’이 옛말일까요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33. 밥옷집 남녘에서는 한자말로 ‘의식주’라 하고, 북녘에서는 한자말로 ‘식의주’라 한다. 남북녘은 서로 옳다고 티격태격한다. 그러나 굳이 둘이 다툴 까닭이 없다. ‘옷밥집’이나 ‘밥옷집’처럼 우리말을 쓰면 된다. 따로 하나만 올림말(표준말)이어야 하지 않다. ‘옷집밥’이나 ‘밥집옷’이라 해도 되고, ‘집옷밥’이나 ‘집밥옷’처럼 사람들 스스로 가장 마음을 기울일 대목을 앞에 넣으면서 말하면 된다. 밥옷집 (밥 + 옷 + 집) : 밥과 옷과 집. 살아가며 누리거나 가꾸거나 펴는 세 가지 큰 살림을 아우르는 이름. 살아가며 곁에 두는 살림살이. (= 밥집옷·옷밥집·옷집밥·집밥옷·집옷밥. ← 의식주, 식의주) 34. 난해달날 태어난 해랑 달이랑 날을 한자말로는 ‘생년월일’이라 하고 ‘생 + 년월일’인 얼개이다. 이 얼개를 조금 뜯으면, 우리말로 쉽게 “태어난 해달날”이라 할 만하고, 줄여서 ‘난해달달’이라 할 수 있다. ‘난날·난해’처럼 더 짧게 끊어도 된다. 난해달날 (나다 + ㄴ + 해 + 달 + 날) : 태어난 해·달·날. 몸을 입은 모습으로 이곳으로 나오거나 온 해·달·날. (= 난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사고 思考 논리적 사고 → 꼼꼼 생각 / 찬찬 생각 진보적 사고 → 앞선 생각 / 새로운 생각 사고 능력 → 생각하는 힘 / 생각힘 사고의 영역을 넓히다 → 보는눈을 넓히다 / 눈길을 넓히다 극단적인 사고를 배격하다 → 외곬을 물리치다 / 외곬넋을 물리치다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는 → 그런 좁은 틀은 / 그런 얕은 눈은 ‘사고(思考)’는 “1. 생각하고 궁리함 2. [심리] 심상이나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의 작용. 이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직관적 사고, 분석적 사고, 집중적 사고, 확산적 사고 따위가 있다 3. [철학] = 사유(思惟)”를 가리킨다고 해요. ‘궁리하다(窮理-)’는 “2.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하다”를 가리킨다지요. 곧 ‘사고 = 생각하고 생각함’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97] 큰딸이 차려준 아침밥 오월이 되니 쉬는 날이 길다. 작은딸이 차표를 못 끊었다. 아들은 시험이 남아 안 온다. 둘이 지내다가 큰딸 하나만 왔을 뿐인데 어린이가 있는 집처럼 다르다. 아빠는 딸을 챙기고 딸은 아빠한테 이것저것 시킨다. 일 마치고 오는 아빠한테 태우러 오라고 하질 않나, 잘 안 해 먹는 반찬을 해 달라 하고 피자도 먹는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침밥을 맡겠단다. 아빠가 밖에서 먹어 보지 못한 스파게티를 한단다. 얻어만 먹을까 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 싶어 거들기로 한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켜 놓는다. 불판 둘을 씻어 놓고 딸을 깨웠다. 딸은 식빵을 둘 구워서 접시에 담는다. 나는 딸이 시키는 대로 양상치를 씻고 토마토를 썰고 마늘 한 줌을 납작하게 썰고 쪽파를 총총 썰고 고추를 다져서 그릇에 담는다. 물이 끓는 사이 딸이 올리브기름을 붓고 내가 썰어 준 마늘을 넣고 끓이면서 스파게티 국수도 삶는다. 삶은 국수를 마늘 볶는 그릇에 돌돌 말아 넣고 골고루 섞으며 익힌다. 큰 접시를 꺼내주니 마늘 넣고 볶은 스파게티를 돌돌 말아 건져서 동그랗게 담는다. 여기에 다진 고추를 올리고 올리브기름을 곁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96] 논깃새 밭깃새 이튿날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참외싹하고 옥수수싹을 열 포기씩 샀다. 엄마는 마을회관 앞에서 내가 오도록 기다리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갓골에 먼저 갔다. 나는 집으로 갔다가 바로 뒤따라가는데 엄마 꽁지가 안 보인다. 여든 살 할매치고는 빠르다. 숲길로 들어간다. 내가 어릴 적에는 도랑으로 못가로 다니던 숲길인데, 이제는 풀길로 덮인다. 솔밭으로 빙 돌아서 걸어간다. 이쪽은 예전에 아버지가 경운기를 몰던 길이다. 천천히 풀밭길을 걷는 동안 아버지 옛모습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계시고 오빠하고 함께 작은집으로 살던 예전에는, 여기 논에 마늘을 심었다. 여름이면 마늘을 캐고 볏모를 심고 가을에 다시 마늘을 심느라 바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 그때는 논이 작게 네 뙈기였다. 이 네 뙈기 논을 두 뙈기로 뭉치고 다시 한 뙈기로 이었다. 엄마는 한창 일철이라 바쁜 그 무렵, 누구 하나 밭을 갈아 줄 사람이 없으니 으레 호미 하나를 들고 김을 맸단다. 엄마 혼자 이 땅을 다스리기에는 이제 벅차다. 가만히 있자니 풀밭이 되고 밭을 붙일 사람은 없고 예순 해 동안 흙을 일구다가 뻔히 묵정밭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