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 : 얄궂은 말씨 손질하기 11 ㄱ. 네 권의 사전을 가지고 비생산적 권(卷) : 1. 책을 세는 단위 사전(辭典) :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 ≒ 말광·사림·사서·어전 소통(疏通) : 1.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가능(可能) :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음 점(點) : 5. 여러 속성 가운데 어느 부분이나 요소 불편(不便) : 1.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움 2.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괴로움 3. 다른 사람과의 관계 따위가 편하지 않음 비생산적(非生産的) : 1.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는 그런 것 2. 그것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것이 전혀 생겨나지 않아 도움 될 것이 없는. 또는 그런 것 책을 셀 적에는 “네 권의 사전”이 아닌 “낱말책 넉 자락”이라 해야 올바른데, 보기글이라면 “네 가지 낱말책”이나 “낱말책 네 가지”라 해야 어울립니다. 이야기는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낳지 못한다(비생산적)”고 한다면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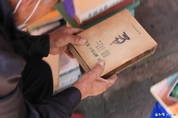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책숲마실’은 나라 곳곳에서 알뜰살뜰 책살림을 가꾸는 마을책집(동네책방·독립서점)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여러 고장 여러 마을책집을 알리는(소개하는) 뜻도 있으나, 이보다는 우리가 저마다 틈을 내어 사뿐히 마을을 함께 돌아보면서 책도 나란히 손에 쥐면 한결 좋으리라 생각하면서 단출하게 꾸리려고 합니다. 마을책집 이름을 누리판(포털) 찾기칸에 넣으면 ‘찾아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숲노래 책숲마실 오월광주 ― 광주 〈일신서점〉 어느새 ‘오월광주’란 넉 글씨는 한 낱말로 뿌리내린 듯합니다. 해마다 오월이면 전남 광주는 길을 막고서 여러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요, ‘잔치’를 벌입니다. ‘고요히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왁자지껄한 잔치판입니다. 2022년 5월 18일을 앞두고 광주로 바깥일을 보러 가는 김에 헌책집 〈일신서점〉에 들릅니다. 저는 광주책집을 자주 드나들지는 않습니다만, 광주에서 책집마실을 하며 다른 책손을 스치거나 만나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누가 오월광주를 묻는다면, 전남사람으로서 “왁자판을 꺼리며 이름을 감추고 들풀로 가만히 지내는 사람이 한쪽이라면, 왁자판을 벌이고 왁자지껄하게 나서는 사람이 한쪽입니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책숲마실’은 나라 곳곳에서 알뜰살뜰 책살림을 가꾸는 마을책집(동네책방·독립서점)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여러 고장 여러 마을책집을 알리는(소개하는) 뜻도 있으나, 이보다는 우리가 저마다 틈을 내어 사뿐히 마을을 함께 돌아보면서 책도 나란히 손에 쥐면 한결 좋으리라 생각하면서 단출하게 꾸리려고 합니다. 마을책집 이름을 누리판(포털) 찾기칸에 넣으면 ‘찾아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숲노래 책숲마실 누가 시키면 ― 대전 〈중도서점〉 이 시골에서 저 시골로 찾아가는 길은 멀지만, 먼 만큼 길에서 느긋하게 삶을 돌아보면서 붓을 쥐어 글을 쓸 짬이 있습니다. 시골집에서는 집안일을 맡고 낱말책을 여민다면, 마실길에는 노래꽃을 쓰고 생각을 추스릅니다. 오늘 찾아갈 마을책집을 그리고, 이튿날 만나서 이야기꽃을 들려줄 이웃을 헤아리지요. 우리는 두 가지 말 가운데 하나를 씁니다. 하나는 사투리요, 둘은 서울말입니다. 사투리란, 삶·살림을 손수 짓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스스로 펴면서 숲빛을 누리고 나눌 적에 피어나는 말입니다. 서울말이란, 나라(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고 받아들이면서 돈을 버는 바깥일을 하려고 외우느라 스스로 갇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숲노래 우리말 말 좀 생각합시다 27 손자아들 낱말책에서 ‘손녀딸(孫女-)’을 찾아보면 “‘손녀’를 귀엽게 이르는 말”로 풀이합니다. ‘손자아들’도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손자아들’은 낱말책에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으나 아리송합니다. 왜 ‘손녀딸’은 오르고 ‘손자아들’은 안 오를까요? 그리고 ‘손녀딸’이라는 낱말은 알맞은가 하고 더 헤아려 볼 만합니다. ‘손녀’라는 낱말로 우리 딸아들이 낳은 ‘딸’을 가리킵니다. ‘손녀 + 딸’은 겹말입니다. ‘외갓집’이나 ‘처갓집’도 겹말이지요. ‘외가·처가’가 바로 ‘집’을 가리키기에 ‘외가 + 집’이나 ‘처가 + 집’은 겹말이지요. 겹말이라 하더라도 귀엽게 이르려고 구태여 ‘손녀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로서는 가시내만이 아닌 머스마도 귀엽게 마련이에요. 귀여운 머스마한테는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귀엽기에 “귀여운 손녀”나 “귀여운 손자”라고 하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꽃 곁말 34 새바라기 한참 놀다가 문득 가만히 해를 보고서 담벼락에 기대던 어린 날입니다. 어쩐지 멍하니 해를 바라보는데 옆을 지나가던 어른이 “넌 해바라기를 하네?” 하고 얘기해서 “네? 해바라기가 뭔데요?” 하고 여쭈었더니 “해를 보니까 해바라기라고 하지.”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별바라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별을 좋아해서 밤하늘 별을 가만히 보는 일을 가리켜요. 낱말책에는 그릇을 가리키는 ‘바라기’만 나오고, ‘바라다·바람’을 가리키는 ‘바라기’는 아직 없습니다. ‘님바라기’를 흔히 말하고 ‘눈바라기·비바라기’가 되면서 ‘구름바라기·바다바라기’로 지내는 분이 퍽 많아요. 저는 ‘숲바라기’하고 ‘사랑바라기·꽃바라기’를 생각합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바라기’란 삶이 흐르고, 글을 써서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33 일자리삯 서울에서 살며 일터를 쉬어야 할 적에 ‘쉬는삯’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터를 다니는 동안 받는 삯에서 조금씩 뗀 몫이 있기에, 일을 쉬는 동안에 이 몫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서울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미처 못 느꼈는데, ‘일자리삯’이라 할 이 돈은 서울사람(도시사람)만 받더군요.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씨앗을 심어 흙을 가꾸는 일꾼은 ‘일자리삯’하고 멀어요. 아이를 낳아 돌보는 어버이는 어떨까요? 곁일을 하는 푸름이는, 또 일거리를 찾는 젊은이는 어떨까요? 나라 얼개를 보면 빈틈이 꽤 많습니다. 이 빈틈은 일터를 이럭저럭 다니며 일삯을 꾸준히 받기만 했다면 좀처럼 못 느끼거나 못 보았겠다고 느낍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기에 빈틈을 훤히 느끼고, 아이를 낳아 돌보는 살림길이기에 빈구석을 으레 봅니다. 아무래도 시골사람은 매우 적고,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아버지 아이를 낳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어버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러나 이름을 얻기에 어버이답거나 아버지답거나 어머니답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오롯이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빛내기에 비로소 어버이다우며 어른스럽습니다. 딸아들을 함께 돌보는 곁님입니다. 두 사람은 짝을 이루어 아들딸을 보살펴요. 짝꿍 가운데 한 사람만 애를 보아야 하지 않아요. 짝님인 두 사람이 나란히 지피는 사랑이 어우러지면서 보금자리마다 포근히 숨결이 흐르고 즐겁습니다. 둥지살림을 꾸리다 보면 어느 날은 고갯마루를 넘는 듯할는지 몰라요. 이때에는 한결 느긋이 고개를 넘으면 돼요. 어느 때는 고빗사위처럼 아슬아슬하겠지요. 이때에는 더욱 넉넉히 마음을 다독이면서 아이들하고 소꿉놀이를 하듯 천천히 가면 되어요. 욱여넣듯 적바림해야 글이 되지 않습니다. 잔뜩 써넣어야 멋지지 않아요. 어제는 어제요 오늘은 오늘인 줄 환하게 헤아리면서 새길을 가는 몸차림으로 한 줄씩 옮기면 어느새 글꽃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먼눈 가까이에 있으나 잘 보이지 않아서 키워서 보려 합니다. 멀리 있기에 잘 안 보이는구나 싶어 확 끌어당겨서 보려 하고요.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숨결을 키워서 보는 ‘키움눈’입니다. 키우는 눈이기에 ‘키움거울’이기도 해요. 멀리 있어도 보도록 이바지하는 ‘먼눈’이에요. 멀리 있기에 잘 보도록 돕는 ‘멀리보기’이고요. 여러 살림을 만지면서 조임쇠를 맞춥니다. 큰조임쇠로 척척 움직이고서, 잔조임쇠로 살살 헤아려요. 보는판에 놓은 숨결을 키움눈으로 보면서 이모저모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곁에 있으나 미처 못 느낀 숨빛을 차근차근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바다에는 어떤 물톡톡이가 있을까요. 저 냇물에는 어떤 물톡톡이가 물살림을 펼까요. 이웃을 스스럼없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동무를 환하게 반기며 웃습니다. 서로 티없는 눈망울로 마주하면서 노래하고, 함께 해밝게 생각을 나누며 오늘을 누려요. 거짓없는 마음으로 하늘빛을 품습니다. 이슬같은 마음씨로 바다를 안지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공론 空論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 더구나 책상수다일 뿐이다 ‘공론(空論)’은 “실속이 없는 빈 논의를 함. 또는 그 이론이나 논의 ≒ 허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숙덕거리다·쑥덕거리다’나 ‘숙덕말·쑥덕말·숙덕질·쑥덕질’이나 ‘겉말·겉소리·겉얘기’로 손질합니다. ‘뜬구름·뜬말·뜬소리·뜬얘기·뜬하늘’이나 ‘말·말잔치·수다·얘기·이야기’로 손질할 만하고, ‘책상말·책상수다·책상얘기’나 ‘텅비다·빈말·빈소리·빈얘기·빈수레·빈수다’로 손질해도 어울려요. 학자들끼리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마는 → 배운이끼리 쑥덕대다가 끝나고 마는 → 먹물끼리 떠들다가 끝나고 마는 → 먹물끼리 책상얘기로 끝나고 마는 → 먹물끼리 겉얘기로 끝나고 마는 《너, 행복하니?》(김종휘, 샨티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에서 짓는 글살림”은 숲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골자락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을 짓는 길에 새롭게 맞아들여 누리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숲에서 짓는 글살림 31. 꽃바르다 여러 고장에서 살아 보면서 곳곳에서 달리 쓰는 말씨를 느낍니다만, 이 가운데 매우 다른 말씨 한 가지가 있으니 ‘내려오다·올라가다’입니다. 제가 나고자란 고장은 인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나, 적잖은 분들은 인천에서 수원이나 안산으로 갈 적만 해도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충청도나 대전에 갈 적에도 ‘내려간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인천에서 강화나 문산이나 파주에 가기에 ‘올라간다’고 하지 않아요. 인천서 서울로 갈 적에 비로소 ‘올라간다’고 합니다. 재미나다고 해야 할는지, 부산에서 인천에 오는 분도 더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인천서 부산에 갈 적에 ‘내려간다’고 하는 분도 많고요. 인천을 떠나 충북 충주에 살 적에는 대전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분을 꽤 보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충청도 곳곳으로 가는 길이 ‘내려간다’가 될 테지요. 전라도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광주에서 이곳저곳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다른 고을에서 광주로 ‘올라간다’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