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 거울 : ⓵ 몬 꼴이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게 유리 따위로 만든 것 (㉥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집 나선다.) ⓶ 어떤 것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이르는 말 (㉥ 가시는 버시거울, 버시는 가시거울) ⓷ 본보기를 일컬음 (㉥ 카사파 높은이는 두타살이 거울이다.) · 가라말 : 검은 말 (㉥ 값진 가라말에 올라타고,,) · 감1 : 감나무 열매 (㉥ 감은 우리나라 으뜸과일이다.) · 감2 : ⓵ 무엇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몬 (㉥ 새감으로 옷을 짓다.) ⓶ 옷감수를 세는 하나치 (㉥ 두루마기 한 감) · 감3 : 내다, 못 내다와 함께 쓰여 ‘무릅쓰고 해 볼 마음’ (㉥ 혼자서는 감을 못 내던 일도 여럿이면 하게 된다.) · 갈매기 : 갈매깃과에 딸린 물새 (← 백구) (㉥ 갈매기 울음소리 가득한 바위섬) · 갈매기살 : 돼지 가로막을 이루는 살 (㉥ 삼겹살보다 갈매기살을 더 좋아하는 아들) · 먹이 : ⓵ 짐승들 먹을 것 (㉥ 소먹이풀을 베러 지게를 지고 나갔다.) ⓶ 먹을거리 (㉥ 꿩 한 마리면 겨울철 먹이로는 그저 그만이지!) · 먹을거리 :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온갖 것 (= 먹거리) (㉥ 한살림은 믿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내가 사랑하는 아이] 10. 운전기사 시동 단추를 켜자 빨간 그림(!)이 뜬다. 집으로 오는 길모퉁이에 있는 바퀴집 마당에 차를 세운다. 아저씨가 바퀴를 빼서 바람을 넣고 물속에 담그고 꾹 누른다. 뽀글뽀글한 물방울이 안 일어나면 바람이 안 센다고 보여준다. 다른 바퀴도 봐야 하는데 바람 넣는 긴 줄 기계가 얼었다. 슬쩍 본 앞바퀴가 무척 닳았다. 곁님은 바퀴를 바꾼 지 몇 해 안 된다고 잘못 몬 버릇이라고 거든다. 차를 몬 지가 스물일곱 해가 넘는다. 갓 면허를 받고 곁님 차를 몰았다. 일터가 집에서 가까운 곁님은 자전거를 타고 나는 곁님 차를 몰거나 가끔 버스를 탄다. 1999해 12월에 빨갛고 작은 차를 샀다. 아들을 밸 적에 몰던 차를 열일곱 해를 몰았다. 기어가 옴짝달싹하지 않아 차를 버렸다. 일터에서 쓰는 차도 있고 곁님 차도 있어 나는 차를 사지 않으려고 했다. 곁님은 안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일터를 잘 꾸려가라고 어머님이 보태주셨는데, 차를 사면 시골 어른이 못마땅히 여길 듯했다. 곁님이 시골에 갈 적에 이러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미는 차를 몰 만하다. 그 차 오래 탔으니 바꿀 때도 됐다. 너도 조금 보태고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에서 짓는 글살림”은 숲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골자락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을 짓는 길에 새롭게 맞아들여 누리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숲에서 짓는 글살림 8. 봄내음 피어나는 말을 해보기 저는 ‘날조(捏造)’라는 낱말을 안 씁니다. 한자말이기 때문에 안 쓰지 않습니다. 이 낱말을 들으면 못 알아듣는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낱말 ‘날조’를 쓰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는 제 둘레에서 못 알아들을 만한 낱말을 구태여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낱말은 ‘꾸미다’나 ‘거짓’입니다. “날조한 이야기”보다는 “꾸민 이야기”나 “거짓 이야기”라고 해야 둘레에서 쉽게 알아들을 만하다고 느껴요. 때로는 “속인 이야기”나 ‘속임·속임수’라고 해 볼 만할 테고요. 저는 ‘선명(鮮明)’이라는 낱말도 안 써요. 이 낱말도 한자말이라 안 쓰지 않아요. 이 낱말을 못 알아듣는 어린이 이웃이 많아요. 제가 쓰는 낱말은 ‘또렷하다’나 ‘뚜렷하다’예요. 때로는 ‘환하다’를 쓰고, 어느 때에는 “잘 보이다”라고 말해요. 어느 때에는 ‘산뜻하다’나 ‘맑다’ 같은 말을 씁니다. 찬찬히 생각하면 이모저모 재미나게 쓸 만한 낱말이 아주 많습니다. 많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내가 사랑하는 아이] 9.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인데 크리스마스 노래를 듣기 어렵다. 아이들이 훌쩍 커서 나가고, 믿는 종교도 없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듯하다. 그저 쉴 수 있는 날로만 여기지 싶다. 기분을 내려고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노래를 올렸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꾸가 없고 딴말만 한다. 내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교회에 갔다. 며칠 도장 찍는 재미로 가고 선물 받는 재미로 갔다. 그런데 엄마는 교회 나가는 사람을 예수쟁이라 부르고 무엇이 못마땅한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도 가지 못하게 해서 겨우 갔다. 그날부터 교회는 가고 싶어도 참다가, 고2 때 동무 따라 몇 번 가고, 마흔이 되어서는 종교를 하나 갖고 싶었다. 목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좋았다. 나라밖으로 나들이하는 길로 여겼다. 스스로 아는 언니한테 교회에 좀 데리고 가라고 졸라서 몇 번 나갔다. 다섯 번쯤 나갔을 때 곁님이 눈치를 채고, 교회 나가려면 통장 다 꺼내놓고 아주 가란다. 언니하고 다짐한 세 번을 더 채우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우리 집안은 종교가 없지만, 시집에서는 교회 다니는 일을 아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괴로움은 두루 미치고, 아픔도 두루 미치고, 나숨도 두루 미칩니다. 누구라도 바라거나 골이 나거나 싫거나 두려운 마음(더럼)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굳어지고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들어맞아요. 그러므로 이 마음닦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 깜짝할 사이마다 몸틀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몸 참, 마음 참을 줄곧 바라봅니다. 숨이 들어오면 숨 들어옴이 이 때 참이고, 숨이 나가면 숨 나감이 이 때 참입니다. 숨이 깊으면 깊은 게고 얕으면 얕은 것입니다. 두루 미치는 참으로 마음을 닦아 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굳어있고 단단하고 거센, 겉 참에서 꿰뚫고 뚫고 나가, 쪼개고 나누고 녹이면서 가녀린 참으로 더 가녀린 참으로 나아갑니다. 나날이 거친 데서 가녀린 데로 더 가녀린 데로 나아가 가장 가녀린 몬 참, 가장 가녀린 맘 참으로 나아갑니다. 마음닦기 온 흐름은 스스로 참을 깨닫도록 도와줘요. 스스로를 알아가는 이 길은 누리흐름(참, 자연법칙)을 알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에서 참을 겪으면서 두루 미치는 누리흐름을 알아 갑니다. 목숨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모든 것에 들어맞는 두루 미치는 참입니다. 우리가 이 두루 들어맞는 참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 가 : ➀ 어떤 바닥이 끝나는 데 (㉥ 한길가, 밭가, 마당가, 냇물가) (←변) ➁ 어떤 것 바깥둘레나 언저리 (㉥ 그릇가, 우물가, 바닷가) · 기슭 : ➀ 메나 처마 따위에서 비탈진 곳 아래쪽 (㉥ 멧기슭, 처마기슭) ➁ 바닷물이나 가람물과 닿아있는 땅쪽 (㉥ 바다기슭, 가람기슭) · 기스락물 : 지붕 기슭에서 떨어지는 물 (← 낙숫물) (㉥ (어릴 때 기스락물 맞으면 물사마귀 생긴다고 어른들이 말했다.) · 기스락 : 기슭 가장자리 (= 기슭도리, 기스랑, 기스리) (㉥ 멧 기스락에 자리 잡은 수박밭) · 가마1 : 숯, 질그릇, 벽돌, 기와 따위를 구워 내도록 만든 곳 (㉥ 숯가마, 질그릇 가마) · 가마2 : 가마솥 준말 (㉥ 가마솥 콩도 삶아야 먹는다.) · 가마3 : 사람머리나 말, 소 같은 짐승 대가리에 머리털이 소용돌이꼴로 난 자리 (㉥ 난 가마가 셋이다.) · 가마4 : 조그만 집꼴로 만들어 그 안에 사람이 들어앉고 앞뒤에서 사람이 메고 가는 탈 것, (㉥ 가마타고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 · 가마솥 : 아주 크고 우묵한 솥 (㉥ 어릴 땐 가마솥에 소죽 쑤는 것이 아이들 일이었다.) · 까마귀 : ⓵ 까마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첫째 날 마음 닦으면 참말로 슬기 생기고 마음 닦지 않으면 슬기 시들어 얻고 잃는 이 두 길 알아 슬기 생기도록 스스로 살리 요가 웨 자야띠 부우리 아요가 부우리 상카요 에땀드웨다 파탐 나트와 바와야 비바와야 짜 따타 타남 니붸세야 야타 부우리 파와다티 참글귀 v. 282 우리는 마음 닦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열흘닦기를 오롯이 마치려고 마음 다지고 집과 일과 딸린 밥솔을 떠나 붓다처럼 마음닦아 깨달음을 이루려고 여기 왔습니다. 열흘 닦기에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나날이 눈 깜짝할 사이마다 부지런히, 끈질기게 마음 닦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앉고 나서 하는 이 참말은 이 마음닦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마음 닦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부지런히 마음 닦더라도 어떻게 닦는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마음닦기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얻기 어렵겠지요. 그러므로 저녁 참말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르게 마음 닦으십시오. 우리는 나들숨을 알아차림으로써 마음닦기 첫발을 내디뎠지만 이건 숨고르기가 아닙니다. 숨을 다스리거나 고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쉬어지는 대로 내버려두고, 숨이 깊으면 깊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길면 긴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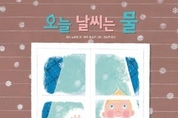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푸른그림책 - 물을 마시며 물이 됩니다 《오늘 날씨는 물》 오치 노리코 글 메구 호소키 그림 김소연 옮김 천개의바람 2020.1.20. 사랑스러운 말을 듣는 사람은 사랑이 말에 깃들면 어떠한 숨결이 되는가를 느끼고 맞아들여서 배우고 삶으로 누립니다. 미워하거나 따돌리거나 괴롭히거나 짓밟거나 억누르는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몸짓에 고스란히 묻어난 말을 들을 적에 어떠한 마음이 되는가를 느끼면서 이러한 삶을 맛봅니다. 바람이 매캐한 곳에서는 숨쉬기 어렵습니다. 바람이 맑은 곳에서는 숨쉬기 좋습니다. 바람이 매캐한 서울 한복판이라든지 핵발전소나 제철소 곁에서 숨을 제대로 쉴 만할까요? 숲 한복판이나 바닷가에서는 누구라도 가슴을 펴고 두 팔을 벌려 온몸으로 한껏 숨을 마실 만합니다. 찬이는 밖으로 뛰어나가 손바닥에 눈을 받았습니다. 그 손바닥에서 “찬이야, 찬이야.” 하는 목소리가 났어요. (6쪽) 그리 멀잖은 지난날에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손수 흙에 심고서 가꾸고 거두고 손질한 남새나 열매로 밥을 차려서 함께 누렸습니다. 이때에는 일본 한자말 ‘유기농·자연농·친환경’ 같은 이름이 없었으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숲결을 그대로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 찰콩 : 밭에 심어 가꾸는 덩굴이 뻗는 콩, 밥에 넣거나 다른 먹거리로 쓰인다. (← 완두) (㉥ 곱단이는 찰콩 넣은 밥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 찰것 : 귀거리, 목거리, 반지 같이 몸에 차는 보배로운 것. (← 패물) (㉥ 몸에 반지나 귀거리 같은 찰것을 찬다는 건 아직 좀,,,) · 치(=티) : 물고기를 뜻하는 우리말 씨끝 (㉥ 가물치, 멸치, 삼치, 준치, 갈치, 여흘치) · 여흘치(= 쥐노래미) : 쥐노래밋과에 딸린 바다 물고기, 쥐노래밋과에는 쥐노래미, 줄노래미, 노래미, 이민수가 있다. (㉥ 여흘치 구이는 적쇠에 얹어 숯불에 구워야 제 맛이지.) · 여흘여흘 : 냇물이나 개울물이 콸콸 흐르는 꼴 (㉥ 푸른누리 앞냇물은 비라도 좀 오면 여흘여흘 흘러가요.) · 더뎅이 : 부스럼 딱지, 또는 때 같은 것이 거듭 붙어 된 조각, 준말; 더데 (㉥ 무릎 다친 데에 더뎅이가 앉았다.) · 도리 : 서까래를 받치려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놓는 나무 (㉥ 도리에 서까래를 얹다.) · 거푸집 : 쇳물을 부어 만드는 몬 바탕으로 쓰이는 틀 (← 형) (㉥ 녹인 쇳물을 거푸집에 붓다.) · 닻 : 배를 멈춰 서 있게 줄에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한겨레 우리말’은 우리가 늘 쓰면서 막상 제대로 헤아리지 않거나 못하는 말밑을 찬찬히 읽어내면서, 한결 즐거이 말빛을 가꾸도록 북돋우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 말밑을 우리 삶터에서 찾아내어 함께 빛내려는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우리말 ― 이야기, 잇고 잇는 마음 동무하고 말이 안 맞아서 부아가 난 적 있지 않나요? 동생이나 언니하고 말다툼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어머니나 아버지하고도, 배움터에서 여러 길잡이하고도 자꾸자꾸 말이 어긋나서 뾰로통한 적이 으레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말하고 저쪽에서 하는 말은 왜 안 맞거나 어긋날까요? 싫거나 짜증난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듣지는 않았을까요? 저쪽에서 말을 못 알아차리지 않았나요? 어쩌면 둘 다 서로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새 어른들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통’은 한자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한자말 ‘의사’를 붙여 ‘의사소통’처럼 쓰기도 해요. 이런 말씨를 어린이가 얼마나 알아듣기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른이란 몸입니다만, 저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저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