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적' 없애야 말 된다 10 도식적 도식적으로 나타내다 → 그림으로 나타내다 / 얼거리로 나타내다 도식적인 사고 → 뻔한 생각 / 틀박이넋 도식적 표현에 불과하다 → 따분한 말일 뿐이다 / 싱거운 말일 뿐이다 도식적 수법이다 → 낡은 길이다 / 닳아빠진 틀이다 도식적 입장으로는 → 짜맞추어서는 / 끼워맞춰서는 / 꿰맞춰서는 ‘도식적(圖式的)’은 “1.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나타낸 그림이나 양식 같은 것 2. 사물의 본질이나 구체적인 특성을 밝히기 위한 창조적 태도 없이,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기계적으로 맞추려는 경향 같은 것 = 도식주의적 3.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나타낸 그림이나 양식 같은 4. 사물의 본질이나 구체적인 특성을 밝히기 위한 창조적 태도 없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의' 안 써야 우리 말이 깨끗하다 5 : 개의 개의 털을 쓰다듬다 → 개털을 쓰다듬다 개의 이름을 짓는다 → 개 이름을 짓는다 ‘개 + -의’ 얼개라면 ‘-의’를 털어냅니다. 또는 ‘-는·-가’나 ‘-를’이나 ‘-한테’ 같은 토씨로 고쳐씁니다. ㅅㄴㄹ 개의 경우는 커다란 제스처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다 → 개는 커다란 몸짓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도 좋다 → 개를 다룰 때에는 머리를 크게 쓰다듬어도 좋다 → 개한테는 머리를 크게 쓰다듬어도 좋다 《동물과의 대화》(增井光子/미승우 옮김, 언어문화사, 1976) 135쪽 그 개의 문제는 눈이 멀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 그 개는 눈이 멀어서 말썽이지 않고 → 그 개는 눈이 멀어서 안 좋지 않고 《나쁜 소년이 서 있다》(허연,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19 자녀 子女 친구 자녀 데려다가 두고서는 → 동무 아이 데려다가 두고서는 자녀 간에 하나도 없다고 → 딸아들 새에 하나도 없다고 슬하에 자녀는 몇이나 두었소 → 곁에 아들딸은 몇이나 두었소 ‘자녀(子女)’는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나 ‘애·아이들’이나 ‘딸아들·아들딸’로 고쳐씁니다. 이밖에 낱말책에 한자말 ‘자녀(姿女/恣女)’를 “행실이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로 풀이하면서 싣는데 털어냅니다. ㅅㄴㄹ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 아이들한테 나쁜 말을 흔히 쓰기 때문에 → 아이한테 안 좋은 말을 자꾸 쓰기에 → 아이가 듣기에 나쁠 말을 흔히 쓰기에 → 아이들한테 안 좋을 말을 자꾸 쓰니 《국경 없는 마을》(박채란,…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홀로보기 -제주도에서 6 두 사람 가파도를 돌다가 배 타는 때에 쫓겨 뛰어갔다. 어디서 날선 소리가 들린다.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놀라 두리번거리니, 어느 커피집 앞에 아저씨가 한 사람 있다. 아저씨는 무얼 그냥 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다가가 돈을 꺼내려 하고, 옆에서 아주머니 한 사람이 날선 소리를 지른다. 날선 소리는 마치 아이를 꾸지람하는 듯하다. 아무 데서나 아무것이나 사다 먹으려 한다고 매우 다그치는 소리이다. 배 타는 때에 맞추려고 뛰면서도 이 툭탁소리를 들었다. 바쁜 틈인데 또렷이 들릴 만큼 날선 소리가 작은 섬에 쩌렁쩌렁 울린다. 아저씨는 처음부터 조용히 돈을 꺼내서 값을 치르면서 사면 되었을 텐데. 아주머니는 조용하고 깨끗한 섬마을에 나들이를 온 길이니 느긋하게 봐주어도 될 텐데. 제주에 와서 본 다른 두 사람하고 바로 겹친다. 다른 두 사람 가운데 아저씨는 귀가 먹어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고 했다. 큰소리로 말을 해주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소리도 못 지르고 질질 끌고 다녀야 한다더라.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 사이는 따뜻해 보였다. 아저씨가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데도 사근사근 얘기하고 다니더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2] 종량제봉투 가게 일손이 모자라 일꾼을 쓴다. 오늘 아침에 가게일을 돕는 일꾼을 보니, 종량제봉투 값을 찍어 놓지 않는다. 아침 일꾼한테 “손님들 물건을 담을 적에 무얼 먼저 찍어?” 물었더니 “봉투 먼저 찍고 담는다” 한다. “모두가 파는 물건이니 비닐 하나라도 잘 찍어서 담고, 손님 오면 매장 어느 쪽으로 다니는지 잘 보셔요” 했다. “왜요?” 하고 되묻기에, “종량제봉투 숫자가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종량제봉투가 왜요?” 하고 또 묻기에 “빈다”고 말했다. 손님이 전자담배 한 갑을 다른 담배로 바꾼다. 가만히 보니 카드를 취소하고 다시 찍는다. 나는 “카드 취소는 어지간해서 하지 말고 반품키를 누르고 받아야 할 담배를 찍고 다시 반품키 눌러 판매창이 뜨면 바꿔 갈 담배를 찍으면 같은 금액도 0이 되어 현금에 지장 없고 재고를 찾아 간다”고 일려준다. 그런데 아침 일꾼은 이녘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저처럼 해도 된다고 우긴다. 아침 일꾼이 물건을 찍었다가 취소하거나 그냥 갖고 가는 모습을 곧잘 보았다. 가게일을 돕는 사람은 일한 삯을 받는 사람이지, 우리 가게 살림을 몰래 가져가도 되거나 그냥 가져가도 되는…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1] 긴 길 사람을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다. 막상 자리를 마련하면 낯선 내가 툭 튀어나온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말이 많다. 알맹이가 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그러고서는 말을 너무 했다고 여긴다. 잔뜩 핏대를 올리다 보면 말이 풀어지고 사투리가 술술 나온다. 이럴 적에 곁님은 “쓸데없이 말이 많다”고 넌지시 나무란다. 그런데 곁님이 나더러 말이 쓸데없이 많다고 하면 왜 그리도 듣기 싫은지 몰라, 그저 입을 굳게 다문다. 이러다가 혼자 차를 몰 때에는 따로 말할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차분하고 고요하다. 어떤 모습이 나일까. 그렇지만 차분하고 고요히 혼자 차를 몰기도 오래가지 않는다. 또 수다를 떨고 싶다. 대구 시내에서 사니, 머리 위로는 지상열차가 달리고 둘레는 차가 가득하다. 버스로 세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이어도 참으로 길다. 어떤 날은 이 짧은 길을 가슴이 두근거리며 달리다가, 어느 하루는 길디길어 티끌 같은 마음인 채 달린다. 그리 길지 않은 이동안에라도말을 아껴야지 싶은데, 생각보다 어렵다. 내 이야기를 가만가만 들어 주던 언니가 전주에 갔다. 하루를 못 보는데 또 허전해서 수다를 받아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틀어지다 저는 길을 곧잘 헤맵니다. 인천에서 살던 어릴 적에는 모든 골목을 샅샅이 보면서 길을 안 헤매려 했다면, 인천에서 큰아이를 낳아 함께 골목마실을 할 적에는 스스로 골목사람이면서 이웃마을로 나그네처럼 찾아가 가만히 맴돌며 바람꽃으로 지내었습니다. 시골로 옮겨 작은아이를 낳아 살아가는 사이에 이제는 숲길이나 들길을 마음대로 누비는 바람새처럼 살아갑니다. 어느 분은 “참 우습네. 다들 바쁘게 사는데, 천천히 걸어다니는 이녁은 터무니없네.” 하고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말꽃(국어사전)이란 책을 쓰며 새벽이랑 밤에 허벌나게 일하는 터라, 일손을 쉴 적에는 모든 덩굴을 내려놓고서 뜬금없이 걷고 바다를 품고 골짜기를 안는 느슨한 해바라기를 누리려 합니다. 서울에서 별바라기를 하자면 잠꼬대일 테지만, 시골에서 별바라기에 꽃바라기를 하는 길은 삶을 사랑하는 오늘빛이지 싶어요. 어느 일이건 마구 붙잡으려 하면 틀어집니다. 왜 어긋날까요. 꾸미려 들기에 엉키고,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숨길 몸흐름을 살피지 않으면 몸이 지칩니다. 숨결을 헤아리지 않으면 하루가 고단합니다. 무턱대고 나선다면 그만 나가떨어져요. 우리 삶을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삶결을 차근차근 다독일 노릇입니다. 억지로 하려니 힘이 들어 숨이 찹니다. 가만히 마주하면서 부드러이 달래기에 생각할 틈이 있고, 어떻게 할 적에 즐거우면서 아름다울 만한가 하고 실마리를 찾습니다. 서두르는 몸짓은 엉성한 몸차림으로 이어갑니다. 느긋한 매무새는 찬찬한 차림빛으로 피어납니다. 새랑 개구리랑 풀벌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나요? 우리 살림집 곁에는 어떤 살림소리가 흐르나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삶길을 사랑하나요? 마음을 기울여 생각을 가꾸기에 살림결을 매만집니다. 마음밭을 일구듯 소꿉밭을 돌봅니다. 마음빛을 밝혀 이웃하고 어울리듯 착하면서 참한 손빛으로 풀꽃나무를 쓰다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얽매이기 쉬워요. 속으로 드러내는 숨길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엄마아빠 3] 어머니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왔다. 먼저 온 곁님이 어머니한테 “어버이날 다 댕겨 갔니껴?” 묻는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솥을 열면서 “막내네 쌍둥이 많이 컸겠네” 물었다. 어머니가 벽을 한참 보더니 코를 훌쩍인다. 눈이 빨갛다. 막내네는 쌍둥이를 낳았다. 마흔 넘어서 짝을 만나 인공수정으로 아들 둘을 얻었다. 어머니는 어린이날에 두 손주 몫으로 십만 원을 보낸 일이 있다. 그러고 이틀 뒤 통장을 정리하고서야 막내가 돈을 부친 일을 알았단다. 돈을 보내놓고는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없더란다. 막내댁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인 막내도 똑같이 그런다고 섭섭하더란다. 어머니가 보낸 돈을 어버이날 도로 보낸 듯해서 언짢았단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잘 우네. 어머니는 어버이날 돈을 받고 싶어서 보내지 않았다. 어버이날 ‘엄마 잘 있나?’ 전화 한 통 받고 싶은 마음뿐이란다. 다섯 가운데 가장 마음 쏟았던 막내는 장가가더니 어쩐지 어깨를 펴지 못하는지, 아이들 돌보느라 뒷전인지는 몰라도 목소리를 듣기도 힘들어 서운한가 보다. 그리고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섭섭한 일이 뭔가 있다고 느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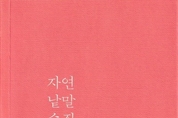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숲책 푸른책 읽기 22 《자연 낱말 수집》 노인향 자연과생태 2022.4.21. 《자연 낱말 수집》(노인향, 자연과생태, 2022)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저는 영어 ‘내추럴’도 한자말 ‘자연’도 아닌, 우리말 ‘숲’을 말하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안 태어났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안 태어났거든요. 그저 이 나라 조그마한 골목마을에서 조그맣게 태어나서 살았기에 조그마한 아이로서 둘레를 품을 풀빛이고 꽃빛이고 나무빛이 어우러진 숲빛인 말을 살핍니다. 어릴 적에 날개꽃(우표)을 곧잘 모았습니다. 여덟아홉 살 어린이가 “날개꽃 모으기”를 한다고 말하면, 그무렵에는 아직 ‘날개꽃’이란 말을 몰라 “우표 모으기”라 말했습니다만, 둘레 어른들은 ‘고상한 한자말’을 끼워넣어 “우표 수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모으기에 ‘모음·모으기’인데 예나 이제나 숱한 어른들은 우리말을 쓰기보다는 ‘수집’이나 ‘-집(集)’이란 일본스런 한자말씨에 스스로 갇힌다고 느껴요.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 눈길을 틔워 우리 나름대로 우리 보금자리를 푸르게 사랑하는 살림길을 펴는 숲말을 헤아리면 스스로 즐겁고 아름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