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숲노래 우리말 말 좀 생각합시다 29 푸르다 지난날에는 어디나 모두 푸른 터전이었어요. 뚝딱터(공장)나 큰고장(도시)이 따로 없던 무렵에는 쓰레기도 딱히 없었기에 어디에서나 맑고 밝게 물하고 바람이 흘렀어요. 누구나 물하고 바람을 싱그러이 마시며 살았어요. 지난날에는 ‘친환경’이나 ‘환경친화’를 딱히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맑거나 정갈한 터전을 그리면서 ‘녹색(綠色)’이라든지 ‘초록(草綠)’이라든지 ‘그린(green)’을 이야기하는 분이 늘어납니다. 모임(단체·정당)이나 배움터에서 이런 이름을 쓰지요. 그런데 우리말 ‘푸른’을 쓰면 될 노릇일 텐데 싶어요. ‘친환경 제품’이라면 ‘푸른것·푸른살림’이라 하면 어울립니다. ‘맑푸르다’ 같은 낱말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맑은것·맑은살림’ 같은 이름을 쓸 수 있고, ‘맑은물·맑은바람’이나 ‘푸른물·푸른바람’ 같은 이름을 쓸 만해요. ‘파란하늘·파란바람’은 하늘빛을 가리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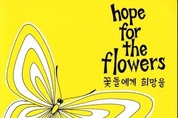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김명우 옮김 분도출판사 1975.1.1. 꽃이 꽃으로 피려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오르고 잎이 돋기도 해야 하지만,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별이 돋기도 해야 합니다. 흙은 까무잡잡하면서 구수해야 하지요. 풀벌레가 꽃가루받이를 해주어 씨앗을 맺어 주어야 해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꽃입니다. 얼핏 보면 애벌레가 잎을 갉작갉작하느라 구멍이 송송 난다지만, 애벌레는 풀잎을 조금 나눠먹고는 꽃가루받이란 즐거운 일을 맡으면서 새한테 먹이가 되어 들숲마을에 노랫소리가 울려퍼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애벌레는 나비로 깨어나니, 풀벌레랑 나란히 꽃가루받이를 나누고, 사람들한테 나풀나풀 눈부신 무늬를 알려줘요. 《꽃들에게 희망을》은 “꽃한테 바람을” 속삭이는 애벌레·풀벌레·나비 한살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풀밥살림을 잇던 벌레는 어느 날 꿈을 그리면서 밥을 끊고서 “고요한 어둠”인 ‘고치’에 깃들어요. 이러고서 긴긴날 가만히 꿈누리를 품더니, 옛몸을 사르르 녹여서 “파란 하늘빛”으로 피어날 ‘날개’로 거듭납니다. 사람한테는 어떤 바람이 흐를까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어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 : 얄궂은 말씨 손질하기 16 ㄱ. 일타강사 일타강사(一star講師) : 학원 등에서 가장 인기가 많거나 수강신청이 첫 번째로 마감되는 인기 강사를 말한다 강사(講師) 1.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 사람. 시간 강사와 전임 강사가 있다 2. 모임에서 강의를 맡은 사람 3. [불교] 강당에서 경론을 강의하는 승려 누구보다 잘 이끌면 ‘으뜸길잡이’입니다. 한자 ‘일(一)’에 영어 ‘스타(star)’를 더한 ‘일타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지었을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퍼뜨린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꼭두길님’이나 ‘으뜸길님’이기를 바랍니다. ‘첫별’이나 ‘샛별’이기를 바라요. ‘별님·별잡이’나 ‘꽃님·꽃잡이·꽃길님·꽃길잡이’로서 아름다이 가르치거나 이끌기를 바랍니다. ㅅㄴㄹ 일타강사가 이 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 → 으뜸길잡이가 이 책을 읽어 주었다 → 꼭두길잡이가 이 책을 읽어 주었다 《숲속책방 천일야화》(백창화, 남해의봄날, 2021) 187쪽 ㄴ. 우울증 압도적 자기혐오 비판 동반 우울(憂鬱) : 1.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2. [심리]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 : 얄궂은 말씨 손질하기 15 ㄱ. 개성적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작품(作品) : 1. 만든 물품 2.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 3. 꾸며서 만든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성적(個性的) :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발하다(發-) : 1. 꽃 따위가 피다 2. 빛, 소리, 냄새, 열, 기운, 감정 따위가 일어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3.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펴서 알리다 4. 군대 따위를 일으켜 움직이다 각각(各各) : 1.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 2.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마다 생명(生命) : 1.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2. 여자의 자궁 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 3. 동물과 식물의, 생물로서 살아 있게 하는 힘 4. 사물이 유지되는 일정한 기간 5.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덕분(德分) :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 ≒ 덕(德)·덕윤·덕택 지어서 선보입니다. 글이며 그림을 짓고, 살림을 짓습니다. 다 다르기에 ‘다르다’고 합니다. ‘남다르다’고도 하지요. 빛은 ‘나다·내다’로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의' 안 써야 우리 말이 깨끗하다 만의 (萬/만의 하나·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남는다면 → 그럴 일은 없겠지만 틈이 난다면 만의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 어쩌다가 자빠진다면 / 자칫 넘어진다면 만의 하나라는 각오로 임한다 → 모른다는 다짐으로 한다 ‘만(萬)’은 “천의 열 배가 되는 수. 또는 그런 수의”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만의 하나·만에 하나”라는 말씨로 “아주 드묾”을 나타낸다지요. 이 말씨는 ‘드물다·뜸하다’나 ‘적다·보기 어려다·거의 없다’로 손볼 만합니다. ‘어쩌다·문득·비록·모르다’나 ‘설마·자칫·설핏·얼핏’으로 손보고, ‘아니면·아니라면·아뿔싸’로 손보며, ‘하나라도·조금이라도’나 ‘그러나·그런데·그렇지만’으로 손보면 되어요. ㅅㄴㄹ 만의 하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처리 處理 행정 처리 → 나랏일 사고 처리 비용 → 말썽을 치우는 값 처리 속도가 빨랐다 → 빠르게 움직였다 / 빠르게 해낸다 실종으로 처리되었다 → 사라졌다고 여긴다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얼른 치워야 합니다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다 → 구정물 거름터를 놓다 방수 처리가 허술한 → 물막음이 허술한 불에 타지 않게 처리된 벽지 → 불에 타지 않게 한 담종이 물이 새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처리(處理)’는 “1.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지음 2.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작용을 일으킴”을 가리킨다고 합니다만, ‘다루다·다스리다’나 ‘가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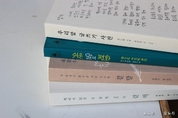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꽃 말꽃삶 5 첫밗 첫꽃 첫씨 첫발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은 우리글·한글을 찬찬히 익힐 노릇입니다. 우리글·한글을 찬찬히 익히지 않는다면 글쓰기를 하더라도 ‘글’이라 할 만한 글을 못 여미게 마련입니다.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말·한말을 천천히 배울 노릇입니다. 우리말·한말을 천천히 배우지 않는다면 제 뜻이며 생각이며 마음을 알맞게 펴는 길하고 동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글·한글은 모든 소리를 담습니다. 소릿값(발음기호)으로 삼아도 넉넉할 만큼 훌륭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웃글(이웃나라 글)도 그 나라 사람들 나름대로 온갖 소리를 담아요. 모든 글은 그 글을 쓰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는 소릿결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커버 カバ- 영어 ‘cover’를 ‘커버’로 적으면 ‘한글’로 적는 셈이지만, ‘한말·우리말’은 아닙니다. 이웃나라가 ‘カバ-’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カバ-’가 ‘일본말’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저 영어 ‘cover’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글일 뿐입니다. 겉·껍데기 마개·덮개·뚜껑·가리개·씌우개 막다·덮다·가리다·씌우다 소리가 나는 대로 적을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섬찟 잘 안 되는구나 싶어 고단할 때가 있다면, 잘 되는구나 싶으나 고달픈 때가 있습니다. 한여름이라 더워서 힘들다고 할 만하다면, 한겨울이라 추우니 괴롭다고 할 만합니다. 아이들하고 한여름 뙤약볕을 받으며 걷다가 속삭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우면 한여름이어도 춥단다. 우리 마음이 모든 열매를 무르익도록 북돋우는 해님을 품는 따사로운 빛이라면, 이 여름은 너무 더워 버거운 하루가 아닌, 알맞게 자라고 싱그럽게 바람이 찾아드는 길이야.” 누가 억누르기에 들볶이기도 하지만, 따로 짓누르거나 밟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늘 마음에 따라 다른 하루라고 느껴요. 그놈들 등쌀에 애먹을까요? 저놈들 서슬에 소름이 돋나요? 이놈들 무쇠낯 탓에 섬찟하면서 벅찬 나날인가요? 못된 녀석을 굳이 봐주어야 하지는 않아요. 다만, 모질고 맵찬 녀석이 아닌, 우리랑 그들을 잇는 길에 드리우는 빛줄기를 보기를 바라요. 해는 누구한테나 비추어요.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어정쩡하다 말로 풀면 아름답습니다. 치고받는 주먹다짐이 아닌, 부드러이 이야기하면서 응어리를 풀기에 어깨동무하는 길을 열 만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면 고단해요. 입만 살아서 번드르르 지껄인다면 지쳐요. 우리 삶은 틀림없이 말 한 마디가 씨앗이 되어 자라납니다만, 입으로 읊기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으며 사랑이 없는 엉성한 말씨로는 삶을 낳지 않아요. 흙한테 안긴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가만히 지켜봐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틈을 내어 풀씨랑 꽃씨랑 나무씨를 살펴봐요. 설익은 씨앗은 싹트지 않아요. 어정쩡해서는 움틀 수 없어요. 어영부영한다면 피어나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은 삶하고 멀어요. 장난말은 놀림말로 흐르고, 놀림말은 이웃을 누릅니다. 혼자만 재미있다면 이웃은 재미없겠지요. 놀림길 아닌 놀이로 나아가야 비로소 말꽃이 되고 웃음글로 이으며 익살스러운 이야기로 피어요. 숱한 사람들이 잿빛터에 모여서 잿빛집에 웅크리는 오늘날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에서 짓는 글살림”은 숲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골자락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을 짓는 길에 새롭게 맞아들여 누리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숲에서 짓는 글살림 34. 타다 몇 살 적 일인지 떠오르지 않지만 꽤 어릴 적이었습니다. 한창 부엌일로 바쁜 어머니가 저를 부릅니다. 두 손 가득 반죽이 묻은 어머니는 입으로 저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밀가루 좀 가져와.” 어머니 말대로 밀가루 담긴 자루를 찾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한 마디 보탭니다. “새것 타지 말고, 쓰던 것 옆에 있어.” 우리는 입으로 말할 적에 임자말을 으레 건너뛰고, 꾸밈말도 잘 안 넣게 마련입니다. 글로만 적어 놓는다면 “새것 타지 말고 쓰던 것 옆에 있어”라 할 적에, 사이에 쉼표조차 안 넣으면 도무지 뭔 소리인가 알쏭달쏭할 만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할 적에는 높낮이랑 밀고당기기를 하면서 소리를 내니, 이 말을 곧장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킨다면서 살짝 곁들인 한 마디 ‘타다’는 아마 그때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낱말 쓰임새였을 테지만,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타다 1 ← 화재, 연소, 소각, 전소, 발화, 변하다,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