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9. 힘싸움 힘은 힘으로 막힌다. 힘으로 싸우려 들어서 이기거나 꺾으면, 다른 힘이 몰려들어 눌리거나 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둘레에서는 ‘힘겨룸’에 ‘힘다툼’에 ‘힘싸움’이 판친다. 사랑이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드니 겨루거나 다투거나 싸운다. 사랑은 모두 아우르고 녹인다. ‘사랑싸움’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틀린 말씨이다. ‘짝싸움·짝꿍싸움’은 있지만, 사랑은 싸움을 녹여내는 길이니 ‘사랑싸움’이란 있을 수 없다. 힘싸움 (힘 + 싸우다 + ㅁ) : 힘을 내세우거나 앞세우거나 보여주면서 싸우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밀어붙이기. (= 힘다툼. ← 기싸움, 백병전, 실력행사, 무력행사, 파워게임, 패권 경쟁, 경쟁) 10. 퀭하다 퀴퀴할 만큼이라면 가까이하기 어렵도록 고약하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다. 케케묵다(켸켸묵다)는 그야말로 오래되고 낡아서 이제는 썩어 흙으로 돌아갈 때라는 뜻이다. 흙으로 돌아가면 퀴퀴한 냄새도 케케묵은 빛도 사라지면서 까무잡잡한 숲흙으로 바뀐다. 걱정이 가득하고 잠을 못 이루면 눈밑이 시커멓게 ‘퀭한’ 눈망울이 된다. ‘퀭눈’이다. 퀭하다 : 1. 눈이 쑥…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겨냥 길을 걸을 적에는 앞을 봅니다. 옆이나 뒤를 쳐다보다가는 넘어지거나 부딪히겠지요. 어느 곳으로 나아가든 가는길을 살핍니다. 남을 앞세우거나 내세우기보다는 스스로 씩씩하게 갑니다. 이름나거나 훌륭한 남이 앞에서 봐주면 한결 나을는지 모르나, 낯선 곳에 서더라도 스스로 길그림을 어림하면서 차근차근 걸어요. 눈치를 안 봅니다. 꿈그림을 봅니다. 두리번거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으려는 할거리를 생각합니다. 어정쩡하게 딴청을 하다가는 과녁을 놓쳐요. 갈곳을 또렷이 헤아리면서 겨냥해야지요. 무엇을 꼭 이루겠다고 노리지 않아요. 한 걸음씩 디디려는 바람입니다. 꿈을 사뿐히 얹은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서 갑니다. 숨을 쉬건 밥을 먹건 잠이 들건 언제나 우리 스스로 해요. 작거나 크거나 괴롭거나 반가운 일도 스스로 맞이합니다. 삶길이란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입니다. 멋스러운 삶이 아니어도 되어요. 뜻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면 넉넉합니다. 곁에 다짐말 한 마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햇내기 처음 해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걸음이라 풋풋하고, 햇병아리라서 새가슴이라지만, 낯설어도 조그맣게 발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어린이라서 안 된다면, 설익어도 못 한다면, 너무 딱딱해요. 코흘리개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직 철없거나 모자라다지만, 수수하게 짓는 멋으로 차근차근 나아갑니다. 둘레에서 쪼다라 놀리기도 하고 얼치기라고 손가락질을 하는군요. 이럴 적에는 “짧아서 잘못했습니다. 아직 새까맣거든요. 어리버리한 저를 즐거우면서 상냥하게 가르쳐 주셔요.”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누구나 새내기예요. 누구라도 아이라는 숨빛을 품습니다. 오래오래 섣부를 수 있어요. 한참 해보았어도 엉성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해바라기를 하는 햇내기처럼 오늘을 가꿉니다. 남들이 바보라고 비웃거나 멍청하다고 나무라도 빙그레 웃으면서 “모르니까 배우면서 일어서려고요.” 하고 여쭙니다. 투박하게 걷습니다. 좀 어정쩡한 걸음새여도 척척 내딛습니다. 낯선 길을 마다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65] 동백 들이다 먼저 일 나가는 곁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하회에 언제 갈려노. 의성도 들르고 오자.” “아, 난 주말에는 바람 쐬고 싶은데.” “참, 동백을 찾아보니 네 군데 있더라. 니 말대로 부산에 동백섬도 있대. 주말에 통영 장사도에 갈래?” 며칠 흐름이 깨지니 몸이 쑤신다. 머리도 한몫 거든다. 깡통이 머리에 든 듯하다. 설날에 읽으려고 꺼낸 책을 펼치니 안 읽힌다. 설날이면 보던 우리 소설이 생각났다. 꾸러미로 들인 책을 훑다가 다른 책을 펼친다. 어제는 제법 읽히더니, 책을 읽다가 동백이 언제쯤 꽃이 활짝 피려나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러다가 벌떡 일어난다. 동백을 안 보고는 못 견딜 듯하다. 요즘 몸이 자주 발끈하네. 해가 더 저물 텐데 꽃집으로 가자고 안달이다. 모자를 꾹 눌러쓰고 차를 몰았다. 밖은 추워도 차에서는 따뜻하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좋다. 자리를 뜨끈뜨끈 데운다. 꽃집 앞에 선다. 꽃집은 날이 추우니 꼭꼭 닫아건다. 쉬는날 같지만 웅크릴 뿐이다. 한 집 한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 동백이 한두 포기뿐이네. 어떤 집은 복숭아빛이 도는 서양동백이네. 이 아이는 삼색동백이네. 아,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64] 헌책으로 누리책집에서 내 시집을 뒤져 보았다. 새책 곁에 헌책이 나란히 뜬다. “이건 뭐지? 아, 벌써 헌책으로 나왔네! 이 일을 어째! 아직 시집을 낸 지 한 해조차 안 지났는데?” 갑자기 낯이 뜨겁다.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숨을 돌리고서 생각한다. 아니, 나도 헌책을 곧잘 사는데, 왜 내가 내 시집이 헌책으로 나왔다고 해서 낯이 뜨거워야 할까? 내가 쓴 시집이 헌책으로 나왔다면, 누가 틀림없이 읽었다는 뜻이다. 그분이 샀든 누구한테서 받았든. 그렇지만, 지난해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샀다. 여태 다른 사람들 책을 새책으로도 헌책으로도 사면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다. 새책은 새책대로 헌책은 헌책대로 그저 읽어 왔다. 그런데 나는 왜 새해 첫머리부터 헌책 하나를 놓고서 무슨 큰일이 났다고 여기는가. 헌책을 사서 읽어 보면 알 텐데, 기쁘게 사서 곱게 건사했다가 내놓는 헌책이 있고, 재미없거나 값없다고 여겨 버리는 헌책이 있다. 잘 읽어 준 분 손길을 탄 헌책은 이름대로 ‘헌’ 책이어도 깨끗하고, 손빛이 곱게 묻어난다. 사랑을 못 받고 버림받아 ‘낡은’ 책은 갓 나온 뒤에 헌책으로 나왔어도 어쩐지 꾸깃꾸깃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딸한테 10 ― 수밭고개 2 거미줄에 걸린 참새를 본다 거꾸로 매달렸다 벌써 숨을 거두었을까 조용히 한 발짝 다가선다 가늘게 눈을 깜빡인다 아, 살았구나 살살 거미줄을 끊는다 바닥에 내려놓는다 파닥파닥 곤두박을 치고 쉬잖고 날갯짓을 한다 푸득 하늘로 날아간다 어느새 멀리 사라진다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67] 액시야 아침에 늦잠을 잤다. 시계를 보다가 쪽글을 본다. 눈도 떨어지지 않는다. “액시야 힘내라.” “그래. 고마워. 오늘 늦잠 잤네. 그제 제사 지내고 어제 몸살 했더니, 눈 뜨니 8시다. 아, 늦었뿟다.” “약 먹어라, 그냥 있지 말고. 우리 어제 영덕에 바다낚시 하러 왔다. 1박2일 하고 식당에 밥먹으러 왔다.” “우와 좋으네. 재밌게 놀고 맛난 거 먹고 겨울바다 잔뜩 보고 와.” “그래. 재밌다. 고기도 많이 잡았다.” ‘액시야’를 모처럼 들어 본다. ‘액시’는 경북 의성에서 시누이를 부르는 말이다. 내겐 언니인데 나는 말을 놓는다. 액시라고 부르는 언니는 나와 초등학교를 같이 나왔다. 다 어려울 적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웠다. 반 아이들이 도시락을 한 숟가락씩 담아 나누어 주었다. 이때는 내가 작기도 했지만, 언니는 또래보다 키도 크고 얼굴이 참 예뻤다.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사촌 오빠와 사귀더니 오빠가 졸업하자 바로 살림을 차리고 애를 낳았다. 어떤 때는 언니라고 부르지만 그냥 말 놓는다. 그 곱던 얼굴이 참 많이 바뀌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이 언니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살림이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은삶 66] 서울 가는 길 2022년 12월 첫머리에 《풀꽃나무하고 놀던 나날》을 내고서 처음으로 서울에 간다. 책수다를 열기로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며칠 끙끙했다. 몸은 나보다 더 떨었는지 밥숟가락도 잘 들지 못했다. 더군다나 몸살이 나서 나들이에 마음을 쓰지 못했다. 머리가 다 풀어진 줄도 모르고 이틀 앞두고 머리손질을 했다. 딸한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묻느라 지쳤다. 얌전한 차림새를 하려고 하다가, 하루를 버티려면 등산화를 신어야겠구나 싶고, 옷하고 신이 안 맞는 듯하고, 가방을 메고 낯선 서울을 다니기엔 거추장스러울 듯싶고, 두툼한 겉옷과 등산화를 신는다. 세 시간 미리 가서 마음 추스르면 한결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모 말에 서울이 춥다는데 너무 일찍 가서 떨면 어쩌나 한 시간만 늦추자고 차표를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대구서 서울 가는 표를 끊어야 하는데, 거꾸로 서울서 대구 오는 표를 살폈다. 마침 자리가 있어 표를 다시 끊었지만 까딱했으면 기차를 타고 들과 산에 쌓인 눈도 못 볼 뻔했다. 4호선을 타고 7호선을 갈아탄다. 갈아타는 곳을 헤매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쭙고 다시 내려와 푸른띠를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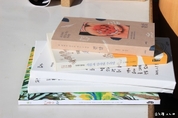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꽃 말꽃삶 6 자유 우리 낱말책은 우리말을 실었다기보다 일본말이나 중국말을 잔뜩 실었습니다. 이를테면 한자말 ‘자유’를 국립국어원 낱말책에서 뒤적이면 다섯 낱말을 싣습니다. 자유(子有) : [인명] ‘염구’의 자 자유(子游) : [인명] 중국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유학자(B.C.506∼B.C.445?) 자유(自由) : 1.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2. [법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3. [철학]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자유(自有) :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유(刺楡) : [식물] 느릅나뭇과의 낙엽 교목 첫 올림말로 삼은 “자유(子有) : [인명] ‘염구’의 자”인데, 더 뒤적이면 “염구(?求) : [인명] 중국 춘추 시대의 노나라 사람(?~?)”처럼 풀이합니다. 중국사람 이름 둘을 먼저 올림말로 삼아요. 참 엉터리입니다. 둘레에서 널리 쓰는 한자말 ‘자유’는 셋째에 나오며 ‘自 + 由’ 얼개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쓰는 낱말인 ‘자유’일 테지만, 일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에서 짓는 글살림”은 숲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골자락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을 짓는 길에 새롭게 맞아들여 누리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숲에서 짓는 글살림 35. 가시버시 제가 여덟아홉 살 무렵이던 어린 날은 1980년대 첫무렵입니다. 이즈음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남녀칠세부동석’ 같은 말을 읊던 분이 있었어요. 또래끼리 가시내이든 사내이든 섞여서 놀면 몹시 못마땅하다면서 서로 갈라야 한다고 나무라곤 했습니다. 가만 보니 할머니는 으레 할머니끼리만 어울리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끼리만 어울리더군요. 이런 흐름은 배움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여느 때에는 가시내랑 사내를 안 가리고 잘 놀다가도 ‘가시내 쪽’하고 ‘사내 자리’로 가르기 일쑤였어요. ‘여자 쪽’에서는 더러 ‘남녀’란 말이 안 내킨다고, ‘여남’이라 말해야 한다는 소리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보니 고개를 끄덕일 만해요. 여느 어른은 으레 ‘아들딸’이라고만 말합니다만, ‘딸아들’이라 말해도 되는데 말이지요. 딸아들 : x 아들딸 :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여남 : x 남녀(男女) : 남자와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쯤에서 국립국어원 낱말책을 뒤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