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홀로보기 -제주도에서 5 가파도 배를 타고 가파도에 갔다. 마라도 다음으로 남쪽 끝에 있는 섬이 가파도이다. 나는 숲을 가면 고도계를 보는 버릇이 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틈틈이 보는데 가파도 모습이 가오리를 닮았다. 납작한 가오리처럼 낮은 언덕이 없는 반반한 섬 같다. 들녘과 바다와 섬이 거의 하나를 이룬다. 내가 좋아하는 뒤뜰 동산 같다. 얼마 만인가. 길을 못 찾을까 마음이 쓰여 길잡이를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길잡이는 가파도 이름돌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멀뚱히 있다가 혼자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쪽으로 갔다. 섬이 통째로 어느 집 앞마당 같고 한 사람이 꾸며 놓은 듯 아기자기하다. 낮은 돌담에 길섶에 저절로 난 풀꽃나무가 싱그럽다. 한쪽 밭에서는 보리가 누렇게 익고 가을에나 봄직한 살살이꽃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알록달록하게 피었다. 너도나도 예쁘다며 사진으로 담는다. 나도 찍어 보지만 사진에 비치는 내 모습은 낯설기만 하다. 돌림앓이를 앓고 온 뒤라 기운이 없고 산을 좋아하는 터라, 이 반반한 길이 오히려 벅차다. 사람들이 꽃밭에서 사진 찍고 얘기할 적에 나는 마을길을 따라서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갔다. 길가에 핀 풀꽃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홀로보기 -제주도에서 3 달무리 자다가 추워서 눈을 뜬다. 넓은 창에 하늘이 꽉 찬다. 다시 눈감았다가 뜨니 달빛이 들어온다. 반달이 기둥에서 나왔다. 반달이 ‘왜 깼냐?’고 묻는 듯했다. 그러고서 달님은 달무리에 가려 자꾸만 바다로 떨어진다. 일어나 앉아서 달님한테 ‘더 놀다 가’ 하고 말했다. “너 왜 그리 어두워? 여행 노래 부르더니. 안 즐거워?” “아니, 기운이 없어서. 빵만 먹는 거 봤잖아. 사진 찍으니깐 얼굴 함 봐. 2키로 빠졌으니 어질해. 많이 아팠다” “한 달 전과 다르잖아?” “여행 가는 사람 같지 않아. 얼굴이 굳었어.” “내가 여기서 뭘 바랄까 하고 생각해 봤어.” 창밖으로 하늘을 보는지 바다를 보는지 잘 모르겠다. 달님보고 더 있어 달라고 했는데 더 빨리 사라지는 듯하다. 납작납작 구름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린다. 아까 붉은 노을이 머물던 구름이다. 달님은 바다로 안 빠진다. 이튿날 밤도 달님이 올 수 있겠다. 잠자리는 다르고 내가 있는 자리가 달라도 저 달님은 집에서 본 달처럼 같은 길로 지나간다. 내가 지내는 방도 노을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드리우고 달님은 지붕으로 지나간다. 그리운 것이 저 달님이던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 시간 時間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 빛그림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취침 시간 → 잘 때 / 잘 무렵 마감 시간 → 마감 / 마감때 약속 시간을 지키다 → 다짐한 때를 지키다 밥 먹을 시간 → 밥 먹을 겨를 / 밥 먹을 틈 / 밥 먹을 새 시간 날 때마다 → 틈날 때마다 / 짬날 때마다 수업 시간 → 배움밭 / 들을 때 회의 시간에 졸다 → 모임 때에 졸다 / 모임을 하며 졸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 때가 풀어 줄 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 때가 지나면 안다 ‘시간(時間)’은 “1.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2. = 시각(時刻) 3. 어떤 행동을 할 틈 4.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하여진 동안 5. 때의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홀로보기] 제주도에서 2 바닷가 걷기 이제 공항에 내린다. 내 이름을 적은 알림판을 찾아본다. 길잡이(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녁 손에 든 종이만 들여다볼 뿐 내가 알림판을 찾아야 하는 일은 모르는 척한다. 한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알림판이 보인다. 사람들이 많은 탓에 가려서 안 보인 듯하다. 큰 버스에 다섯 사람씩 세 무리를 태우고서 세 군데 숙소를 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린다. 그런데 내가 묵을 곳 가까이에는 식당이 안 보인다. 제주도로 나들이를 오기 앞서 며칠 앓느라, 비행기에서 내리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숙소에 닿자니 벌써 기운이 없는데, 밥 먹을 곳을 찾을 길이 없다. 하는 수 없이 편의점에 들러 죽 하나와 베지밀을 산다. 입맛이 없다. 창밖을 본다. 바다가 훤히 보인다.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바다를 보다가, 그냥 저녁을 굶더라도 좋으니, 꿈같아 보이는 바닷빛에 마음이 들뜬다. 어둡기 앞서 나가자. 오히려 속이 비면 더 가볍겠지. 곧게 난 길을 따라 바다로 간다. 길가이지만 이쪽으로는 자동차가 오가지 않는 듯하다. 돌담을 쌓고 나무를 심은 밭이 있고, 보리가 익은 밭이 넓다. 이 바닷가에서 해넘이를 보고 싶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들너울 바꾸려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로 가고, 바꾸려는 생각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삶터를 이루는 수수한 사람들이 더는 그대로 있지 못하겠다고 여기며 움직일 적에, 이 몸짓을 바라보는 우두머리는 예전에 ‘란(亂)’이란 한자로 가리켰습니다.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이웃나라가 총칼로 억누르던 무렵에는 일본사람이 ‘movement’란 영어를 옮긴 한자말 ‘운동(運動)’을 그냥 따라썼어요. 그러나 수수한 움직임은 ‘란’도 ‘운동’도 아니에요. 바다처럼 일렁이는 ‘물결’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물결’이라면, 이윽고 크게 일어나는 ‘너울’입니다. 살림너울이요 들너울입니다. 들꽃너울이자 들풀너울이에요. 촛불너울이고 시골너울입니다. 우리 겨레는 흰옷겨레라 하는데, 우두머리는 흰옷을 멀리했습니다. 이들은 빛깔옷이어야 잘나거나 높다고 여겼어요. 흰옷은 풀줄기한테서 얻은 실로 짠 천으로 지은 살림입니다. 하얀옷이란 풀옷이요, 하얀빛이란 풀빛인 셈입니다. 풀로 지은 옷이기에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홀로보기] 제주도에서 1 나들이 비행기 타는 일이 버스 타는 일처럼 흔한 요즘이라지만, 날마다 일하는 몸으로는 시외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하기조차 어려웠다. 제주도를 옆마을 가듯 나들이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만 듣다가, 나도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는 내가 여태껏 길에서 멀리 올려다보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구나. 땅도 집도 마을도 저렇게 깨알처럼 작게 보이다가 사라지는구나. 목이 돌아갈 만큼 창밖을 내다본다. 나는 창밖을 본다지만, 어쩌면 여태 잘 모르던 우주를 보는가 싶기도 하다. 아니,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고 둘러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집과 내가 일하는 곳은 더없이 작고, 지구라는 별이 새삼스럽구나 싶다. 하늘에서 본 멧줄기는 풀빛 종이를 구겼다 펼쳐놓은 모습 같다. 바다를 날아온 끝없는 물 그림자. 구름이 바다처럼 물결을 치니, 바다가 하늘에서 숨을 쉬는 입김 같다. 바다에서 올라와 언제까지나 하얗게 사라지지 않는 겨울얼음으로 새긴 들판 같다. 이 끝없이 보이는 우주를 비행기를 타고서 보지 않았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로서는 멧길을 오르며 훨씬 기쁘고 반가웠다. 작은 멧골이라도 한 발…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숲노래 말빛 오늘말. 시리다 봄가을이면 시골은 아침저녁으로 서늘합니다. 여름에는 선선하지요. 그렇지만 나무를 밀어내거나 풀밭을 잿빛(시멘트)으로 덮은 시골이라면 서울처럼 후끈하거나 끈적끈적해요. 상큼하면서 서늘한 새벽을 잃는 나라입니다. 새벽바람으로 일어나는 바지런한 새가 들려주는 노래를 잊는 나라예요. 새벽노래처럼 새벽마련을 하는 손길은 있으나, 새벽빛을 읽는 눈길은 사라져요. 새가 깃들지 못하는 터전이라면 사람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새가 노래하지 않는 마을이라면 사람 사이가 메마르거나 시려요. 끝없이 부릉부릉 내달리는 길에는 새도 사람도 쉬지 못합니다. 총칼을 앞세워야 나라를 지킨다고 여기는 나라에서는 한숨이 늘고 눈물앓이가 퍼져요. 이 푸른별에서 여태 어느 누구도 총칼로 이웃을 아끼거나 돌본 적이 없어요. 총칼은 늘 죽임짓이라는 안타깝고 안쓰러워 슬픈 이야기만 엮었습니다. 바보짓이 미어터지는 길은 이제 그쳐야지 싶어요. 응어리로 구슬픈 삶터가 아닌, 어깨동무로 싱그러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21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집밥》 김경희 스토리닷 2022.1.20.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집밥》(김경희, 스토리닷, 2022)은 ‘집밥’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집밥을 잘 차리거나 멋스러이 해내는 길을 다루지 않습니다. 집밥을 어떻게 맞이했고 받아들이면서 아이들하고 곁님한테 물려주는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순이돌이로 짝을 이룬 이웃님한테 마실을 갈 적에는 으레 그 집 살림을 들여다볼밖에 없는데, 참으로 숱한 돌이는 부엌일을 아예 안 하다시피 합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제법 있기에 어릴 적부터 부엌일을 안 해 버릇한 탓이라고 둘러댈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이웃 순이돌이는 하나같이 ‘생각이 좀 있다’거나 ‘책 좀 읽었다’는 분이거든요. 머리로는 ‘왼길’에 선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막상 두 손에 물을 안 묻히는 돌이가 수두룩합니다. 부엌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시골에서 살며 밭살림을 가꾼다면 밭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부엌일도 밭일도 ‘함께’ 해야 아름답습니다. 순이돌이가 나란히 하고, 아이어른이 같이 할 적에 사랑스럽습니다. 어버이로서 아이한테 물려줄 어깨동무(성평등·페미니즘)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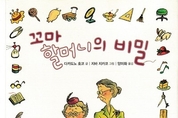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20 《꼬마 할머니의 비밀》 다카도노 호코 글 지바 지카코 그림 양미화 옮김 논장 2008.4.15. 《꼬마 할머니의 비밀》(다카도노 호코·지바 지카코/양미화 옮김, 논장, 2008)은 두 할머니가 어린이란 몸으로 돌아가서 실컷 뛰노는 줄거리를 들려줍니다. 온갖 옷을 꽃솜씨로 지을 줄 아는 ‘꼬마 할머니’는 어느 날 ‘나이를 벗기는 옷’을 지어냈다고 해요. ‘맨눈으로는 못 보는 옷’을 한 겹씩 입을 적마다 나이를 한 살씩 벗는다지요. 꼬마 할머니는 왜 나이를 벗기는 옷을 생각해서 지어냈을까요? 숱한 사람들은 왜 젊어 보이려고 용을 쓸까요? 꼬마 할머니는 예닐곱 살이나 여덟아홉 살쯤 되는 아이로 돌아가서 거리낌없이 뛰고 달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면서 하루를 신바람으로 놀고 싶어서 나이를 벗기려고 합니다. 엉터리 같거나 억지스럽거나 바보스러이 꿈을 생각하려 했다면, 꼬마 할머니는 나이를 벗기는 옷을 못 지었으리라 느껴요. 즐겁거나 재미나거나 새롭게 하루를 그리는 마음이기에, 꼬마 할머니는 신바람놀이를 꾀하면서 옷을 지을 뿐 아니라, 멋진 놀이동무를 사귀어요. 온누리 어른들이 좀 놀기를 바랍니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 : 얄궂은 말씨 손질하기 7 ㄱ. 정신적 부자연스러움에서 비롯되는 것 정신적(精神的) : 정신에 관계되는 정신(精神) : 1.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2.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3. 마음의 자세나 태도 4.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 부자연(不自然) : 익숙하지 못하거나 억지로 꾸민 듯하여 어색함 그대로 있을 적에 한자말로 ‘자연스럽다·자연적’이라 하고, 그대로 안 있을 적에 ‘부자연스럽다·부자연적’이라 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있기에 ‘오롯하다·옹글다’라 할 만하고, 그대로 안 있기에 ‘꾸미다·치레·억지’라고 합니다. 엉성하게 생각하기에 뒤틀려요. 어줍짢거나 얼치기 같은 마음이기에 얽힙니다. 보기글을 보면 ‘부자연스러움’을 임자말로 삼고, ‘정신적인’을 꾸밈말로 삼는데, ‘마음·생각’을 임자말로 삼아 “마음이 엉성하기 때문입니다”나 “생각이 어설픈 탓입니다”로 손볼 노릇이요, 흐름을 살펴 “엉성한 마음 때문입니다”나 “어설픈 생각 탓입니다”로 손볼 만합니다. 섣불리 ‘-되다’ 꼴을 쓰면 옮김말씨요, ‘것’을 붙이면 군더더기예요. ㅅㄴㄹ 정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