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76 집이라는 곳 《초원의 집 2 대초원의 작은집》 로라 잉걸스 와일더 글 가스 윌리엄스 그림 김석희 옮김 비룡소 2005.9.25. 《초원의 집 2》을 읽는다. 미시시피강이 꽁꽁 얼 적에 건너려고 추운 겨울에 집을 옮기는 이야기가 흐른다. 마차에 살림을 싣고서 간다. 마차에서 자고 풀밭에 옷을 말린다. 마차는 움직이는 집이다. 드디어 맞춤한 곳을 찾아내고서는, 너른들에 집을 작게 짓는다. 통나무를 베어 하나씩 올리고, 마차 덮개로 먼저 지붕을 삼는다. 이윽고 널빤지를 늘리고, 말이 머물 곳도 짓는다. 모든 일은 한집안 모두 힘을 모아서 한다. 내가 어릴 적을 돌아본다. 마을에서 곧잘 집을 옮겼지만,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다. 내가 아이를 낳고 집을 꾸린 뒤에도 고장을 떠나지 않았다. 일터 가까이 살림집을 얻었다. 대구로 옮기면서도 짐을 거의 옛집에 두었다. 옷가지만 갖고 대구로 왔는데도 집안에 온갖 살림이 가득했다. 예전에는 살림살이가 적었을는지 몰라도, 네 식구가 마차를 타고 집처럼 누리면서 옮기는 길은 만만하지 않았을 텐데. 가만히 읽어 보자니, 《초원의 집》은 내가 열 두 살 무렵에 티브이에서 보았다.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75 말이라는 빛 《인간과 말》 막스 피카르트 배수아 옮김 봄날의 책 2013.6.24. ‘언어’라는 한자말을 어떻게 풀어서 쓰면 좋을는지 헤아리다가 《인간과 말》을 펼친다. 열 달쯤 앞서 읽은 책인데, 다시 펼치니 책 귀퉁이를 접어놓은 자국이 꽤 많다. 말에는 몸이 없다.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풀면 듣거나 읽기에 좋다. 자칫 어렵기만 할 수 있는 길을 나긋나긋 풀어낸 책이 아닐까 싶다. 문득 생각해 보니, 말이란 우리 스스로 몸을 짓는 길일 수 있겠다. 갓 태어난 아기는 말보다는 몸짓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겪고 물려받고 배운다. 말에 앞서 몸이 있는 듯하다. 몸으로 겪으면서 알아가고, 마음에 맺은 멍울을 하나하나 다스리면 어느새 마음이 스스로 낫는다. 어둡게 가라앉은 몸을 씻고, 어둡게 덮는 말을 씻는다. 몸은 좁거나 작은 곳에는 못 들어갈 테지만, 말은 어디에나 들어가고 흐른다. 손끝에서도 입밖에서도 말은 흐르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돌고돈다. 숲에 깃든 모든 목숨은 사람한테 머물기를 바란다. 바다는 하늘과 닿을 때까지 판판하게 펼치다가, 어느 날 배가 지나가면 아득하게 물러나 돌아간다. 바다는 사람과 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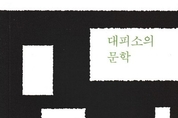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50 《대피소의 문학》 김대성 갈무리 2018.12.31. 《대피소의 문학》(김대성, 갈무리, 2018)을 곰곰이 읽었습니다. 저는 ‘대피소’ 같은 한자말을 안 쓰지만,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거나 뜻하는지는 헤아립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살아가며 이 말을 쓸 일은 없되, 아이들하고 함께 읽는 책이나 같이 다니는 곳에 문득 이 낱말이 나오면 풀어내 줄 테니까요. 아이들이 이 말을 쓸 일이 없더라도, 책이나 길에서 얼핏 보고서 무엇인지 알도록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한자말 ‘대피’는 ‘달아남·내뺌’이나 ‘비낌·떠남·감·등짐’을 나타냅니다. ‘대피 + 소’ 얼개로 바뀌면 ‘돌봄터·쉼터’로 바뀌지요. 앞뒤에 붙는 말씨에 따라 쓰임새가 바뀌곤 합니다. 마흔 살이 넘도록 그냥그냥 ‘문학’이란 한자말을 썼으나, 이제는 ‘글’이라고만 하거나 ‘글꽃’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말 ‘문학’을 일본사람이 총칼을 앞세워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서 훅 퍼뜨렸기 때문에 안 쓰지 않습니다. 열아홉 살을 넘어서던 무렵에는 ‘국어’ 아닌 ‘말·우리말·한말’을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스물다섯 살을 넘어서던 즈음에는 ‘사회’ 아닌 ‘터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49 《일제에 맞선 페미니스트》 이임하 철수와영희 2023.10.16. 《일제에 맞선 페미니스트》(이임하, 철수와영희, 2023)를 가만히 읽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숱한 사람들은 총칼수렁(일제강점기)에 목숨을 잃었고, 아이도 어버이도 잃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땅을 빼앗긴 사람이 참으로 많고, 살림을 빼앗긴 채 종으로 굴러야 한 사람들이 넘쳤어요. 일본이며 사할린이며 아시아 곳곳으로 끌려가서 내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무척 많아요. 총칼수렁에도 우두머리한테 빌붙으면서 돈·힘·이름을 거머쥐거나 드날린 무리도 많습니다. 옆에서 죽어나가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던 이들은 나중에 나라지기(대통령)도 되고, 한몫 단단히 잡고서 떵떵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라도 마을도 수렁이었지만, 조금도 수렁이 아니던 무리는 근심걱정이 없이 얼뜬 짓을 일삼았습니다. 곰곰이 보면, 총칼수렁에서 벗어난 오늘날이라지만, 돈수렁이나 이름수렁이나 힘수렁이 있어요. 배움수렁(입시지옥)은 갈수록 깊은데, 배움수렁이기에 돈을 벌거나 이름을 얻거나 힘을 쥐는 무리가 꽤 많아요. 지난 총칼수렁에서 몸을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넋 곁말 79 노래그림꽃 저는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바보였습니다. 이른바 ‘가락바보·노래바보·소리바보’였어요. 요즈음에는 이 바보굴레를 얼마나 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락을 못 맞추고 노래가 엉성하고 소리를 못 가누곤 했어요. 하도 바보스럽다고 놀림을 받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벙긋하지 못 하기 일쑤였지만, 남몰래 가락을 익히고 노래를 가다듬고 소리에 귀기울이며 살았어요. 혼자서 살아갈 적에는 바보스러움을 꽁꽁 숨기기 쉬웠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더 숨길 수 없어요. 둘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함께 춤춥니다. “이봐, 이녁 아이들이 자네 가락바보·노래바보를 배우겠어!” 하고 끌탕하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사랑스럽네요. 어버이가 노래를 못 불러도 아이들은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하더군요. 아이들은 어버이한테서 ‘즐겁게 노래하는 마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넋 곁말 78 포근뜰 남녘에서는 ‘뜰’만 맞춤길에 맞다고 여기고, 북녘에서는 ‘뜨락’만 맞춤길에 맞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뜰·뜨락’을 나란히 우리말로 사랑하면서 돌볼 적에 아름다우리라 생각합니다. 집 곁에 가볍게 ‘뜸(틈)’을 두어 풀꽃나무를 가꾸는 자리가 ‘뜰·뜨락’이에요. 처음은 수수하게 뜰이거나 뜨락입니다. 어느새 꽃뜰·꽃뜨락으로 피어납니다. 이윽고 들꽃뜰·뜰꽃뜨락으로 자라나더니, 바야흐로 풀꽃뜰·풀꽃뜨락을 이룹니다. 누구나 푸른뜰을 누릴 적에 삶이 빛날 테지요. 저마다 푸른뜨락에서 햇볕을 머금고 바람을 마시고 빗방울하고 춤출 적에 하루가 신날 테고요. 우리 삶터가 포근뜰이라면 서로 아끼는 눈빛이 짙다는 뜻입니다. 우리 터전이 포근뜨락이라면 스스로 사랑하면서 부드러이 어울린다는 소리입니다. 풀씨는 흙 한 줌이면 푸릇푸릇 깃들어요. 꽃씨도 흙 한 줌이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꽃 말꽃삶 18 나의 내 내자 우리말은 ‘나·너’입니다. ‘나·너’는 저마다 ‘ㅣ’가 붙어서 ‘내·너’로 씁니다. “나는 너를 봐”나 “내가 너를 봐”처럼 쓰고, “네 마음은 오늘 하늘빛이야”처럼 쓰지요. 그리고 ‘저·제’를 씁니다. “저로서는 어렵습니다”나 “제가 맡을게요”처럼 쓰지요. my 私の 나의 어느새 참으로 많은 분들이 ‘나의(나 + 의)’ 같은 말씨를 뜬금없이 씁니다. 이 말씨는 오롯이 ‘私の’라는 일본말을 옮겼다고 할 만합니다. 일본사람은 영어 ‘my’를 ‘私の’로 옮기더군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영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교사가 영어를 알리고 가르쳤습니다. 이들 선교사는 ‘한영사전’까지 엮었지요. 이다음으로는 일본이 총칼로 쳐들어와서 억누르던 무렵 확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손으로 엮은 책으로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가져온 책으로 배웠거나, ‘일본사람이 영어를 배우려고 일본사람 스스로 엮은 책’을 받아들여서 배웠습니다. 일본사람은 웬만한 데마다 ‘の’를 붙여서 풀이했고, 일본책으로 영어를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말씨 ‘の’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우리말 7 읽는다 아침마다 골마루 꽃밭을 읽습니다. “잘 잤냐?” 손으로 쓰다듬고 물을 뿌려요. 한해살이 풀꽃이 세 해 넘게 숨을 쉽니다. 눈빛과 손빛으로 돌봅니다. 오늘은 어쩐지 어깨가 아픕니다. 찌릿하더니 손끝부터 힘이 툭 떨어져요. 찌릿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어깨를 툭툭 털면서 책을 읽다가, 이 글을 쓴 분이 어떤 마음인가 하고 헤아립니다. 나라면 어떻게 글을 써 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일을 쉴 적에 책을 읽고, 다시 일을 할 적에는 일터만 살핍니다. 짝꿍하고 나누는 말도, 일터에서 오가는 말도, 서로 마음이 오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말을 주고받으니 마음을 읽고, 말을 글로 담으니 책이 태어납니다. 늦은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 집 꽃밭을 돌아봅니다. “잘 있었니?” 나는 풀꽃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눈망울을 읽고 싶어요. 풀꽃하고 나 사이에 오간 말을 글로 옮기고 싶어요. 2024. 1. 2. 숲하루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74 낚이다 《풀의 향기》 알랭 코르뱅 이선민 옮김 돌배나무 2020.06.10. 아침햇살을 본다. 땅바닥을 덮은 풀잎에 이슬이 앉았다. 이슬은 하얗게 얼었다. 햇볕이 오르자 언 이슬이 녹고는 물방울이 맺는다. 얼마나 추웠을까 하고 풀을 걱정하려다가, 오히려 내 마음이 푸르게 녹는다. 이 추위에도 긴밤을 보내고, 얼음 녹은 이슬을 품는구나. 《풀의 향기》를 편다. 풀내음을 느껴 보고 싶어서 죽죽 읽는데, 어쩐지 풀빛이나 풀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냥그냥 다른 사람들 글이나 책을 따서 엮었을 뿐이로구나 싶다. 풀을 보았으면, 풀을 본 마음을 적으면 될 텐데. 풀을 한 포기 손바닥에 얹었으면, 풀냄새를 맡은 이야기를 풀어내면 될 텐데. 나는 어릴 적에 목장을 해보고 싶었다. 풀밭에서 말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그렸고, 언덕을 온통 푸르게 뒤덮은 들판을 그려 보았다. 태어나서 자란 의성 멧골 시골집에는 소 한 마리 겨우 있었는데, 얌전한 짐승을 품는 농장을 꾸리고 싶었다. 의성은 예나 이제나 깊디깊이 숲이다. 우리 집도 이웃도 숲에 둘러싸였다. 마을은 온통 숲이었다. 맨발에 맨손으로 뛰고 달리고 나무를 탔다. 그런데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73 노예인 삶 《붓다 2》 테즈카 오사무 최윤정 옮김 학산문화사 2011.05.25. 《붓다 2》을 펼친다. 노예 차프라는 무사 집안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코끼리를 타고 지나가는데, 엄마가 아들 차프라를 부르지만 아는 척을 안 한다. 이제는 노예가 아닌 귀족인 차프라는, 노예라는 몸인 엄마를 등진다. 엄마는 아이를 만나지 못한다. 사람을 가르는 금인 신분은 왜 생겼을까. 나라를 빼앗고 뺏는 동안 우두머리나 돈이나 이름값을 가진 사람이 잣대를 지었을 테지. 요즘도 이런 금(신분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만화책을 덮고서 우리 가게 일을 떠올려 본다. 이제는 가게를 접으려고 한다. 마땅한 다른 임자한테 넘겨줄 생각이다. 그동안 집임자(건물주)한테 삯을 주면서 가게를 꾸려 왔는데, 집임자는 달삯도 보증금도 턱없이 올리려고만 하고, 우리 가게를 넘겨받을 사람들이 나왔을 적에도 뒤에서 자꾸 헤살을 놓는다. 지난 한 달 내내 피고름을 짜는 듯했다. 뜬금없이 토를 달고, 이리저리 휘두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너무 어이없어서 방송 같은 데라도 터뜨리고 싶다는 말을 하니, 그제서야 조금 누그러지더라. 가슴이 두근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