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37 자랑하지 않는 글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숲노래 기획 최종규 글 철수와 영희 2017.10.30. 어릴 적부터 하루글(일기)을 즐겁게 썼다. 아무리 바빠도 쓰자고 여겼지만, 대구로 삶터를 옮기고서 다섯 해 동안 쓰지 못 했다. 새로 맡아서 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내 하루를 글로 쓰고 싶다는 꿈을 키우면서 다시 하루글을 써 보는데, 어쩐지 어긋나거나 엉성해 보인다. 그냥 하루를 쓰면 될 뿐인데, 어떻게 써야 할는지 까마득했다. 아이가 글을 배우듯이 처음부터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전을 먼저 집었다. 아들이 쓰는 국어사전부터 펼쳤다. 《보리 국어사전》도 읽었다. 이러다가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을 만났다. 이밖에도 《문화상징사전》에 《새문화사전》에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에 《베르나르 베르나르 상상력사전》에 《글쓰기 표현사전》에 《문장사전》에 《꿈꾸는 사물들》에 《지식 백과사전》에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에 《우리말의 상상력》에 《동심언어사전》에 수수께끼나 고사성어나 형용사를 다룬 여러 사전을 챙겨 읽어 보았다. 《우리말의 상상력》은 재미있지만, 내가 글을 쓰는 길에는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74 더듬꽃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흔히 ‘여느(보통·평범·일반)’ 같은 낱말을 앞세우곤 하지만, ‘여느사람’조차 모두 달라요. “똑같은 ‘여느사람(보통이거나 평범한 사람·일반인)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줄 제대로 알아차리는 눈에 알아보는 넋이라면, 구태여 ‘장애·비장애’ 같은 한자말을 안 끌어들이리라 봅니다. ‘장애·비장애’ 같은 한자말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되레 더 갈라치기로 기울면서 남남 사이로 쪼개진다고 느껴요. 웃으니까 ‘웃다’라 하고, 우니까 ‘울다’라 합니다. 다리를 저니까 ‘절다’라 하거, 눈이 하나이니까 ‘외눈’이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쉽게 말을 더듬었으니 ‘더듬이’ 같은 말을 들었는데, 풀벌레한테 난 ‘더듬이’를 떠올리면서, 또 영어 ‘안테나’가 우리말로는 ‘더듬이’이니,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73 돌이나라 사내란 몸을 입고 태어나기에 잘나지 않고, 가시내란 몸으로 태어나서 잘나지 않습니다. 가시내는 가시내라는 숨결이고, 사내는 사내라는 숨빛입니다. 겉몸은 순이랑 돌이로 다를 뿐, 돌이하고 순이는 두 마음을 고루 품으면서 한 가지 몸으로 삶을 누리고 살림을 지으며 사랑을 나눕니다. 힘이 좋은 쪽이 있고, 어질면서 슬기로운 쪽이 있습니다. 참하면서 착한 쪽이 있고, 고우면서 상냥한 쪽이 있습니다. 둘은 저마다 다른 넋이면서, 사람이라는 길로는 나란한 빛입니다. 오늘날 배움터에서 가르치는 발자취(역사)를 놓고 본다면 적잖은 나날을 ‘꼰대짓(가부장제)’으로 보냈습니다. 우두머리(지도자·왕·대표)가 서는 나라에서는 언제나 고리타분한 틀에 갇혔어요. 이 우두머리는 으레 사내였고, 사내들은 끼리끼리 감투를 쓰며 곰팡내를 풍기는 수렁에 잠기면서 싸움질을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곁말’은 곁에 두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말입니다. 낱말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글을 쓰는 숲노래가 지은 낱말입니다. 곁에 어떤 낱말을 놓으면서 마음이며 생각을 빛낼 적에 즐거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곁말’ 이야기를 단출히 적어 봅니다. 숲노래 말빛 곁말 72 긴낮 어릴 적에 어머니는 상냥하면서 어진 길잡이(교사)였습니다. 요새는 배움터 길잡이(학교 교사)가 어린이를 마구 때리거나 괴롭히는 짓이 사라졌다지만, 지난날에는 배움터에서 길잡이한테 뭘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아주 무섭고 사나웠거든요. 어머니한테 여쭈면 “얘,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안 가르쳐 주니? 왜 늘 엄마한테만 묻니?” 하시지요. “몽둥이를 들고 노려보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물어봐요. 모르면 모른다고 때리는걸요.” “아유, 할 수 없지. 그래서 뭐?” 어느 날은 “‘하지’하고 ‘동지’가 뭐예요?“ 하고 여쭙니다. “하지랑 동지? 학교는 그런 절기도 안 가르치니?” “아직 책(교과서)에 안 나오는걸요.” “여름에 낮이 가장 길어서 ‘하지’이고, 겨울에 밤이 가장 길어서 ‘동지’야. 그러니까 긴낮이 하지이고, 긴밤이 동지이지.” “아, 그런 한자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36 나무심기 《나비 문명》 마사키 다카시 김경옥 옮김 책세상 2010.10.12. 두 해 앞서 대구 ‘김광석거리’ 가까이에 있는 〈직립보행〉이라는 마을책집에 간 적이 있다. 그날 마침 아는 분하고 함께 갔다. 나랑 함께 책집에 들른 분은, 나를 보면서 내가 엉뚱한 책 앞에서 헤맨다고 얘기하면서 《나비 문명》이라는 책을 뽑아서 건네었다. 다른 엉뚱한 책은 안 봐도 좋으니 이 책부터 읽어 보라고 하더라. 두 해 앞서 장만한 《나비 문명》이지만, 두 해 동안 펼칠 겨를이 없었다. 집안일도 바빴고, 가게일도 바빴고, 이래저래 온통 바쁨투성이였다. 두 해 앞서 장만한 책이니까, 두 해 만에 읽는 셈이다. 어쩐지 미안한 일이지만, 책을 다 읽고 나니 오늘에서야 읽어야 한 뜻도 있겠구나 싶다. 바쁠 적에는 아무리 아름답거나 마음을 살찌우는 이야기라도 못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나비 문명》을 쓴 분은 일본사람이다. 이분은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임진강까지 걸었단다. 놀랍다. 한국사람도 아닌 일본사람이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듯 걷다니. 이분은 천천히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강제징용으로 시달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35 우리도 크면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이오덕 엮음 양철북 2018.2.2.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를 읽었다. 이 책에는 내가 태어날 무렵에 삼학년에서 육학년 어린이가 쓴 글이 나온다. 나보다 열 살 또는 열세 살 위인 어린이였던 셈인데, 이제는 예순을 지나 일흔을 넘어가는 사람들인 셈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남긴 글을 읽자니, 내가 어릴 때 한 일이 낱낱이 보인다. 이 책을 엮은 이오덕 님은 ‘훌륭한 글을 쓰는 공부에 참고 하라고 하고 훌륭한 글이란 정직하게 쓴 글, 사람답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한 것을 쓴 글’이라고 이야기한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얘기보다 일하고 괴로워한 글이 재밌고 감동을 주게 된다’고도 이야기한다. 이 책에 나오는 아이들은 온통 풀꽃나무와 새와 벌레와 물고기와 올챙이와 콩싹과 함께한다. 어버이와 놀러 간 일은 소풍 때 살짝 나온다. 이 책이 처음 나오고서 서른 해가 지난 즈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때만 해도 아이들은 숲에서 제법 멀었다. 어느새 책이 처음 나온 지 예순 해가 훌쩍 지난 오늘날인데, 그야말로 오늘날 아이들은 삶이 아닌 책으로만 풀꽃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 좀 생각합시다 37 맛 우리 낱말책에 없던 한자말인 ‘식감(食感)’입니다. 이 낱말을 어느새 무척 널리 쓰는구나 싶습니다. 어쩌면 낱말책에 새 낱말로 오를 수 있겠다고 여겼는데, 참말로 2023년 10월에 올림말로 싣는군요. 그런데 살짝 아리송합니다. “먹는 느낌”을 우리말로는 ‘맛’이라 나타내거든요. ‘맛’을 놓고 ‘입맛·밥맛’처럼 쓰기도 하고, ‘먹는맛·씹는맛’처럼 쓰기도 합니다. ‘맛깔스럽다·감칠맛’ 같은 낱말이 있어요. 굳이 ‘식감(食感)’이라는 일본 한자말을 끌어들여서 써야 할 까닭은 없지 싶습니다. ‘맛’을 ‘입맛·밥맛’처럼 쓰듯이 ‘혀맛·코맛·눈맛·귀맛’처럼 갈라 볼 만합니다. 혀에 닿는 맛하고, 입에 넣는 맛은 다를 테며, 눈으로 보는 맛하고 귀로 듣는 맛도 다르거든요. ‘먹는맛·씹는맛’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는맛·듣는맛’이라든지 ‘손맛·그릇맛’이나 ‘녹는맛·말린맛’처럼 새로운 맛을 알맞게 나타내 보아도 어울립니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46 《파우스트의 선택》 박병상 녹색평론사 2000.10.23. 《파우스트의 선택》(박병상, 녹색평론사, 2000)을 오랜만에 되읽습니다. 박병상 님은 마흔을 조금 넘은 무렵 이 책을 써냈고, 어느덧 예순을 훅 넘어가는 하루를 보냅니다. 서울 곁 인천에서 나고자라면서 ‘푸른숲이 짓밟힌 큰고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지켜보기도 했고, ‘푸른숲이 짓밟힌 큰고장에서 나고자라는 어린이’가 어떻게 푸른넋이 없이 설치는가를 보기도 했을 테지만, ‘푸른숲이 짓밟힌 큰고장에서 나고자랐기에 오히려 푸른빛을 찾아내고픈 어린이’를 보기도 했을 테지요. 스무 해 남짓 가로지르는 푸른책(환경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푸른눈’을 되찾기도 해야 하고, 푸른물결(환경운동)에 몸바치는 사람도 ‘푸른몸’을 되찾을 노릇입니다. 요사이는 ‘푸른척(그린워싱)’을 나무라는 목소리를 이따금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적잖은 푸른물결(환경운동)도 안타깝게 ‘푸른척’이었습니다. 잘 봐야 합니다. 비닐을 안 쓰고 수저를 챙기던 사람은 2023년뿐 아니라 2000년에도 1990년에도 챙기고 살림을 했습니다. 쇳덩이(자동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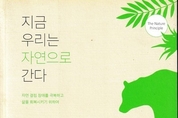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45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 리처드 루브 류한원 옮김 목수책방 2016.2.26.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리처드 루브/류한원 옮김, 목수책방, 2016)는 “The Nature Principle : Human Restoration and the End of Nature-Deficit Disorder” 같은 영어를 옮겼습니다. “숲길 : 사람을 살리며, 숲을 잊은 굴레를 끝내다”를 나타낸다고 할 만하니, “오늘 우리는 숲으로 간다”처럼 풀어낸 이름이 꽤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배움길에서는 ‘자연결핍장애’ 같은 이름을 쓰는 듯싶은데, ‘숲멍울’이나 ‘숲을 잊다’라 해야 알맞다고 느껴요. 자꾸 ‘장애·결핍장애’ 같은 굴레를 씌우지 않기를 바라요. 숲이 모자라거나 없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숲을 등지거나 멀리하거나 잊을 뿐입니다. 사랑길을 등지거나 멀리하거나 잊기에 숲도 등지거나 멀리하거나 잊어요. 푸른넋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에 멍들고 다치고 아픕니다. 풀이 조금만 자라면 모기가 끓느니 뱀이 나온다느니 두려움에 무서움이라는 마음을 심는 짓도 숲멍울이라 여길 만합니다. 이 별에는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에서 짓는 글살림”은 숲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골자락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을 짓는 길에 새롭게 맞아들여 누리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42. 엄마쉼 아빠쉼 어른이 어른한테 쓰는 말이 있고, 어른이 아이한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말은 다릅니다. 어른 사이에서 흐르는 말을 아이한테 섣불리 쓰지 않아요. 거꾸로 아이가 아이한테 쓰는 말은 어떤가요? 아이가 아이한테 쓰는 말은 어른한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린이하고 어른이 함께 알아듣는 말이 있고, 어른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만 알아듣는 말이 있을까요? 아마 어린이만 알아듣는 말도 있을 테지만, 어린이가 알아듣는 말이라면 어른도 가만히 생각을 기울일 적에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내 알아차리곤 합니다. 이와 달리 어른끼리 알아듣는 말이라면, 어른들이 아무리 쉽게 풀이하거나 밝힌다 하더라도 어린이가 좀처럼 못 알아차리곤 해요. 이를테면 ‘출산휴가’ 같은 말을 생각해 봐요. 어른이 일하는 자리에서는 으레 쓰는 말이지만 어린이한테는 도무지 와닿지 않습니다. 어린이한테 ‘출산’이나 ‘휴가’란 말을 써도 좋을까요? 엄마쉼 아빠쉼 동생을 낳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면 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