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 회사 會社 계열 회사 → 갈래터 제조 회사 → 지음터 회사에 출근하다 → 일터에 나가다 회사를 경영하다 → 일판을 꾸리다 ‘회사(會社)’는 “[경제]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주식회사,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의 네 가지가 있다 ≒ 사”를 가리킨다는군요. ‘일터·일터전’이나 ‘일집’이나 ‘일판·일마당·일밭’으로 풀이합니다. ‘곳·터’나 ‘두레·모임’으로 풀어낼 수 있고, ‘만듦터·만듦집·만듦자리’나 ‘지음터·지음집·지음자리·짓는곳·짓는터’로 풀어도 어울려요. 이밖에 낱말책에 한자말 ‘회사’를 넷 더 실으나 몽땅 털어냅니다. ㅅㄴㄹ 회사(回謝) : 사례하는 뜻을 표함 회사(悔謝) :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 회사(會士) :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42 내가 꼽는 책 《담론》 신영복 돌베개 2015.4.20. 2019년 2월 어느 날을 떠올린다. 일곱 사람이 책모임을 하자며 처음으로 찻집에서 만났다. 어느 분이 나한테 《담론》을 읽어 봤냐고 물었다. 안 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책도 모르느냐”는 듯이 자꾸 말을 해서 참 부끄러웠다. 나는 여태까지 뭘 하며 살았나. 그런데 모인 일곱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전라도라면 아주 싫어했다. 우리 일곱 가운데 전라도사람이 있었다. 모처럼 다들 큰마음을 먹고 책모임을 하기로 했지만, 그만 첫모임이 끝모임이 되고 말았다. 그 뒤 그 책모임을 잊었는데, 어느 날 책집에 갔더니 《담론》이 보였다. 이 책을 어떻게 모르느냐고 타박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책을 집어 보았다. 《담론》은 신영복 님이 들려준 말을 받아적어서 꾸렸다고 한다. 크게 두 갈래로 이야기를 묶는데, 앞쪽은 ‘시경’과 ‘주역’ 같은 중국 옛책에 나온 이야기를 풀어낸다. 뒤쪽은 사슬(감옥)에 갇히던 무렵에 겪은 일을 풀어낸다. 곰곰이 보면, 옛책(고전)으로 배운다고 할 적에는 다들 중국책을 손꼽는다. 중국에서 나온 책이어도 훌륭한 책은 훌륭하겠지만, 책으로 적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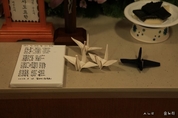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우리말꽃 / 숲노래 말넋 말꽃삶 16 묻다 우리말 ‘묻다’는 세 가지입니다. ‘파묻는’ 길이 하나요, ‘물어보는’ 길이 둘이요, ‘물드는’ 길이 셋입니다. 소리는 같되 쓰임새나 뜻이 사뭇 다른 세 가지 ‘묻다’입니다. 글은 말을 옮긴 그림입니다. 한글을 으레 ‘소리글(표음문자)’로 여기지만, ‘묻다’를 비롯한 숱한 우리말을 하나하나 짚노라면, 한글은 ‘소리글 + 뜻글’인 ‘뜻소리글(표의표음문자)’이라 해야 걸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은 “소리만 담는 글”이 아닌 “뜻을 함께 담는 글”입니다. 우리말 ‘묻다’를 알맞게 쓰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말 ‘묻다’를 도무지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삶을 가꾸고 살림을 돌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수수한 사람들은 글을 모르거나 책을 안 읽되, 말을 말다이 여미어요. 글을 알거나 쓸 뿐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이들은 삶·살림·사랑하고 등진 채 ‘묻다’가 아닌 ‘중국스럽거나 일본스러운 한자말’하고 영어를 붙잡곤 합니다. 묻다 1 ← 매장(埋葬), 사장(死藏), 은닉, 은폐, 호도, 매립, 매몰, 장사(葬事), 장례, 장례식, 초상(初喪), 상(喪), 삽목 묻다 2(물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 좀 생각합시다 39 낱말책 : 사전이라는 책 2 낱말책은 “삶을 담은 말을 담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낱말책을 엮는 이가 “삶을 담는 말”을 제대로 보거나 짚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다음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낱말책을 엮는 이가 삶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 글(학문)로만 다가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낱말책을 짓는 이가 삶이나 사람이나 사랑이나 살림을 제대로 모르거나 겪지 않은 채 ‘일만 한다면(낱말만 그러모은다면)’ 낱말책은 어떻게 나올까요? 낱말책을 엮거나 짓는 이는 언제나 눈을 밝게 떠야 합니다. 온누리를 옳거나 그르다고 가를 까닭은 없되, 아름다움과 참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사랑하고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하며, 너랑 나 사이에 어떤 숨결이 흐르는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낱말책을 엮거나 짓는 이는 ‘제 나라 말’을 누구보다 슬기롭게 쓰거나 다루는 마음을 길러야 할 뿐 아니라, 상냥하거나 다소곳하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41 나무한테서 배우는 《나무야 나무야》 신영복 돌베개 1996.9.12. 《나무야 나무야》를 쓴 신영복 님은 내가 태어난 해에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스무 해 넘게 있다가, 내가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인 88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풀려났다. 신영복 님이 쓴 다른 책을 다섯 해 앞서 읽은 적 있다. 이 책 《나무야 나무야》가 나오던 해를 돌아보면, 그때 우리 집 둘째가 아홉 달이었다. 이 갓난아기를 시골집에 맡겼다. 그때까지 시골에 둔 첫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어린이집에 맡겼다. 갓난아기를 돌볼 적에는 첫째 아이랑 떨어졌고, 첫째 아이를 데려오면서 둘째 아이를 다시 시골집에 맡기면서 맞벌이를 했다. 이러면서 주말에 시골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두 아이를 낳아 돌보던 즈음에는 책하고 멀었다. 아니, 책을 읽겠다는 생각조차 못 했다. 그때에는 알아볼 수도 읽을 수도 없던 책인데, 이제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는 어른으로 컸다. 다들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갔다. 《나무야 나무야》에 부여 이야기가 나온다. 문득 첫째 아이 돌잔치를 하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그러니까 내가 따로 살림을 낸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40 낯설게 또는 나답게 《미학 오디세이 2》 진중권 휴머니스트 1994.1.15. 《미학 오디세이 2》을 내처 읽는다. 둘쨋책은 ‘마그리트’를 바탕으로 화가와 철학가와 음악가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철학가는 ‘모든 예술에서 꼭대기는 시’라고 여긴다는 이야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마그리트’는 철학가이자 화가였다는데, 이분 그림은 ‘시’와 같다고 한다. 시처럼 읽을 만하겠다. 내 어릴 적을 돌아본다. 의성 멧마을에서 나고자라던 그무렵에 우리 엄마아빠는 겨우겨우 먹고살았다. 겨우 먹고살아도 늘 빠듯했다. 열너덧 살 무렵을 떠올린다. 중학교에 다니던 그즈음, 다른 수업보다 미술이 싫었다. 참 싫었다. 학교에 연못이 있었고, 둑을 따라 풀밭인데, 밖에 앉아서 풍경화를 그릴 적에는 먼저 연필로 밑그림을 하고 물감으로 빛깔을 입히는데, 나는 물감질이 서툴었다. 빛깔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잘 알기 어려웠다. 붓질이 서툴어 그림을 가까이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그림을 못 그린다고 여겨 다른 사람 그림도 그리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그림을 못 그리고 모르니까 미학도 미술도 어려울는지 모른다. 《미학 오디세이》는 어렵다. 첫쨋책도 둘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39 배우고 싶다 《미학 오디세이 1》 진중권 휴머니스트 1994.1.15. 남들이 쓰는 시를 나도 쓸 수 있을까 싶어, 그러니까 시를 좀 잘 써보려는 마음에 《미학 오디세이 1》를 샀다. 여태껏, 가까이 있는 미술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미술을 몰라도 그냥 내 나름대로 느끼면 시나 글로 풀어내고 싶었다. 《미학 오디세이 1》를 펴니, ‘에셔’ 그림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꿈과 삶 사이에서 꿈을 넘어 되살아나는 빛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풀어간다. 조각조각 모이는 사람이 조각보처럼 펼치는 이야기마냥 먼 옛날 그림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스 하느님을 짚고, 그리스 철학이나 조각가나 화가나 건축가 이야기를 마치 천을 짜듯 날줄과 씨줄처럼 잇고 여미어 낸다. 여러 길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읽다가 샛길로 빠져 본다. 문득 지난 어느 일을 떠올린다. 우리 집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가 학교를 다니던 지난날, 해마다 학년이 바뀔 적에 ‘가정조사’ 같은 종이에 ‘엄마 학력’을 적어야 할 때면, 참 부끄러웠다. ‘엄마 학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조그마했는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모른다. 나는 뒤늦게 ‘졸업장’을 따려고 늦깎이로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 좀 생각합시다 38 낱말책 : 사전이라는 책 1 낱말책(사전)을 제대로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낱말책은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낱말을 담는 책일 수 있으나, 이런 얼거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말’이 무엇인가를 먼저 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말을 하려면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도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면 버릇입니다. 버릇이란 길든 몸짓이니, 생각을 안 했어도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라면 ‘말버릇’이면서 ‘말짓’입니다. 이를테면 넘어지거나 부딪힐 적에 튀어나오는 소리란 그때에 그러한 소리가 나도록 길든 버릇이면서 말짓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라마다 ‘부딪혀서 아프며 내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몸에 새기거나 깃든 말짓이나 말버릇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로 말이란 무엇인가를 환하게 알려주지요. 모든 말은, 삶자리에서 우러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61. 온살 100이라는 셈을 우리말로는 ‘온’으로 센다. 우리말 ‘온’은 ‘모두’를 나타내기도 한다. ‘온누리·온나라’는 “모든 누리·모든 나라”를 가리킨다. ‘온몸·온마음’은 “모든 몸·모든 마음”을 뜻한다. 나이로 ‘온(100)’에 이를 적에는 모두 헤아리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안다고 여긴다. 더없이 참하고 어질다고 여기는 ‘온살’이요, 어느덧 ‘온살이날’이나 ‘온살림길’로 바라본다. 온살 (온 + 살) : 온(100)에 이른 나이. 오래 살아온 날. 오래 흐르거나 이은 나날. (← 백세百歲) 온살림날 (온 + 살리다 + ㅁ + 날) : 온(100)에 이르도록 살아온 나이. 오래 살아오거나 살아가는 길·날. 오래 흐르거나 이으며 누리거나 짓는 길·나날. (= 온살림길·온삶길·온살이길·온살이날·온삶날. ← 백세시대) 62. 오늘눈 바로 여기에 있는 이날이 ‘오늘’이다. 지나간 날은 ‘어제’이고, 다가올 날은 ‘모레’이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눈길이 다르다. 오늘 이곳에서 바라보는 ‘오늘눈’이라면, 지나간 날에 지나간 그곳에서 바라보려는 ‘어제눈’이며, 앞으로 맞이할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38 나도 소설을 쓸까 《편의점 인간》 무라타 사야카 김석희 옮김 살림 2016.11.1. 《편의점 인간》을 세 해 앞서 장만했다. 그때에는 살짝 훑고, 이제 비로소 제대로 읽었다. 옮긴이 이름을 보고서 이 책을 샀다. 편의점에 드나드는 손님을 다루고, 편의점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를 다룬다. 편의점 일꾼으로 지내다가 이곳을 그만두고서는 편의점이 들려주는 말을 듣는 이야기도 다룬다. 《편의점 인간》을 쓴 사람은 곁일(알바)을 했을까? 곁일을 했다면 얼마나 해보았을까? 나는 대구에서 마을가게(마트)를 꾸린다. 혼자서 꾸리기는 벅차기에 일꾼(알바생)을 두는데, 처음 마을가게를 이어받아서 꾸릴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힘들었고 몸살이 잦았다. 일꾼한테 일삯을 얼마나 치러 주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채 덤터기도 많이 썼다. 마을가게를 꾸리면서 일꾼을 쓸 적에 곰곰이 보니, 적잖은 아가씨들은 담배를 피우더라.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담배를 피울 수 있을 테지만, 나는 마을가게 일을 하기 앞서까지, 담배 피우는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다. 깜짝 놀랐다. 가게에서 일하다가 담배를 피워도 되나? 가게일꾼이 담배를 피